
▼정부는 유럽식, 재계는 미국식▼
이렇게 경제상황과 기업 환경에 대해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기업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데서 비롯된 면이 있다. 유한 책임의 주식에 바탕을 둔 근대 기업에 대해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극찬하였으나, 이보다 훨씬 오래전 근대 경제학의 시조인 애덤 스미스는 기업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기업에 대한 스미스의 불만은 기업에 의한 독점의 가능성과 고용된 경영자에 의한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 때문이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초기의 기업들은 철저히 공익 목적과 기간을 명시해서 인가됐다.
1862년 영국에서 제정된 기업법(The Company Act)은 유럽의 여러 나라로 급속히 전파되었으며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꽃을 피웠다. 유럽에 비해 미국의 기업체계가 훨씬 더 자유롭고 경쟁력을 갖게 된 데에는 수십 개의 주가 기업 유치를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한 덕이 크다. 주마다 기업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기업을 유치한 결과 오늘날과 같이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게 됐으며 동시에 기업들도 가장 경쟁력이 강한 체계를 갖게 된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기업간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우선, 미국 기업의 경영목표가 주주가치의 극대화인 반면 유럽 기업의 경영목표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도 미국에 비해 유럽은 경직되어 있으며 미국에는 없는, 근로자의 직접적인 경영 참여도 유럽에서는 허용된다.
근로자 경영 참여의 대표적인 예인 독일의 공동결정법은 근로자 대표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절반의 결정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대표가 참여한 전략적 의사결정은 투명성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글로벌 경쟁에서 전략 노출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갖게 된다. 이러한 딜레마에 부닥쳐 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한 독일은 결국 상법을 개정하는 등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기업의 경영목표 차이에서도 나타나듯 미국 기업경영의 핵심이 효율인 반면 유럽 기업경영의 핵심은 사회적 평화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대한 기본 인식의 혼란은 경제주체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례를 들어 자신의 논리를 펴는 데 기인하는 바 크다. 재계는 보편적으로 미국식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와 정부는 유럽식을 주장한다. 각자 주장하는 사례가 세계 어디에든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나라의 경제 규모나 국민 의식, 기업구조, 사회 인프라 등을 무시한 채 서로 ‘이것이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더욱 큰 문제는 미국식과 유럽식을 한 부분씩 떼어내 혼합한다고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우리실정 맞는 관점 정립할 때▼
스미스와 드러커가 그랬듯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 기업을 보는 시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정부나 재계 등 각 경제 주체의 주장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급박한 경제 상황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혼란이 계속돼서는 곤란하다. 미국식이든 유럽식이든 또는 제3의 방식이든 이제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업관을 정립해야 할 때가 됐다. 그 선택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리더십과 국민의 합의에 달려 있으며 이를 무작정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것이다.
박성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장·경영과학
월요포럼
구독-

오늘과 내일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민주, 정청래-박찬대 등 핵심 상임위장 배분 강행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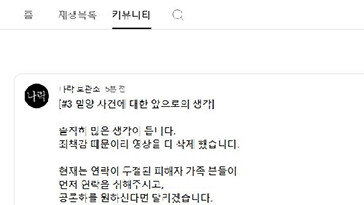
‘밀양 가해자 폭로’ 유튜버, 영상 모두 삭제 “죄책감 시달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그 많던 탕후루 가게 사라지는 이유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월요포럼/김동성]‘美軍평택이전’ 차질 없어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