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 卷二.바람아 불어라
-
입력 2003년 4월 17일 19시 11분
글자크기 설정

강남의 3월은 봄이라도 늦은 봄이었다. 복사꽃 오얏꽃은 이미 지고 모란이 봉우리를 맺었다. 회계군(會稽郡) 오중(吳中·吳縣) 성밖 동북으로 이십 리쯤 떨어진 벌판에서는 윗도리를 벗어붙인 군사들이 땀을 흘려가며 조련을 받고 있었다. 새로이 회계군수가 된 항량의 조카이자 그 부장(副將)을 맡게된 항우가 초나라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군사, 이른바 강동자제(江東子弟) 8천을 조련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미 조련을 받은 지 오래인 듯 군사들의 몸놀림은 제법 볼만했다. 모이고 흩어지며 나아가고 물러남이 얼마나 익숙한지 한 몸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장대(將臺) 위에서 그들을 내려보고 있는 항우의 눈길에는 아직도 못마땅해하는 데가 있었다. 오래잖아 징을 울리고 기를 휘저어 군사들을 모은 항우가 소리쳤다.
“이미 여러 번 일러주었듯, 앞뒤로 늘어선 줄을 항(行·대개 스물 다섯 명)이라 하고 옆으로 벌여선 줄을 오(伍·대개 다섯 명)라 한다. 이 항오(行伍)가 어우러져 대(隊·周禮에서는 卒. 다섯 伍가 한 兩이 되고 네 兩이 한 卒이 된다)를 이루고 대가 모여 여(旅·5백 명)가 되며, 또 여가 자라 사(師·2천5백 명)가 되고 사는 커져 군(軍·1만 2천 5백 명)이 된다. 그러므로 항오를 움직이는 법[항오법]은 단순하지만 군사를 부리는 바탕이 되며, 행군에서도 전투에서도 한가지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큰 틀이다. 옛적에 손무자(孫武子)가 처음 병법(兵法)을 보여줄 때, 오왕(吳王)이 가장 사랑하는 미녀를 굳이 둘씩이나 죽여가며 먼저 세우려했던 것도 바로 이 항오법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아무리 굳세고 날래어도 항오를 잃으면 이미 그 군대는 군대라 이를 수가 없다. 그런데 그대들은 무언가? 한나절 조련으로 벌써 항오가 흐트러지고 있지 않은가? 이러고도 그대들이 망초(亡楚)의 한을 씻을 의군(義軍)을 자처할 수 있겠는가? 각 둔장(屯長)은 이제부터 대(隊)를 갈라 항오법부터 바로잡은 뒤에 다시 진퇴(進退)와 공수(攻守)를 익히게 하도록.”
| <이문열 신작장편소설> 호모엑세쿠탄스! 인터넷으로 연재하는 이문열 문학의 결정판! 지금 읽어보세요. |
그런 항우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리 사나워 보이지는 않았다. 말을 끝내기 바쁘게 장대를 내려서서 군사들 속으로 들어서는 품이 왠지 그들을 나무란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하여 그들 사이로 끼여들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았다. 말을 듣고 있는 군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긴장하여 듣고 있기는 해도 겁을 먹은 얼굴들은 아니었다. 항우가 바로 곁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게 어떤 힘이 되었는지, 새삼 정신을 가다듬어 똑같은 움직임을 되풀이하는 데서 오는 지루함을 이겨냈다.
어떻게 보면 항우는 그때 군사들에게 항오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일체감(一體感)을 기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뒤 그 8천 명은 거의 모두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항우에게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을 바치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때 길러진 일체감에서 비롯되었음에 틀림이 없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뒷날 천하를 쥘락 펼락 하던 항우도 멀리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장수가 아니라, 자기들과 항오를 함께 하고 있는 동무들 가운데 으뜸일 뿐이었다.
항오법에 이어 찍고 베고 찌르고 막는 조련이 시작된 것은 춘삼월 해도 서편으로 제법 뉘엿할 무렵이었다. 항우는 그제야 조련을 부장(部將)들에게 맡기고 거처로 쓰고있는 군막으로 돌아갔다. 사마(司馬)로서 군막을 지키고 있던 용저(龍且)가 무엇 때문인가 상기한 얼굴로 나와 맞더니 항우가 군막 안으로 들어서기 바쁘게 장검 한 자루를 내밀었다. 칼집이나 장식이 얼른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았다.
“이게 왠 칼인가?”
대를 이은 무장(武將) 가문의 혈통 때문인지 보검(寶劍)임을 한눈에 알아본 항우가 급히 용저에게 물었다. 용저도 이미 그 칼을 알아본 듯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낮에 장군께서 나가신 뒤 어떤 늙은이가 찾아와 바치고 갔습니다. 초(楚)왕실 전래의 보검이니 반드시 이 칼로 진나라를 쳐 없애 회왕(懷王)의 한을 씻어달라는 청이었습니다.”
“그 늙은이는 누구이며, 어째서 우리 왕실의 보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만한 보검이라면 이름이 있을 터, 이 칼의 이름은 무어라고 하던가?”
“물었지만 뚜렷하게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검을 지켜 복국(復國)의 지사(志士)에게 전해주는 것을 보람으로 삼던 망초(亡楚)의 유신(遺臣)이라고만 하더군요. 또 칼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절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알 수 없는 늙은이로군. 한 나라의 흥망을 맡길만한 보검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항우는 가만히 칼을 뽑아보았다. 짐작대로 삭거나 녹이 슬지 않도록 손을 본(크롬염 산화처리로 서양에서는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쓰인 방식) 청동검(靑銅劍)이 아니라 무쇠를 공들여 벼린 철검(鐵劍)이었는데, 맑은 쇳소리와 함께 갓 갈아놓은 듯한 칼날이 눈부신 빛을 뿜었다. 군막 안이 갑자기 환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때 누군가 군막 안으로 들어오다가 놀란 소리로 말했다.
“이게 무슨 빛이오? 아, 칼이구려. 대단한 명검 같은데, 이름이 무엇이며 어디서 났소?”
항우가 얼른 칼을 칼집에 꽂으며 돌아보니 계포(季布)였다. 계포는 초나라 땅에서 널리 알려진 명사로서 그때는 이미 항량의 막빈(幕賓)이 되어 곁에서 거들고 있었다. 사람이 의기로운 데다 식견이 넓어 항량이 그를 몹시 존중하니 항우도 그런 숙부를 따라 언제나 공손하게 대했다.
“낮에 어떤 늙은이가 가져왔다는 칼인데,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항우가 칼을 든 체 두 손을 모으며 그렇게 대답했다. 계포가 마주 예를 하며 다가오더니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항우가 쥐고 있는 칼을 보며 다시 물었다.
“제가 그 칼을 한번 살펴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러잖아도 선생의 안목을 빌려야할 참이었습니다. 살펴보시고 아실만한 물건이면 제게도 일러주십시오.”
항우가 그러면서 들고 있던 칼을 계포에게 넘겨주었다. 계포는 칼집부터 찬찬히 살피더니 이윽고 날을 뽑아 어린 듯 홀린 듯 바라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칼등에 새겨진 무늬를 살피고 쓰다듬듯 하던 계포가 가만히 항우를 쳐다보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로 경하 드립니다. 장군께서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보검을 얻으셨습니다.”
“그럼 선생께서는 이 칼을 알아보시겠습니까?”
계포가 내민 칼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묻는 항우의 목소리가 새삼 떨렸다. 계포는 나지막하면서도 자신있게 말했다.
“제가 헛소문을 듣고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이 칼은 바로 간장(干將)입니다.”
간장이라면 항우도 들은 적이 있는 명검(名劍)이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신비한 전설로만 들어온 이름이라 실제 손에 들어왔다는 게 얼른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럼 막야(莫邪)와 짝을 이룬다는 그 간장입니까? 거궐(鉅闕) 벽려((벽,피)閭)와 함께 옛날 오왕(吳王) 합려(闔閭)가 가지고 있었다는 명검.....”
“틀림없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간장의 칼등에는 거북 등 무늬[龜文]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그 거북 등 무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계포는 손으로 머리를 슬어 머리터럭 몇 올을 뽑더니 칼날 위에 놓고 입으로 불었다. 별로 세게 불지 않았는데도 머리터럭은 모두 두 토막이 나 칼날 양쪽으로 흘러 내렸다. 그걸 보고 더욱 자신을 얻었는지, 계포가 망설임 없이 넓은 식견을 펼쳐 보였다.
“간장은 달리 구야자(句冶子)라고 불리기도 하는 옛적 대장장이의 이름이며, 막야는 그 아낙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간장은 자신이 만든 칼 중에서 숫칼[雄劍]에는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암칼[雌劍]에는 아내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명검 간장과 막야가 만들어진 경위나 그 뒷일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갈래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간장이 오나라 사람으로 장군께서도 알고 계시듯 오왕 합려의 명에 따라 그 두 칼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쇳물이 제대로 녹지 않더니 부부가 머리칼을 자르고 손톱을 깎아 넣자 비로소 쇳물이 제대로 어우러졌다고 합니다. 안타깝게 여기던 아내 막야가 쇳물에 뛰어들고 나서야 칼이 어우러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쨋든 그렇게 어렵게 만든 까닭인지 간장은 칼 두 자루를 만든 뒤 수칼 간장은 감추어버리고 암칼 막야만 오왕에게 바쳤습니다. 그 때문에 대장장이 간장은 오왕에게 해코지 당했을 거란 말도 있으나, 명검 간장은 끝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설은 간장이 오나라 사람이 아니라 초나라 사람이며, 칼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도 초왕(楚王)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장이 너무 공을 들여서인지 삼년이 지나서야 겨우 칼 두 자루를 만들자 성난 초왕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걸 안 간장은 그때 만삭이던 아내 막야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명을 받들어 칼을 만들게 되었는데 삼년이 걸려서야 겨우 칼 두 자루를 만들 수 있었소. 그 때문에 왕이 몹시 성나 있다 하니, 이번에 가면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오. 이에 칼 한 자루를 감추고 가는 바, 만약 당신이 아들을 낳거든 그 아이가 자란 뒤에 집을 나가 남산(南山)을 바라보라 이르시오. 그러면 바위 위에 난 소나무 뒤에 그 칼이 있을 것이오. 그 칼을 찾아 아비의 한을 씻어달라 하시오.” 그런 다음 암칼 막야만 지고 초왕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간장의 일손이 더딘데 성이 나 있던 왕은 사람을 시켜 칼의 상(相)을 보게 한 뒤 더욱 성이 났습니다. 원래 암수 두 자루의 칼이 만들어졌는데 암칼만 들고 왔다는 걸 알게된 까닭이었습니다. 초왕은 간장을 다그쳤으나 숫칼이 없다고 끝내 잡아떼자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 정말로 아들을 낳게된 막야는 아들이 자라자 남편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막야의 아들은 집을 나가 남산을 바라보았으나 남산은 보이지 않고 집 앞 주춧돌 위에 선 소나무 기둥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돌 위에 선 소나무라 여긴 아들이 도끼로 기둥을 쪼개보니 정말 그 뒤에서 칼 한 자루가 나왔습니다. 바로 숫검 간장이었습니다. 칼을 찾은 아들은 그날로 아비를 죽인 초왕에게 원수를 갚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마가 한자나 되는 사람이 원수를 갚으려고 덤비는 꿈을 꾸게된 초왕은 천금을 걸고 그 자객을 잡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삼왕묘(三王墓)의 전설이 생겨났는데, 거기 따르면 간장검(干將劍)은 그 뒤 초나라 왕실에 있게됩니다.”
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 >
-

횡설수설
구독
-

부동산 빨간펜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트렌드뉴스
-
1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2
李, 로봇 도입 반대한 현대차노조 겨냥 “거대한 수레 피할수 없다”
-
3
“밀약 여부 밝혀야”…與의원에 보낸 국무위원 ‘합당 메시지’ 포착
-
4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
5
K방산 또 해냈다…한화, 노르웨이에 ‘천무’ 1조원 규모 수출
-
6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
7
트럼프 “다른 나라는 현금인출기…펜 휘두르면 수십억불 더 들어와”
-
8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9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10
“참으려 해도 뿡” 갱년기 방귀, 냄새까지 독해졌다면?
-
1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2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3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
4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5
李 “국민의견 물었는데…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
-
6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7
‘소울메이트’서 정적으로…장동혁-한동훈 ‘파국 드라마’
-
8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
9
[속보]장동혁 국힘 지도부, 한동훈 제명 확정
-
10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트렌드뉴스
-
1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2
李, 로봇 도입 반대한 현대차노조 겨냥 “거대한 수레 피할수 없다”
-
3
“밀약 여부 밝혀야”…與의원에 보낸 국무위원 ‘합당 메시지’ 포착
-
4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
5
K방산 또 해냈다…한화, 노르웨이에 ‘천무’ 1조원 규모 수출
-
6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
7
트럼프 “다른 나라는 현금인출기…펜 휘두르면 수십억불 더 들어와”
-
8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9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10
“참으려 해도 뿡” 갱년기 방귀, 냄새까지 독해졌다면?
-
1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2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3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
4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5
李 “국민의견 물었는데…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
-
6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7
‘소울메이트’서 정적으로…장동혁-한동훈 ‘파국 드라마’
-
8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
9
[속보]장동혁 국힘 지도부, 한동훈 제명 확정
-
10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 卷二. 바람아 불어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사설]李 한마디에 미뤄둔 법안 91건 하루 만에 처리… 여태 뭐 하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260578.1.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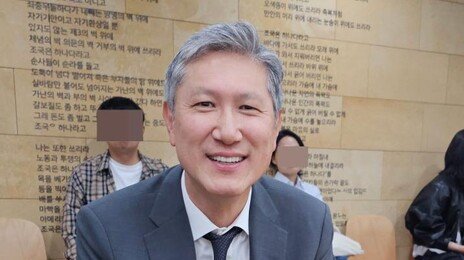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