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9·11 다음달이면 10년… 소방관 아들 잃은 아버지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3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그날 이후 매일 잿더미 뒤져 석달만에 아들 시신 찾았는데…
대뜸 나온 첫마디가 ‘운좋다’… 美 아이엘피 씨 애끓는 父情

사냥과 캠핑으로 인생 후반부를 보내고 있었다. 두 아들은 대를 이어 소방관이 됐다. 남들이 “위험한 일을 자식에게도 시키느냐”고 하면 그저 “애들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자랑스러워했다. 인생은 잔잔한 강물처럼 흘렀다.
운명은 한순간에 바뀌었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55분. 손때 묻은 검은색 휴대전화가 울렸다. 큰아들 조너선이었다. “아버지, 월드트레이드센터로 출동할 거예요.” 비행기가 110층 건물에 처박히는 장면을 CNN 방송으로 본 직후였다. “조심해라.”
30초 남짓했던 통화. 은퇴한 소방관 리 아이엘피 씨(당시 56세)는 불안했다. TV를 껐다. 반바지 반팔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30분 뒤 도착한 뉴욕 로어맨해튼 지역. 검은 연기로 가득 차 3m 앞도 보이지 않았다. 휴대용 라디오에서 남측 타워가 무너졌다는 앵커의 다급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옷이 찢긴 채 피 흘리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2001년 9월 11일을 ‘그날’이라고 불렀다.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그날 이후 아이엘피 씨는 매일 현장을 뒤졌다. 특수 장비로 잔해더미에 사람 1명이 지나갈 만한 구멍을 뚫고 안으로 들어갈 때면 다시는 못 나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아이엘피 씨와 다른 희생자 가족들은 ‘제발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땅을 파고 또 팠다.
3개월 뒤인 2001년 12월 11일 아침. 아이엘피 씨 집 전화벨이 울렸다. 소방대장이 나지막한 톤으로 말했다. “찾은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 브랜든과 함께 시신 발굴현장으로 달려갔다. 얼굴은 콘크리트 더미에 짓눌려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288 소방대’라는 인식표와 지갑 속 가족사진에서 아들의 체취가 물씬 났다. “운이 좋군.” 그의 이 말에 주변 사람들의 눈이 커졌다. 아들의 주검 앞에서 ‘운이 좋다’라니. “팔다리를 다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내 친구와 동료들은 아직 ‘손톱 하나라도 찾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울고 있는데….” 주름으로 이마가 깊게 팬 이탈리아계 미국 노인의 넋두리가 가늘게 떨렸다. 실제 뉴욕시의 ‘9·11 피해자 조사반’은 아직도 테러로 희생된 사람들의 몸의 일부로 추정되는 2만여 개의 조직을 모아 신원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아들을 묻고도 그는 6개월 동안 현장을 찾았다. 고귀한 희생이 잊혀지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다. 가족단체를 만들어 ‘그날’을 기억하도록 학생들을 교육하고 희생자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는 일을 시작했다. 낙담한 희생자 가족이 “당신, 여기서 일어난 일을 그렇게 기억하고 싶어? 몸서리쳐지지 않아?”라고 따지듯 물을 때마다 맘을 독하게 먹었다. “물론 아프지. 난 아들을 잃었어. 그래도 증오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순 없잖아.”
6월 9일 오후, 아이엘피 씨는 ‘그라운드제로’ 지역에 있는 희생자가족 사무실에서 빈라덴 사살 소식을 들으며 느낀 그 복잡한 감정을 추스르고 있었다. “복수로는 일을 풀 수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의 연평도를 포격한 북한처럼 1명이 다수를 지배하는 이상한 나라일수록 복수는 사태를 키울 뿐입니다. 교육으로 민주주의와 가족의 가치를 소외된 지역에 알리려는 ‘긍정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북한 같은 테러집단에까지 소중한 가치가 퍼지도록 말이죠. 내 아들도 그걸 원할 거예요.”
그레이트넥 고등학교 하키팀에서 16번을 달고 공을 몰던 날쌘돌이, 고향 소방자원봉사대 일을 도맡아 했던 오지랖 넓은 아이, 소방관이 되려는 꿈 때문에 2년 동안의 뉴욕경찰 생활을 미련 없이 접은 고집쟁이. 그리고 아내 예세니아와 두 아들 앤드루와 오스틴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녔던 따뜻한 가장. 그라운드제로 공사 현장을 내려다보는 아이엘피 씨의 눈에 조너선이 비쳤다.
뉴욕=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트렌드뉴스
-
1
“스페이스X 기대감에 200% 급등”…블룸버그, 한국 증권주 ‘우회 투자’ 부각
-
2
[단독]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 서울 아파트로 제한 검토
-
3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4
분노한 트럼프, 전세계에 10% 관세 카드 꺼냈다…“즉시 발효”
-
5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6
김길리 金-최민정 銀…쇼트트랙 여자 1500m 동반 메달 쾌거
-
7
길에서 주운 남의 카드로 65만원 결제한 60대 벌금 500만원
-
8
“호랑이 뼈로 사골 끓여 팔려했다”…베트남서 사체 2구 1억에 사들여
-
9
美대법 “의회 넘어선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통상전략 뿌리째 흔들려
-
10
스벅 통입점 건물도 내놨다…하정우, 종로-송파 2채 265억에 판다
-
1
“尹 무죄추정 해야”…장동혁, ‘절윤’ 대신 ‘비호’ 나섰다
-
2
한동훈 “장동혁은 ‘尹 숙주’…못 끊어내면 보수 죽는다”
-
3
尹 “계엄은 구국 결단…국민에 좌절·고난 겪게해 깊이 사과”
-
4
유시민 “李공소취소 모임, 미친 짓”에 친명계 “선 넘지마라”
-
5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6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7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8
尹 ‘입틀막’ 카이스트서…李, 졸업생과 하이파이브-셀카
-
9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10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트렌드뉴스
-
1
“스페이스X 기대감에 200% 급등”…블룸버그, 한국 증권주 ‘우회 투자’ 부각
-
2
[단독]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 서울 아파트로 제한 검토
-
3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4
분노한 트럼프, 전세계에 10% 관세 카드 꺼냈다…“즉시 발효”
-
5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6
김길리 金-최민정 銀…쇼트트랙 여자 1500m 동반 메달 쾌거
-
7
길에서 주운 남의 카드로 65만원 결제한 60대 벌금 500만원
-
8
“호랑이 뼈로 사골 끓여 팔려했다”…베트남서 사체 2구 1억에 사들여
-
9
美대법 “의회 넘어선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통상전략 뿌리째 흔들려
-
10
스벅 통입점 건물도 내놨다…하정우, 종로-송파 2채 265억에 판다
-
1
“尹 무죄추정 해야”…장동혁, ‘절윤’ 대신 ‘비호’ 나섰다
-
2
한동훈 “장동혁은 ‘尹 숙주’…못 끊어내면 보수 죽는다”
-
3
尹 “계엄은 구국 결단…국민에 좌절·고난 겪게해 깊이 사과”
-
4
유시민 “李공소취소 모임, 미친 짓”에 친명계 “선 넘지마라”
-
5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6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7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8
尹 ‘입틀막’ 카이스트서…李, 졸업생과 하이파이브-셀카
-
9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10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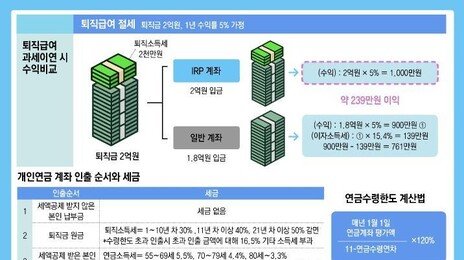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