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직접 둘러본 한국 몰라도 너무 몰랐다"
-
입력 2005년 10월 21일 03시 08분
글자크기 설정

■ 美 교과서 출판 담당자들
미국 주요 교재 출판사 프렌티스 홀의 낸시 길버트 사회학담당 편집국장은 궁금했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건만 미국 초중고교 세계사 교과서에 실린 한국의 모습은 언제나 초라했다. 중국과 일본 역사는 10페이지씩이나 상세하게 수록된 것과는 달리 한국은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함께 뭉뚱그려져서 한 페이지도 못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국은 내세울 만한 역사가 없는 나라일까.’
마침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과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공동 주관하는 ‘폴 펠로십(Fall Fellowship)’이 있었다. 미국 출판 관계자들을 초청해 한국 연수답사와 학술강좌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길버트 국장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12명의 미국 출판계 주요 인사는 10월 9일부터 11박 12일 일정으로 전국 문화유적지를 샅샅이 훑으며 한국을 배웠다. 마지막 방문지로 제주를 찾은 일행을 18, 19일 이틀 동안 동행 취재했다.
첫째 날 제주교육과학연구소(소장 안성수·安成洙 제주대 교수) 주최 ‘제주도 세계화를 위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던 이들은 둘째 날 직접 옹기를 굽고 조랑말을 타며 해녀들과 얘기도 나눴다.
둘째 날 저녁 한국답사를 마무리하는 즉석 토론회가 열리자 미국 교과서에 한국 내용이 보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가장 먼저 손을 든 맥두걸 리텔 출판사의 마시 구달 편집국장은 “우리 출판사가 발행하는 세계사 교과서에 한국사를 별도 항목으로 수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사 내용은 내가 직접 쓰겠다”고 말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스콜라스틱 백과사전 출판사의 조지프 카스타노 편집장은 동해 표기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대다수 미국 백과사전이 관습적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써온 것이 사실”이라며 “전문가의 체계적인 한일역사 강의를 듣고 나니 표기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미국 교육계에 한국 역사를 정확하게 알리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길버트 국장은 “미국 교과서에 실리는 내용의 주제를 결정하는 곳은 주 교육청”이라며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교육청이 결정한 주제는 불교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한반도가 다리 역할을 했다는 사실밖에 없을 정도로 미국 교육계는 한국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인솔을 맡은 최영진 코리아소사이어티 한국학 실장은 “한국을 아는 미국 출판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국정보 부족과 오류 발생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폴 펠로십’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 지난해엔 하코트 출판사 발행 중학교 교과서가 처음으로 한국사를 독립 항목으로 채택했다고 최 실장은 덧붙였다.
한국 유교에 관한 기획 기사를 준비 중인 톰 오닐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 기자는 한국 문화유산을 둘러본 참가자들의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서울 일정이 너무 짧다고 다들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에만 머물렀다면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른 새벽 올리는 해인사의 경건한 예불도, 수백 년 넘게 유교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경주 양동마을 선비의 꼿꼿한 자존심도, 제주 해녀의 아름다운 모습도….”
제주=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각국 박물관 큐레이터들
 |
“공부가 저절로 될 것 같다.”
18일 오후 경주시 안강읍 숲 속의 옥산서원(玉山書院·사적 154호)을 둘러보던 세계 주요 박물관의 한국 예술품 담당 큐레이터들은 명지대 한국건축문화연구소 김홍식(金鴻植·59·건축학부 교수) 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연방 고개를 끄덕였다.
숲을 나오면 독락당(獨樂堂·보물 413호). 독락당과 옥산서원은 조선 중기 대학자인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迪) 선생의 행적이 남아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한류(韓流)를 한국문화의 브랜드를 높이는 씨앗으로 만들어야죠.”
“대규모 국제 전시회로 한국을 지구촌에 알리는 건 어떨까요.”
가을빛을 머금은 한국의 옛 건축에 취한 듯 큐레이터들은 너나없이 한두 마디씩 소감을 털어놨다.
이들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權仁赫)이 마련한 ‘해외박물관 큐레이터 워크숍’에 참여한 11개국 31명의 큐레이터. 국적은 미국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3명, 영국 2명,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대만 덴마크 독일 러시아 멕시코가 각 1명이다.
7회째인 올해 워크숍 주제는 ‘한국의 건축’. 그동안의 주제는 한국의 고미술, 회화, 도자기, 불교미술, 공예, 고분 등이었다.
두 번째 참여한 대만국립역사박물관 청치런(成耆仁·58·여) 박사는 “한류 덕분에 대만과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도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문화의 인식이 낮은 만큼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2년부터 네 번째 참여한 미국 오리건대 박물관 찰스 래크먼(56) 씨는 “미국서도 동양미술이라면 중국이나 일본만 생각할 정도”라며 아쉬워했다.
그는 올 1월 이 대학 박물관에 한국실을 마련했다. 소장품이래야 조선시대 그림 30여 점이 고작. 그래도 북미지역 대학 가운데 한국미술실이 별도 공간에 설치된 곳은 오리건대뿐이라고 했다.
현재 해외박물관에 한국실이나 한국코너가 설치된 곳은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영국 대영박물관 등 17개국 50여 개. 2007년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에 70평 규모의 한국실이 설치된다. 1980년까지는 15곳에 불과했다.
한국실이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한국미술 전문 큐레이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아시아 또는 중국 및 일본 전문 큐레이터가 한국을 ‘곁가지’로 맡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도 한국의 문화예술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블루오션’은 보인다. 덜 알려진 만큼 참신함이 살아 있다는 것이 강점이기 때문이다.
| 주요 해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 현황 | ||
| 국가 | 박물관 | 한국실 규모(개설일) |
| 미국 | 시애틀 동양박물관 | 42평, 155점 (1994년 8월) |
|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 48평, 200여 점 (1998년 6월) | |
| LA 카운티 박물관 | 56평, 324점 (1999년 10월) | |
| 샌프란시스코 박물관 | 78평, 700여 점 (2003년 3월) | |
|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 | 78평, 2500여 점 (2003년 6월) | |
| 오리건 박물관 | 38평, 380여 점 (2005년 1월) | |
| 캐나다 | 로열 온타리오 박물관 | 65평, 730여 점 (1999년 9월) |
| 영국 | 대영 박물관 | 120평, 3200점 (2000년 11월) |
| 프랑스 | 기메 박물관 | 108평, 1000여 점 (2001년 1월) |
| 독일 | 쾰른 동양박물관 | 27평, 300여 점 (1995년 7월) |
| 17개국 50여 개 박물관에 한국실 또는 한국코너 설치. 자료:한국국제교류재단 | ||
경주=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트렌드뉴스
-
1
“‘이 행동’ 망막 태우고 시신경 죽인다”…안과 전문의 경고
-
2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3
‘4선 국회의원’ 하순봉 前한나라당 부총재 별세
-
4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5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6
“설거지해도 그대로”…냄비 ‘무지개 얼룩’ 5분 해결법 [알쓸톡]
-
7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8
“한동훈 ‘당게’ 사건, 최고위원 전원 공개 검증” 제안…韓 받을까
-
9
이효리 부부 “구아나가 떠났습니다”…15년 반려견과 작별
-
10
“징역 5년에 처한다”…무표정 유지하던 尹, 입술 질끈 깨물어
-
1
“뼛속도 이재명” 배우 이원종, 콘텐츠진흥원장 거론
-
2
“한동훈 ‘당게’ 사건, 최고위원 전원 공개 검증” 제안…韓 받을까
-
3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20조씩 푼다
-
4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5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6
조셉 윤 “尹 구명 시위대 제정신 아니라 느껴…성조기 흔들어”
-
7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8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9
중국發 미세먼지-내몽골 황사 동시에 덮쳐… 전국 숨이 ‘턱턱’
-
10
[단독]용산 근무 보수청년단체 회장 “대북 무인기 내가 날렸다”
트렌드뉴스
-
1
“‘이 행동’ 망막 태우고 시신경 죽인다”…안과 전문의 경고
-
2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3
‘4선 국회의원’ 하순봉 前한나라당 부총재 별세
-
4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5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6
“설거지해도 그대로”…냄비 ‘무지개 얼룩’ 5분 해결법 [알쓸톡]
-
7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8
“한동훈 ‘당게’ 사건, 최고위원 전원 공개 검증” 제안…韓 받을까
-
9
이효리 부부 “구아나가 떠났습니다”…15년 반려견과 작별
-
10
“징역 5년에 처한다”…무표정 유지하던 尹, 입술 질끈 깨물어
-
1
“뼛속도 이재명” 배우 이원종, 콘텐츠진흥원장 거론
-
2
“한동훈 ‘당게’ 사건, 최고위원 전원 공개 검증” 제안…韓 받을까
-
3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20조씩 푼다
-
4
국힘 당명 바꾼다는데…‘책임, 청년, 자유’ 최근 많이 언급
-
5
美 “반도체 시설 40% 내놓거나 관세 100%”…대만 당혹
-
6
조셉 윤 “尹 구명 시위대 제정신 아니라 느껴…성조기 흔들어”
-
7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
8
[김순덕의 도발] ‘李부터 연임’ 개헌,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말했다
-
9
중국發 미세먼지-내몽골 황사 동시에 덮쳐… 전국 숨이 ‘턱턱’
-
10
[단독]용산 근무 보수청년단체 회장 “대북 무인기 내가 날렸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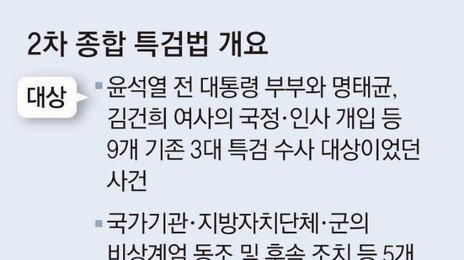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