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농협 사이버테러 ‘북한’ 배후 발표 한달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北공격 대비 후속조치 전혀 없어… 행안부-국정원 책임 미루며 뒷짐
지난달 3일. 검찰은 농협의 전산망 마비 사건의 주범으로 북한을 지목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났다.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였는데 보안 전문가들은 “너무 조용하다”고 입을 모은다. 북한의 도발이었다면 정부의 대응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문이다. 대다수 기업들은 “전산보안을 위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며 유사한 사태가 터질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입장이다.○ “나머지 200대는 어디에?”
외부 해커의 침입으로 농협 전산망이 뚫렸다. 그리고 이 침입자는 북한인 것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증거와 침투 경로는 국가정보원만이 알고 있다. 무엇보다 국정원은 북한이 201대의 PC를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나머지 200대다. 한 금융회사 보안책임자는 “나머지 200대 PC 가운데 하나가 우리 직원 컴퓨터일지도 모르는데 이 리스트를 금융회사나 통신사 등 기반시설 전산담당자에게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통신사 최고정보책임자는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 양상 등 최소한의 대응 방안이 담긴 공문이라도 국정원에서 나오면 좋겠는데 왜 그런 게 전혀 없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보안업체 관계자는 “보안 사고가 나면 정부기관이 악성코드를 채취해 백신업체에 보내고, 이를 토대로 백신을 만드는데 관련 악성코드 샘플이 국내외 모든 백신회사에 동시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업체마다 시차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백신업체 사이의 정보 공유, 사용자에 대한 정보 공개 문제가 숙제로 남는 이유다.
○ 정부는 ‘네 책임’ 공방만
북한이 범인이 되면서 정부 부처는 서로 ‘남 탓’만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반시설의 사이버 침해 정책을 주관하는 곳은 행정안전부.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집을 지키는 것은 우리 책임이지만 범인이 북한이면 국정원 소관”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규정에 따라 민간기관의 사이버 공격은 우리가 대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정원에 민간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더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특정 정부기관이 광범위한 민간 PC 사찰 권한을 갖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소행이든 아니든 간에 정부가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해 민간기업의 불신을 키우고, 체계적인 대응을 막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한 정보기술(IT) 업체 임원은 “결국 북한의 소행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람 관리뿐”이라고 털어놨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트렌드뉴스
-
1
새벽 화재로 10대 숨진 은마아파트,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안돼
-
2
‘방송 하차’ 조세호, 조폭 지인 언급…“여전히 가끔 만나 식사하는 사이”
-
3
김태희 한남더힐 7년만에 시세차익 85억…127억 매수자는 ‘이사람’
-
4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5
소방서에 1시간씩 욕설 전화…“민원 생길라” 응대하다 발 묶여
-
6
[횡설수설/우경임]“훈식 형 현지 누나” 돌아온 김남국
-
7
서울 매물 한달새 22% 늘며 집값 오름세 둔화… 주담대도 줄어
-
8
野 내부 “대구경북 통합 누가 반대했나” 송언석 “명예훼손” 사의 표명
-
9
“美, 새 ‘국가안보 관세’ 추진”… 배터리-전력망 등 6대 산업 겨냥
-
10
가짜 돈 내민 할머니에게 7년째 음식 내준 노점상
-
1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2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3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4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5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6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7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8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불쾌감
-
9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
10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트렌드뉴스
-
1
새벽 화재로 10대 숨진 은마아파트,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안돼
-
2
‘방송 하차’ 조세호, 조폭 지인 언급…“여전히 가끔 만나 식사하는 사이”
-
3
김태희 한남더힐 7년만에 시세차익 85억…127억 매수자는 ‘이사람’
-
4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5
소방서에 1시간씩 욕설 전화…“민원 생길라” 응대하다 발 묶여
-
6
[횡설수설/우경임]“훈식 형 현지 누나” 돌아온 김남국
-
7
서울 매물 한달새 22% 늘며 집값 오름세 둔화… 주담대도 줄어
-
8
野 내부 “대구경북 통합 누가 반대했나” 송언석 “명예훼손” 사의 표명
-
9
“美, 새 ‘국가안보 관세’ 추진”… 배터리-전력망 등 6대 산업 겨냥
-
10
가짜 돈 내민 할머니에게 7년째 음식 내준 노점상
-
1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2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3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4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5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6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7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8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불쾌감
-
9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
10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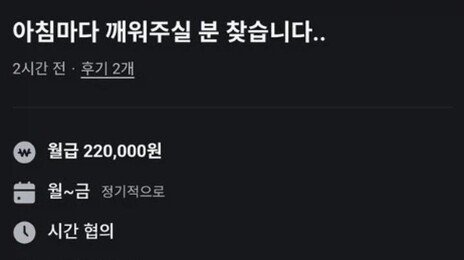

![[횡설수설/우경임]“훈식 형 현지 누나” 돌아온 김남국](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416421.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