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 사람이 읽는 법]글에 대해 글 쓰는 일에 대한 글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책 대 담배/조지 오웰 지음·강문순 옮김/108쪽·8800원·민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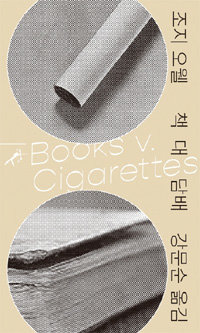
“고맙지만 사양할게. 가진 책들도 조금씩 처분하고 있어서.”
3년 전이다. 우연히 얻은 책을 살피다 그 분야를 좋아하는 선배에게 건네자 그가 그렇게 말했다. 지난해 여름 문득 그 기억을 돌이켰다. 읽을 가능성 없는 책은 장식만도 못한 가식이다. 오래전 내 방 책꽂이를 구경하며 “곰팡내가 난다”고 했던 친구의 말도 그즈음 부끄럽게 납득했다.
“여러 번 읽게 되는 책이 있고, 정신 일부를 구성하는 책이 있고,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는 책이 있고, 겉핥기로 대충 읽는 책이 있고, 한자리에서 다 읽었지만 한 주 정도 지나면 깡그리 잊어버리는 책도 있다.”(12쪽)
“상당한 양의 서평을 쓰다 보면 책 대부분을 과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책과 일종의 직업적인 관계를 맺기 전에는 대부분의 책이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평론이 정말 정직하게 써진다면 열에 아홉의 요지는 ‘이 책은 하잘것없다’일 것이다.”(18쪽)
몇 해 전, 책면 기사를 마감하고 나와서 취재원과 점심을 먹고 있는데 당시 출판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볼륨을 낮출 틈도 없이 그가 던진 육두문자가 조그마한 식당 안을 가득 울렸다. 순화해서 옮기자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말이었다.
“야! 이 시건방진 놈아! 이따위로 ‘이 책 사서 읽지 말라’고 쓰려면 뭐 하러 책 기사를 써! 네가 책임지고 대안 찾아서 오후에 메꿔 놔!”
“작가가 정확히 제때에 지조를 바꾸려면 주관적인 감정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그 감정을 완전히 억눌러야 한다. 어느 경우든 본인 삶의 동력은 파괴된다. 더 이상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해온 단어들을 다시 쓰려고 하면 그 단어가 순식간에 경직된다.”(31쪽)
치유제를 가장한 진통제로 뒤범벅 착색한 지난 몇 해의 베스트셀러들을 못 본 척하기로 마음먹었을 즈음 내 글의 동력은 멈췄다. 오웰은 서평가에 대해 ‘오전 11시 반에 가운 차림으로 숙취에 망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맞는 말이다. 책 더미를 아무리 허물어도 숙취와 곰팡내는 가시지 않을 거다. 다 허물고 어떤 책이 남게 될지, 그것 하나만은 궁금하다.
disegn0@naver.com
트렌드뉴스
-
1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
2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3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4
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韓 대미 투자, 반도체-車 영향은?
-
5
‘신격호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향년 85세
-
6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7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8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9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10
취권하는 중국 로봇, ‘쇼’인 줄 알았더니 ‘데이터 스펀지’였다?[딥다이브]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4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5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6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7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8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9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10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트렌드뉴스
-
1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
2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3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4
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韓 대미 투자, 반도체-車 영향은?
-
5
‘신격호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향년 85세
-
6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7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8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9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10
취권하는 중국 로봇, ‘쇼’인 줄 알았더니 ‘데이터 스펀지’였다?[딥다이브]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4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5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6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7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8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9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10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합리적 관련성’ 없는 별건 수사 말라는 법원의 경고[오늘과 내일/장택동]‘](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392680.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