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민중미술은 따분’ 편견일랑 거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7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기획전 ‘사회 속 미술: 행복의 나라’
이땅에 새겨진 균열과 저항의 모습… 때론 진지하게 때론 위트있게 표현

서울 노원구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은 근처 주민이나 근무자가 아니면 찾아가기 용이한 곳이 아니다. 주변에서 연계해 즐길 대상도 마땅찮다. 7월 6일까지 열리는 기획전 ‘사회 속 미술: 행복의 나라’는 언뜻, 그 불리한 접근성을 상쇄할 매력을 지닌 전시로 보이지 않는다. 기획 키워드는 ‘민중미술’.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한 날씨를 감안하면 시간 내서 들여다보기 무겁게 여겨지는 주제다.
결론부터 밝히면 가볼 만하다. 비가 시원하게 퍼부은 15일 오후 찾아간 덕도 있겠지만, 물리적 배치나 내용의 짜임새 모두 엉성하지도 지루하지도 않다. 작가별로 모으거나 연대순으로 나열하며 관람객을 공부시키듯 정리하려 들지 않은 덕이다. 진지한 이야기를 품은 작품 곁에는 살짝 힘을 뺀 위트를 드러낸 작품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보는 이의 호흡을 적절하게 배려했다.


2층 전시실 정윤석 작가의 12분 길이 영상작품 ‘별들의 고향’도 눈길을 끈다. 곁에 앉아 영상을 지켜보던 남성 관람객이 동행을 돌아보며 “야, 다른 나라 얘기 같다”고 말했다. 지존파, 삼풍백화점 붕괴 등 굵직한 사건 관련 이미지와 함께 중고교의 총검술 수업, ‘유신으로 번영하자’는 표어 등 이 나라의 생생한 현실이었던 과거 영상이 숨 가쁘게 교차한다.
기 부장은 “1980년대 리얼리즘 회화에 얽매이지 않고자 ‘민중미술’이라는 단어를 배제했다. 역사는 반복된다. 현재의 작가도 나름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발언한다. 미술을 매개로 삼은 사회운동은 지금도 당연히 유효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렌드뉴스
-
1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2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3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4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5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6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7
V리그 역사에 이번 시즌 박정아보다 나쁜 공격수는 없었다 [발리볼 비키니]
-
8
장동혁, 친한계 반발에 “수사결과 韓징계 잘못땐 책임지겠다”
-
9
‘아파트’로 무대 연 그래미 시상식, ‘골든’으로 혼문 닫았다
-
10
“떠난 뒤 빈소 찾는 건 허망… 생전에 ‘고마웠다’ 말 나눴으면”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5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장동혁, 친한계 반발에 “수사결과 韓징계 잘못땐 책임지겠다”
-
8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9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10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트렌드뉴스
-
1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2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3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4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5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6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7
V리그 역사에 이번 시즌 박정아보다 나쁜 공격수는 없었다 [발리볼 비키니]
-
8
장동혁, 친한계 반발에 “수사결과 韓징계 잘못땐 책임지겠다”
-
9
‘아파트’로 무대 연 그래미 시상식, ‘골든’으로 혼문 닫았다
-
10
“떠난 뒤 빈소 찾는 건 허망… 생전에 ‘고마웠다’ 말 나눴으면”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5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장동혁, 친한계 반발에 “수사결과 韓징계 잘못땐 책임지겠다”
-
8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9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10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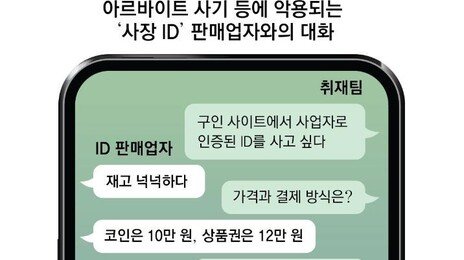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