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문학예술]전율, 그게 재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1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거장들이 자기파괴와 창조력으로 빚어내는 변주곡
◇그러나 아름다운/제프 다이어 지음/한유주 옮김/352쪽·1만5000원/사흘

보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 그건 달리 말하면, 우리의 눈을 이해해 가는 비밀의 문을 여는 일이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 논픽션 작가 제프 다이어의 ‘그러나 아름다운’을 읽는다는 건 작가의 눈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이 책이 ‘보는 것(seeing)의 대가’라 불리는 영국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존 버거에게 헌정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비밀은 더욱 선명해진다. 버거는 기억이 흐릿한 어느 책에서, 한때의 이야기를 빌려 “우리 작가들이 죽음의 서기(書記)일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짧은 삶 속에서 렌즈들을 연마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글을 쓴다는 건 그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과 마찬가지란 속내이리라.
‘그러나 아름다운’이 가진 비밀은 듀크 엘링턴이나 레스터 영, 아트 페퍼와 같은 재즈 거장들의 음악에 묻어났던 미묘한 질감을 고스란히 담아뒀다는 점이다. 이는 어떤 엄격함에 도취된 자들에게서나 보이는 집요함과는 다르다. 자신의 본질에 배어있는 어떤 천진함으로 세상의 속살을 발견해 가는 예인(藝人)들의 영혼이 진득하게 녹아들어 있다.

질곡의 삶과 기이한 행각 탓에 인생에 비애가 넘쳐나는 예술가들은 어느 시대나 넘쳐났다. 반대로 예술가 자체는 비교적 선명한 족적을 남겼음에도 정작 작품은 ‘숨겨진 비밀을 갖지 못한’ 보잘것없는 경우도 상당하다. 다이어의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경험하는 이런 괴리는 놀랍게도 일종의 ‘기상예보’와 같은 내러티브를 따라 움직인다. 현재 ‘여기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기상예보를 따라 움직이는 듯한 재즈 뮤지션들의 삶은 조금씩 ‘이곳에’ 남겨진다. 만신창이인 채로.
이처럼 복잡한 상관관계를 가진 재즈 뮤지션들의 자기파괴와 창조력을 잠시 되새김질해 보자. 그건 같은 예술의 범주인 시란 걸 쓰는 입장에서 공포의 순간처럼 다가왔다. 어두운 길을 가다가 문득, 어떤 정적의 지점에서 알 수 없는 어둠을 의식할 때 느끼는 끔찍함이란…. 게다가 이런 두려움은 홀로 목격할 때보다, 오히려 함께 길을 가던 곁에 있는 이에게서 같은 감정의 표정을 발견했을 때 더 크게 번져나가지 않던가. 두려운 것은 어쩌면 상대방 내면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은 아닐는지. 재즈를 둘러싼 이 풍성하되 메마른 영혼들의 만남이 결국 서로를 갉아먹고 생채기 내는 건 아마도 이 때문일 것이다.

다시 한 번 버거를 떠올려 본다. 그는 어느 책 귀퉁이에 이렇게 메모했다.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은 화폭 안에서 어지럽게 서로 몰두한다.’ 우산은 잠시 접어둬도 좋다. 음악에 온몸을 흠뻑 적셔보자. 쇠약한 외피를 차갑게 식혔다가, 그 떨림 그대로 열꽃이 피어오르길. 그게 바로 재즈다.
김경주 시인·극작가

임희윤 기자 imi@donga.com
문학예술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테크챗
구독
-

아파트 미리보기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트렌드뉴스
-
1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2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3
이혜훈 “장남 결혼직후 관계 깨져 함께 살아…이후 다시 좋아져”
-
4
천하람 “장남 부부관계 깨져? 혼인신고 기다려준 완전 효부”
-
5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6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7
압수한 비트코인 분실한 檢… 수백억대 추정
-
8
재판부, ‘尹 2024년 3월부터 계엄 모의’ ‘제2수사단 구성’ 인정
-
9
김연경 유튜브 나온 김연아 “운동 걱정 안하고 살아 너무 좋아”
-
10
트럼프 “그린란드에 골든돔 구축할것…합의 유효기간 무제한”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3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4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5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6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7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8
이혜훈 “장남 결혼직후 관계 깨져 함께 살아…이후 다시 좋아져”
-
9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10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트렌드뉴스
-
1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2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3
이혜훈 “장남 결혼직후 관계 깨져 함께 살아…이후 다시 좋아져”
-
4
천하람 “장남 부부관계 깨져? 혼인신고 기다려준 완전 효부”
-
5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6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7
압수한 비트코인 분실한 檢… 수백억대 추정
-
8
재판부, ‘尹 2024년 3월부터 계엄 모의’ ‘제2수사단 구성’ 인정
-
9
김연경 유튜브 나온 김연아 “운동 걱정 안하고 살아 너무 좋아”
-
10
트럼프 “그린란드에 골든돔 구축할것…합의 유효기간 무제한”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3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4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5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6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7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8
이혜훈 “장남 결혼직후 관계 깨져 함께 살아…이후 다시 좋아져”
-
9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10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평창 온 괴짜 할배 “이 아름다운 나라에 핵폭탄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2/10/8860347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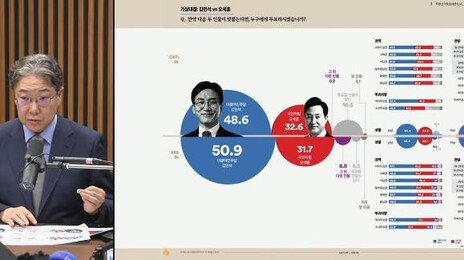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