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제경영]‘격동의 시대, 신세계에서의 모험’
-
입력 2007년 10월 20일 03시 09분
글자크기 설정

“나는 모든 해답을 안다고 자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의 내 유리한 위치 때문에, 광범위한 사안들에 관해 아주 유익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이 내게는 있었다.”
앨런 그린스펀(81·사진).
사실 그에 대한 설명은 그다지 필요 없다. 18년 6개월간 미국 FRB 의장 역임, 무엇보다 그린스펀의 서류가방이 홀쭉해야 세계 경제도 평온하다는 방송사 CNBC의 ‘서류가방 지수(briefcase indicator)’의 주인공이던 ‘세계 금융 대통령’이었다.
저자의 회고록은 출간 전부터 화제였다. 1968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경제자문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벤 버냉키에게 의장직을 내줄 때까지 그린스펀은 세계 경제의 핵심이었다. 지금도 그의 영향력은 여전하단 말이 나올 정도니 책에 대한 관심도 엄청났다. ‘800만 달러 플러스알파’였다는 선인세도 화제가 됐다.
책 내용도 연일 언론에 오르내렸다. “이라크전쟁은 석유전쟁이었다.” “2030년 중국의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금리는 10%대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외환보유액으로 ‘돈놀이’를 해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평생 공화당원이었지만 부시의 공화당 정책은 실망스러운 수준.”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논란과 반박이 연일 이어졌다.
책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1∼11장은 자서전이다.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발자취를 되짚었다. 하지만 한국과 관련되거나 9·11테러 당시 상황을 그린 부분을 제외하면 그다지 흥미롭진 않다. 유명 앵커 바버라 월터스를 사귀었고, ‘재즈의 거장’ 스탄 게츠와 같은 밴드에서 클라리넷이나 색소폰을 연주했다는 뮤지션 이력이 눈길을 끈다.
흥미로운 부분은 세계 경제의 미래에 대한 명쾌한 전망을 담은 후반부다. 미국 중국 인도 등 세계 각국의 경제를 진단한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4마리 용(그린스펀의 표현은 호랑이)에게 이제 외환위기는 없다”는 말이 그의 힘 때문에 눈길을 끈다.
저자는 철저하게 시장 경제와 사유 재산 보호를 신봉한다. “세계화는 시장의 힘으로 이뤄져야 할 창조적 파괴”로 보면서 소득 불균형이 ‘시장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이긴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의 패착이 아니라 “교육정책의 실패”로 진단한다. 극심한 기업지배구조나 에너지 압박, 고령화사회 도래도 시장 경제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또 2030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06년의 4분의 3 수준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주요 경쟁국으로 영국과 중국을 뽑았다. 러시아나 인도는 갈 길이 요원한 반면 중국이 좀 더 민주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비치면서 “2030년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의 많은 부분은 중국의 행보에 달려 있다. 만일 중국이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향해 계속 밀고 나간다면 확실히 세계를 새로운 차원의 번영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경에 직면해도 인류가 견디면서 진전하는 건 우연이 아니다. 적응은 우리의 천성이다”고 말할 정도로 낙관적이다. 그러나 이런 희망적인 견해를 담은 마지막 장의 제목은 ‘모호한 미래’이다.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던 ‘페드 스피크(Fed Speak·FRB 당국자 특유의 모호한 어법)’의 진실은 어디쯤일까. 원제는 ‘The Age of Turbulence by Alan Greenspan(2007).’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북카페 >
-

머니 컨설팅
구독
-

이헌재의 인생홈런
구독
-

인터뷰
구독
트렌드뉴스
-
1
“유심칩 녹여 금 191g 얻었다”…온라인 달군 ‘현대판 연금술’
-
2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3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4
‘마약밀수 총책’ 잡고보니 前 프로야구 선수
-
5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6
V리그 역사에 이번 시즌 박정아보다 나쁜 공격수는 없었다 [발리볼 비키니]
-
7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8
“얘기 하자하니 ‘감히 의원에게’ 반말” vs “먼저 ‘야 인마’ 도발”
-
9
“돈 좀 썼어” 성과급 1억 SK하이닉스 직원 ‘반전 자랑 글’
-
10
식후 커피는 국룰? 전문가들은 ‘손사래’…“문제는 타이밍”[건강팩트체크]
-
1
李 “다주택자 눈물? 마귀에 양심 뺏겼나…청년은 피눈물”
-
2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3
“얘기 하자하니 ‘감히 의원에게’ 반말” vs “먼저 ‘야 인마’ 도발”
-
4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5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李대통령 SNS 글 삭제
-
6
장동혁, 친한계 반발에 “수사결과 韓징계 잘못땐 책임지겠다”
-
7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8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9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10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트렌드뉴스
-
1
“유심칩 녹여 금 191g 얻었다”…온라인 달군 ‘현대판 연금술’
-
2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3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4
‘마약밀수 총책’ 잡고보니 前 프로야구 선수
-
5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6
V리그 역사에 이번 시즌 박정아보다 나쁜 공격수는 없었다 [발리볼 비키니]
-
7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8
“얘기 하자하니 ‘감히 의원에게’ 반말” vs “먼저 ‘야 인마’ 도발”
-
9
“돈 좀 썼어” 성과급 1억 SK하이닉스 직원 ‘반전 자랑 글’
-
10
식후 커피는 국룰? 전문가들은 ‘손사래’…“문제는 타이밍”[건강팩트체크]
-
1
李 “다주택자 눈물? 마귀에 양심 뺏겼나…청년은 피눈물”
-
2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3
“얘기 하자하니 ‘감히 의원에게’ 반말” vs “먼저 ‘야 인마’ 도발”
-
4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5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李대통령 SNS 글 삭제
-
6
장동혁, 친한계 반발에 “수사결과 韓징계 잘못땐 책임지겠다”
-
7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8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9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10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북카페]'식물은 살아남기' 펴낸 이성규 박사](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3/09/26/690404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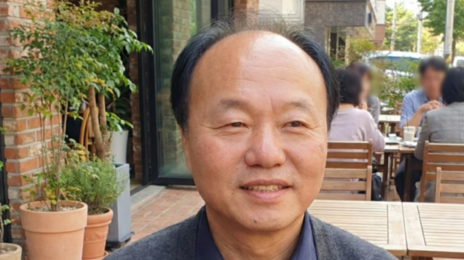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