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문학예술]늘 떠났지만, 마주치는 건 ‘나’였다
-
입력 2007년 7월 7일 03시 06분
글자크기 설정

윤후명(61·사진) 씨는 늘 떠남으로써 글을 얻었다. 러시아에서 ‘하얀 배’를, 중국에서 ‘둔황의 사랑’을 얻었다. 6년 만의 새 소설집 ‘새의 말을 듣다’ 속 작품들도 그런 여정에서 건져 올린 것이다. 이를 두고 평론가 오생근 씨는 “그들(소설 속 주인공들)의 떠남은 내면으로의 여행을 위해서이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만남의 시간을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표제작 ‘새의 말을 듣다’의 주인공인 소설가 ‘나’는 생애 두 번째로 독도로 가는 뱃길에 오른다. ‘나’는 바다의 동물과 섬의 식물을 두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다. 그런데 여행 중 바이칼 호수를 다녀왔다는 사내를 만난다. 알타이어를 공부한다는 사내는 새의 말이 알타이어로 들린다고 말한다. ‘나’는 그제야 자신의 귀에 새의 울음소리가 한국어로 들린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것은 작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는 계기다.
책에 묶인 10편의 단편은 모두 ‘나’가 주인공이다. 윤 씨 자신이 “누구나 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을 나는 소설에서 찾고 또 묻는다”고 고백했듯, 그는 소설에서 ‘나’를 떠나보냄으로써 숨 가쁜 현대에서 잦아든 깊은 내면을 찾아내려고 한다. 단편 ‘고원으로 가다’에서 영월로 가던 ‘나’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고원으로 가서 숨어 살고 싶어 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나는 왜 늘 어디론가 떠난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살아온 것인지 까닭 모를 일이었다. 사람을 만나려 하건만, 진정한 만남이란 어디에 있는지 알 길 없음에 쓸쓸해서 늘 떠남을 가슴에 새기는 것일까.’
떠남으로써 마주하는 것은 과거의 ‘나’다. ‘새의 말을 듣다’에서도, ‘소행성’의 ‘분노의 강’에서도 화자는 여행길에서 낯선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묻어 두었던 과거의 기억과 조우한다.
청계천(‘서울, 촛불 랩소디’)이나 종로의 연등 행렬(‘의자에 관한 사랑 철학’) 같은, 시내를 떠도는 작품도 있다. 어쩌면 자주 봐서 익숙해진 곳이겠지만, 작가는 멀지 않은 장소로 ‘떠나는’ 행위로도 자아를 발견하는 여행을 할 수 있음을 일러 준다.
‘우리는 길 한복판으로 나아가 멀리 사라져가는 등불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나는 삶의 원형을 마련해 두고 그에 맞추려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토막토막의 삶을 맞추어 내 삶을 완성하려고 하는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스타일 >
-

초대석
구독
-

글로벌 포커스
구독
-

알쓸톡
구독
트렌드뉴스
-
1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2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3
압수한 비트코인 분실한 檢… 수백억대 추정
-
4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5
“지방대생인데 차비 2만원만”…분식집 선의 악용한 청년들
-
6
[단독]“5000만원씩 두 상자로… 윤영호, 권성동에 1억 하나엔 ‘王’자 노리개”
-
7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쳤다…韓 1041조원 vs 日 1021조원
-
8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9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 전혀 고려 안해”
-
10
‘할머니 김장 조끼’에 꽂힌 발렌티노…630만원 명품 출시 [트렌디깅]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4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5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6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7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8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9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
10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쳤다…韓 1041조원 vs 日 1021조원
트렌드뉴스
-
1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2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3
압수한 비트코인 분실한 檢… 수백억대 추정
-
4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5
“지방대생인데 차비 2만원만”…분식집 선의 악용한 청년들
-
6
[단독]“5000만원씩 두 상자로… 윤영호, 권성동에 1억 하나엔 ‘王’자 노리개”
-
7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쳤다…韓 1041조원 vs 日 1021조원
-
8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9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 전혀 고려 안해”
-
10
‘할머니 김장 조끼’에 꽂힌 발렌티노…630만원 명품 출시 [트렌디깅]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4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5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6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7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8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9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
10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쳤다…韓 1041조원 vs 日 1021조원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스타일]'비대칭형' 헤어컷…중성미가 찰랑 찰랑](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2/01/17/684566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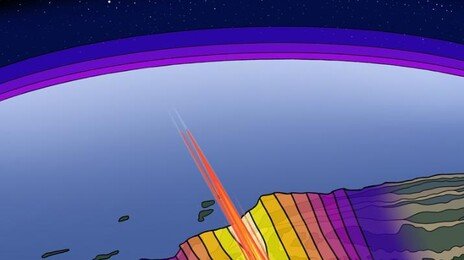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