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문화칼럼/임진모]‘모래알’ 대중음악계 뭉쳐야 산다
-
입력 2007년 1월 20일 03시 01분
글자크기 설정

그러면서 “말하기 싫다”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다. 그것은 자조(自嘲)이지 지혜로운 대안일 수는 없다. “CD로 만드는 앨범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일부 가수의 선언은 분노의 표현 또는 관심을 끄는 단기 처방일 뿐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용자 측면에서 “CD 말고 음악을 듣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강요한다고 될 일인가”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많은 제작자와 가수가 통화 연결음과 벨소리 수익의 대부분을 이동통신사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배분 구조에서 가요계 몰락의 원인을 찾는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동통신사는 음악계에 30%가량의 수익이 돌아간다고 하지만 음악계는 데이터 크기당 요금 등을 따지면 실제 수익은 3%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과거 CD가 팔렸을 때는 수익 중 상당액이 음악계로 돌아왔지만 3%라는 미미한 지분으로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음원 제작이 활기를 띨 수 없다. 디지털 음원 시대가 이미 시작됐고, 그것이 대세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음악계가 소비자에게 자꾸 CD를 구입해 달라고 사정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음악계에 당장 필요한 점은 제작자든 가수든 대중음악 종사자 다수가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상황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지와 접근법이 다르다고, 또는 집단 사이의 오랜 반목 때문에 대책을 의논하는 자리조차 갖지 않는 모습은 자포자기나 다름없다. 가요계가 합리적 대책을 못 끌어내는 이유는 모이지 않는 탓이다. 뭉쳐야 한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일치단결하는 영화계와 큰 차이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음악 작업의 성격상 혼자 혹은 소수가 영위하는 ‘독립군적’ 요소가 강하다. 이동통신사는 어쩌면 이런 가요계의 본질적 관행을 역이용하는지도 모른다.
먼저 기업(이동통신사)과 정부(정보통신부)가 음악의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수익 배분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활로를 마련하지 않으면 음악계가 고사(枯死)한다는 점, 그것은 곧 국가적 재앙임을 절실하게 수긍해야 한다. 솔직히 국내 정보기술(IT) 분야는 음악을 희생시키면서 비약적 성장을 이룩한 게 사실 아닌가.
음악계가 잘했다는 뜻은 아니다. 디지털 음악 시장이 도래했음에도 가요계는 재빨리 대응하지 못했다. 내부적 합의는커녕 서로 만나지도 않았다. 소수의 제작자가 이동통신사와 만나 타협점을 끌어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뒷말만 무성하게 된다. 어떤 점에서는 제작자의 마인드 변화가 더욱 중요하다.
싸움은 싸움대로 해야겠지만 디지털 시장에 걸맞은 제작 방식의 융통성을 갖추는 일도 중요하다. 과거의 문법에만 매달리면 수절이 아니라 시대착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디지털 시대는 분명 활동 영역의 확대를 의미한다.
통화 연결음에 맞는 음악, CD 앨범으로 만들 음악을 지혜롭게 분간하면서 양질의 음악을 만들어 내야 한다. 좋은 음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제도와 환경 탓만 하면 누구도 귀담아듣지 않는다. 이것이 음악 시장 부활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본다. 미디어와 소비자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이것까지 거론하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진다. 음악계가 자세를 바꿔 일단 뭉쳐야 한다. 그렇게 뭉친 음악계를 보는 기업과 정부의 눈이 바뀌기를 바란다.
임진모 대중음악 평론가
김유준의 재팬무비 >
-

횡설수설
구독
-

어린이 책
구독
-

게임 인더스트리
구독
트렌드뉴스
-
1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2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
3
野 “25평서 5명 어떻게 살았나”…이혜훈 “잠만 잤다”
-
4
단식 끝낸 장동혁 첫 숙제 ‘한동훈 제명’… 친한계 “부당 징계 철회해야” 거센 반발
-
5
‘꿈’ 같던 연골 재생, 현실로? 스탠포드대, 관절염 치료 새 돌파구
-
6
집값 잡으려 ‘갭투자 1주택’도 규제할듯… “매물 되레 줄것” 전망도
-
7
이해찬, 베트남서 심정지-수술…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급파
-
8
[횡설수설/이진영]82세에 6번째 징역형 선고받은 장영자
-
9
브런슨 “우리 스스로 한반도 묶어두면 안돼”
-
10
[광화문에서/김준일]단식 마친 장동혁… 중요한 건 단식 그 다음
-
1
이혜훈 “장남 결혼직후 관계 깨져 함께 살아…이후 다시 좋아져”
-
2
이해찬 前총리 위독… 베트남 출장중 한때 심정지
-
3
이해찬, 베트남서 심정지-수술…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급파
-
4
“아파트 포기할 용의 있나 없나”에…이혜훈 “네” “네” “네”
-
5
與최고위원 3명 “민주당, 정청래 사당 아냐…합당 제안 사과하라”
-
6
[단독]美투자사 황당 주장 “李정부, 中경쟁사 위해 美기업 쿠팡 공격”
-
7
野 “25평서 5명 어떻게 살았나”…이혜훈 “잠만 잤다”
-
8
李 “코스피 올라 국민연금 250조원 늘어…고갈 걱정 안해도 돼”
-
9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10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트렌드뉴스
-
1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2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
3
野 “25평서 5명 어떻게 살았나”…이혜훈 “잠만 잤다”
-
4
단식 끝낸 장동혁 첫 숙제 ‘한동훈 제명’… 친한계 “부당 징계 철회해야” 거센 반발
-
5
‘꿈’ 같던 연골 재생, 현실로? 스탠포드대, 관절염 치료 새 돌파구
-
6
집값 잡으려 ‘갭투자 1주택’도 규제할듯… “매물 되레 줄것” 전망도
-
7
이해찬, 베트남서 심정지-수술…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급파
-
8
[횡설수설/이진영]82세에 6번째 징역형 선고받은 장영자
-
9
브런슨 “우리 스스로 한반도 묶어두면 안돼”
-
10
[광화문에서/김준일]단식 마친 장동혁… 중요한 건 단식 그 다음
-
1
이혜훈 “장남 결혼직후 관계 깨져 함께 살아…이후 다시 좋아져”
-
2
이해찬 前총리 위독… 베트남 출장중 한때 심정지
-
3
이해찬, 베트남서 심정지-수술…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급파
-
4
“아파트 포기할 용의 있나 없나”에…이혜훈 “네” “네” “네”
-
5
與최고위원 3명 “민주당, 정청래 사당 아냐…합당 제안 사과하라”
-
6
[단독]美투자사 황당 주장 “李정부, 中경쟁사 위해 美기업 쿠팡 공격”
-
7
野 “25평서 5명 어떻게 살았나”…이혜훈 “잠만 잤다”
-
8
李 “코스피 올라 국민연금 250조원 늘어…고갈 걱정 안해도 돼”
-
9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10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김유준의 재팬무비]멋진 캐릭터만 만들면 만사형통](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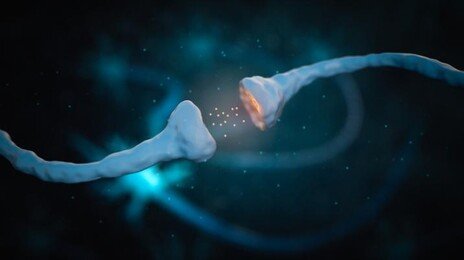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