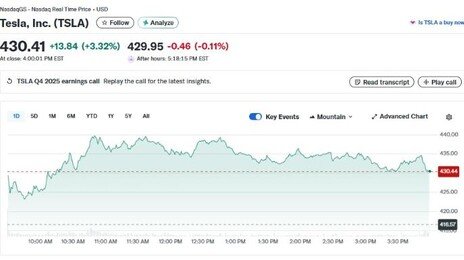공유하기
[스타일]집에서 만드는 맥주…5만원으로 한달 60병
-
입력 2002년 8월 1일 16시 19분
글자크기 설정

신대영씨가 직접 빚은 맥주에 딸 등 가족사진이 든 라벨을 붙인 ‘대돌이표 맥주’를 들어 보이고 있다. 라벨 아래 쪽에는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을 패러디한 ‘나는 맥주를 빚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문구가 써 있다.
전영한기자 scoopjyh@donga.com
“여보, 병따개 어디 있어?” “자기가 아까 썼잖아. 어머님, 빨리 오세요.”
찌는 듯한 무더위가 다소 가신 저녁. 경기 김포시 신대영씨(30)의 아파트가 시끌시끌해진다. 맥주 파티가 열리는 시간이다.
간단한 안주와 함께 맥주병들이 가지런하게 식탁에 오른다. 병에 붙은 낯선 상표가 눈길을 끈다. ‘DAEDOL’s BEER’. 우리말로 ‘대돌이표 맥주’인 셈. 상표 아래에는 돌을 갓 넘긴 딸 효림이의 사진이 프린트돼 있다.
이 맥주는 신씨가 직접 만든 것. ‘대돌’은 신씨의 머리가 크다고 해서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자신이 만든 맥주에 브랜드를 정하고 딸 사진이 찍힌 라벨을 붙일 정도로 맥주 만들기에 푹 빠진 신씨는 국내 ‘홈브루어(home brewer)’ 가운데 선두 주자로 꼽힌다.
오늘 식탁에 오른 맥주는 2주 전에 담근 것. 흑맥주처럼 짙은 에일 계열의 맥주다. 술이 가장 센 아버지 신현모씨(57)가 한 잔을 들이켜고 나서 품평한다. “지난번 맥주보다 신맛이 좀 더 나네.” 둘째를 임신한 아내 한경희씨(27)는 맛을 볼 수 없어 아쉽다는 표정이다. 맥주 한 잔을 놓고 가족의 대화는 도란도란 이어졌다.
매주 2, 3번 열리는 신씨 가족의 맥주 파티는 지난해 초 시작됐다. 영국에 어학연수를 갔던 신씨가 민박집 주인 아저씨의 맥주 만드는 모습을 본 게 계기가 됐다. 그는 “영국에서는 맥주를 만드는 게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막걸리를 담그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영국에서는 맥주 원료를 파는 가게가 한 마을에 한 군데 정도는 있다고 신씨는 덧붙였다.
신씨는 영국에서 돌아와 홈브루를 시작했지만 한국에서 맥주를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맥아나 홉, 효모 같은 기본 원료를 구할 수 없어 외국에 우편 주문해야 했다. 발효조, 냉각호스 등 제조 기구는 비슷한 대용품을 찾아 직접 만들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맥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도 물어볼 데가 없었다는 것. 신씨는 원서와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가며 스스로 제조법을 익혀 나갔다. 그렇게 독학으로 기술을 익힌 덕택에 지금은 맥주 만들기 동호회원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홈브루 전도사’와도 같은 존재가 됐다.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초보자들의 궁금증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릴 수 있고 상세한 해결책까지 가르쳐줄 수 있기 때문이다.
홈브루의 매력은 무엇일까. 신씨는 “새로운 맛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과정이 참 좋다”고 말한다. 그는 요즘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료인 보리맥주와 씀바귀, 쑥 등을 이용한 우리식 맥주를 연구하고 있다.
이 같은 고민과 연구, 시행착오를 거쳐 원했던 맛이 만들어지고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좋을 때 얻는 만족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는 “쉬운 방법부터 시작해 조금씩 발전해 나가다 보면 누구나 자신만의 맥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올초 효림이의 돌잔치 때는 120병을 만들어 내놓았다. 맛있다며 남은 맥주를 갖고 가는 손님도 있었다. 그날 맥주에는 ‘효림이 첫돌 스타우트(Hyorim’sfirst celebration Stout)’라는 이름을 붙였다. 아내에게 잘 보여야 할 때는 ‘공주님의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My princess’ sweet whispers of love)’ 식으로 붙인다.
신씨가 만드는 맥주는 한 달에 60병가량.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경우 5만원만 들이면 한 달 동안 실컷 맥주를 마실 수 있다. 그는 “맥주 박스가 새로 담근 맥주로 가득차 있는 걸 보면 왠지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말했다.
종류는 그때그때 다르다. 효모의 종류에 따라 ‘에일(Ale)’과 ‘라거(Lager)’로 크게 나눠지고 첨가물에 따라 다시 ‘드래프트(Draft)’ ‘복(Bock)’ ‘스타우트(Stout)’ 등으로 세분된다. 신씨는 6도 정도이고 홉향이 짙은 ‘스트롱 에일’을 가장 좋아한다.
‘맥주가 좋은 5가지 이유’를 꼽아보게 했다. 신씨는 △가족과 함께 가볍게 즐길 수 있다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잠자기 전 한 잔은 숙면을 도와준다 △다른 술보다 칼로리가 낮다 △비타민B 등 영양소가 있어 건강에 좋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맥주 덕택에 가족간 대화가 많아진 게 가장 좋은 점이다. 이 때문에 신씨에게 있어 맥주 만들기는 취미 생활을 넘어 ‘존재의 이유’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대돌이표 맥주’ 병에 ‘나는 맥주를 빚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I brew, therefore I am)’는 문구를 써붙일 정도로.
금동근기자 gold@donga.com
독도는 우리 땅 : 정부의 독도 지키기 : 독도 경비대 파견 >
-

DBR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동아닷컴 신간
구독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어깨 아프면 약-주사 찾기보다 스트레칭부터”[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3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4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5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6
日 소니마저 삼킨 中 TCL, 이젠 韓 프리미엄 시장 ‘정조준’
-
7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8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9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10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1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2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3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4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7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8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9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10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어깨 아프면 약-주사 찾기보다 스트레칭부터”[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3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4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5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6
日 소니마저 삼킨 中 TCL, 이젠 韓 프리미엄 시장 ‘정조준’
-
7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8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9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10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1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2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3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4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7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8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9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10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