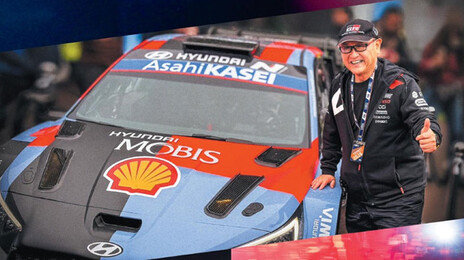공유하기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첫째날 이모저모
-
입력 2002년 4월 28일 18시 25분
글자크기 설정

○…“경필, 형필, 철규, 홍규 네 사람이 같이 보아라. 소식도 못 듣고 만나지 못한 채 5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구나.”
여송죽씨(78·서울 동작구 사당동)는 북의 시동생 경필씨가 남편(허창극·80)의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경필씨가 편지를 다 읽자 여씨는 “내가 올 자리가 아닌데…”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남편 대신 자신이 온 사정을 설명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 때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기회가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해서 따로 했는데, 추첨 결과 남편은 떨어지고 여씨만 붙은 것이었다. 여씨가 “남편은 ‘나 대신 동생 얼굴 많이 보고 와서 자세히 전달해 달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말하자 경필씨는 눈자위를 붉혔다.
○…“미안하오. 모두 내 잘못이오. 하지만 지난 세월은 모두 묻어둡시다….”
6·25전쟁 때 피란 내려와 가족과 생이별을 한 길영진씨(81)는 아내 이영희씨(75)와 아들 창근씨를 만났지만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남편과 헤어져 아들만을 바라보며 수절해온 아내의 손에는 쭈글쭈글한 주름이 가득했다. 아내는 “창근이에게 색시도 있고 애도 있어요”라며 오히려 남편을 위로했다.
길씨는 6·25전쟁 당시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평양 집을 떠나 고향인 평북 선천으로 향한 직후 미처 아내를 만나지 못한 채 부친과 함께 화물차를 타고 피란길에 올랐다. 길씨는 이후 남한에서 재혼했지만, 남쪽 부인은 6년 전 세상을 떠났다.
○…67년 납북된 남편과의 상봉을 신청했지만 남편은 못 만나고 덕실(67) 순실씨(58) 등 여동생들만 만난 김애란씨(79)는 동생들이 북한체제 옹호 발언을 하자 “왜 자꾸 조작된 말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북측 가족들은 과거 상봉 때와 마찬가지로 TV 카메라와 기자들을 상당히 의식하는 눈치였다. 북측 상봉자 대부분은 기자들이 다가갈 때마다 “장군님(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지칭) 덕에 이렇게 만났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한 북측 상봉자는 “우리 장군님께 감사의 말을 하자”고 남측 가족에게 권유하기도 했다.
○…형수 변유실씨(69)와 조카 3명을 만난 류재춘씨(64·전남 장성군 삼서면)는 잘 포장한 쌀 두 되를 건넸다. 류씨는 “14세 위인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형님 제사에 쓰라고 직접 농사지은 쌀을 준비했다”며 “비록 지하에 계시지만 아우의 정성이 깃든 쌀로 제삿밥을 받으시면 틀림없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안용관씨(81)는 50여년 동안 수절하며 자신을 기다려온 북한의 아내 윤음전씨(74)와 딸 순복씨(51)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눈시울을 적셨다. 특히 운신을 못하는 아들 시복씨(51)는 이날 상봉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안씨는 6·25전쟁 막바지인 1953년 시복씨와 순복씨를 부모님께 맡긴 채 서해 앞바다의 수니도로 아내 윤씨와 함께 피란했다가 인민군이 섬에 들이닥치자 혼자 월남해 반세기 동안 생이별을 겪었다.
안씨는 망설이다가 재혼한 남쪽 아내가 준비한 은색 한복을 윤씨에게 건네며 “새 가족이 준비했다”고 말했다.
금강산공동취재단
트렌드뉴스
-
1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2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3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4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5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6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7
V리그 역사에 이번 시즌 박정아보다 나쁜 공격수는 없었다 [발리볼 비키니]
-
8
장동혁, 친한계 반발에 “수사결과 韓징계 잘못땐 책임지겠다”
-
9
‘아파트’로 무대 연 그래미 시상식, ‘골든’으로 혼문 닫았다
-
10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7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8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9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10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트렌드뉴스
-
1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2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3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4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5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6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7
V리그 역사에 이번 시즌 박정아보다 나쁜 공격수는 없었다 [발리볼 비키니]
-
8
장동혁, 친한계 반발에 “수사결과 韓징계 잘못땐 책임지겠다”
-
9
‘아파트’로 무대 연 그래미 시상식, ‘골든’으로 혼문 닫았다
-
10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7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8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9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10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