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24와 함께하는 독자서평]
◇어떻게 죽을 것인가/아툴 가완디 지음·김희정 옮김/400쪽·1만6500원·부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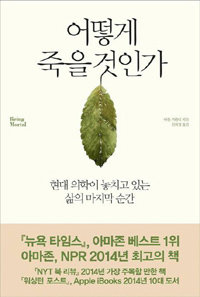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겪거나, 본인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상황이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까?
의사인 저자는 현대에서의 죽음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에는 죽음이 갑자기 찾아왔고 대부분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의료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사람은 더 오래 살고 노화와 죽음은 서서히 다가오게 됐다. 많은 사람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짐에 따라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다시 집에서 죽음을 맞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20세기 중반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대개 의사가 집으로 방문해 진료했고, 병원에서는 주로 환자를 먹이고 재우면서 맡아 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항생제로 감염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됐고 심장 수술부터 인공호흡기, 신장 이식까지 혁신적인 의학기술이 터져 나왔다. 현대식 병원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된 것이다.
인간에게는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가 있는 듯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경험하는 자아는 매 순간을 동일한 비중으로 견뎌내고, 기억하는 자아는 정점과 종점의 평균치를 기억한다.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웠더라도 마지막이 행복하다면 견딜 만했다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더라도 생의 마지막을 고통과 생존을 위한 몸부림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삶을 좋았다고 기억할 수 있을까.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더라도, 끝까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는다면 행복하지 않을까.
나이가 들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그대로 살 수 있다면 행복한 일일 것이다. 결국 죽음을 생각하는 건 삶을 생각하는 것과 동의어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빅5 병원, 주1회 휴진 동참… ‘SKY휴진’ 30일이 분수령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 얼굴이 60대?”…아르헨티나 미인대회 1위 나이 화제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인천공항서 얼굴에 스프레이 ‘칙’…1억 돈가방 들고 도주한 중국인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