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 입어야 할 이유가 또 있다. 개도 옷 잘 입은 사람은 공격하지 않는다.” (에머슨)
솔직히 이해가 안 됐다. 스타일을 바꿔 마음을 치료한다니. 패션 리더는 못 돼도 낙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손볼 곳이야 많겠지만 그게 마음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디자이너 케이 킴을 만나러 가면서도 의심이 끊이지 않았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약점을 없애고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랍니다.
장점을 살리면 약점이 자연스레 감춰지죠.
그럼으로써 ‘자신감’과 옷 입는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치료 이상의 효과가 있죠.”
은근히 솔깃해진다. 하지만 동네 약장수도 말로야 뭔들 못 고치나. 한번 따라서 해보되 냉정해야지.
입고 갈 때의 복장은 타이를 맨 정장 차림. 30, 40대 직장인 남성의 평상복 그대로 케이 킴의 ‘스타일 세러피’를 체험해 봤다.》
옷으로 마음 치료… 정양환 기자의 ‘스타일 세러피’ 체험
○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야
옷에 대해 지적하면 방어하려 했더니 그냥 넘어간다. “훌륭하다” “깔끔하다”고 칭찬하더니 커다란 하얀 광목을 씌운다. 머리라도 깎을 셈인가. 거울 앞에서 덩그러니 굳어버린 얼굴이 어색하다. 패션은 사라지고 ‘기본 육체’만 남았다.
“옷을 입는 데 가장 중요한 건 트렌드도 법칙도 아닙니다. 기본은 ‘색깔’이에요. 유행이 한참 지난 바지를 즐겨 입거나 새로 산 재킷을 한 번 입고 내버려두기도 하죠? 자신에게 맞는 색이냐 아니냐의 문제랍니다.”
단순히 파란색이 어울리느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다. 파랑도 수십 가지 색이 있다. 색상표를 갖다 놓고 이리저리 대본다. 얼굴이 붉고 눈동자가 갈색인 기자는 전체적으로는 브라운 계통이 어울리고, 진한 색보다는 흐릿한 느낌의 색이 적합하다고 한다. 밝은 하늘색보다는 코발트블루가 잘 맞았다. 그러고 보니 하늘색 와이셔츠는 비싸게 샀는 데도 장롱에 모셔 뒀다.
“색상표는 미술상에서 구하면 됩니다. 흰색 옷을 입고 친구와 맞춰보세요. 자신의 느낌과 상대방 평가를 합하면 의외로 자기 색을 찾기 쉽답니다. 다만 자연광 아래가 좋겠죠.”
자신의 색을 찾았다고 그 색만 고집해선 안 된다. 옷을 입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케이 킴은 기자에게 공적인 자리에선 진한 회색 슈트를 입으라고 권했다. 과히 어울리진 않지만 날카로운 인상을 ‘톤 다운(tone down)’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기본을 지키는 우아한 당당함
색상을 찾은 뒤엔 클래식 슈트를 입어보기로 했다. 검정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최근 블랙이 인기이기도 하거니와 슈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이 포맷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잡으면 다른 양복도 소화하기 쉽다.
정장의 유행은 따라가기 힘들다고 토로했더니 “중요한 건 원칙”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실 양복은 정장(正裝)이잖아요. 정식으로 입는 옷이니 정통 스타일이 있습니다. 괜히 유행을 좇기 힘들 땐 기본을 지키세요. 처음엔 어색할지 몰라도 ‘우아한 당당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한국 남성이 놓치는 부분이다. 한복도 정식으로 입어야 제일 멋스럽다. 케이 킴의 눈엔 기자 역시 지나치게 스타일을 추종하거나 무신경해 핵심을 놓친 사례였다.
먼저 소매. 셔츠가 재킷 아래로 1cm는 보여야 한다. 재킷 소매는 손목뼈 정도로. 뒷목 역시 셔츠가 보이게 해야 한다. 재킷의 목선 부분이 우는 것도 조심할 점.
요즘 바지는 길고 넓게 입는 게 유행이지만 밑단이 여러 번 접히는 건 점잖치 못하다. 다리가 길어 보이려면 신발 색깔을 바지와 맞추는 게 좋다. 벨트도 기왕이면 구두 색과 통일하자. 버클은 심플한 것이 무난하다. 타이가 버클을 가릴 듯 말 듯하면 품위 있어 보인다.
셔츠 안에 러닝셔츠를 입는 것도 피해야 한다. “그러면 속이 비친다”고 볼멘소리를 했더니 개념이 잘못됐단다. ‘셔츠가 속옷이고 재킷이 겉옷’인 게 정장의 원칙이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벗거나 풀어헤치지 않아야 예의다.
처음엔 깔끔하다고 칭찬하더니 지적이 산을 넘는다. 그런데도 싫지가 않다. 뿌듯하기까지 하다. 허리가 꼿꼿해지고 어깨가 펴진다. 옷에 나를 맞춘 게 아니라 나를 옷으로 표현한 느낌이다.
“중요한 건 즐기는 겁니다. 타인이 아닌 자기 눈으로 자신을 보세요. 누구나 약점은 있어요. 패션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배움 속에서 기쁨을 얻는 거죠.” 은근한 속삭임이 귓가를 스친다. 마치 편안한 노래처럼. 옷을 통한 마음의 치료는 스스로 하는 거였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 정장 베스트 드레서는 작은 센스가 결정▼
주머니에 물건(×)… 타이 맬때 윗단추 채우기-눈썹 다듬기(○)
정장을 입었을 때 스타일이 사느냐 마느냐는 아주 작은 차이로 결정될 수 있다. 조금만 신경 써도 베스트 드레서가 될 수 있는 반면 가벼운 무신경이 후줄근한 인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장에 주머니가 많다고 물건을 잔뜩 넣어 다니는 것도 그 중 하나. 기껏 잡힌 라인이 망가져 볼품없게 된다. 웬만한 잡동사니를 넣고 다닐 비즈니스 백을 준비하는 게 센스. 꼭 지갑을 소지할 경우라면 얇은 지갑을 선택하자.
타이를 맬 때는 윗단추를 채우는 것도 잊지 말자. 정장의 생명은 단정함이다. 단추를 풀어 세련된 모습을 연출할 자신이 없다면 답답해도 채우는 것이 보기 좋다.
정장을 입으면 특히 눈에 띄는 건 얼굴. 여성만큼은 아니라도 얼굴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눈썹 정리를 하지 않는다. 지저분한 눈썹선만 다듬어 줘도 훨씬 생기 있어 보인다.
정장을 입을 때 하체가 길어 보이고 싶다면 바지라인에 주의하자. 라인이 비뚤어져 있으면 다리가 짧아 보일 뿐 아니라 너저분하다. 하체 길이에 자신이 없다면 최근 많이 이용하는 키높이 패드를 써보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면 뭔가를 이용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조언: 동덕여대 의상디자인학과 정재우 교수 & 디자이너 케이 킴)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성매매 특별법 시행 논란 : 각계표정-여성·시민단체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한전, 1분기 영업익 1.3조… 3개 분기째 흑자 이어가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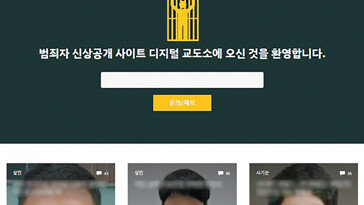
‘피의자 신상 공개’ 사이트, 사적 제재 논란 재점화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무기 수출 요란하게 홍보하다 유럽 견제 자초한 K-방산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