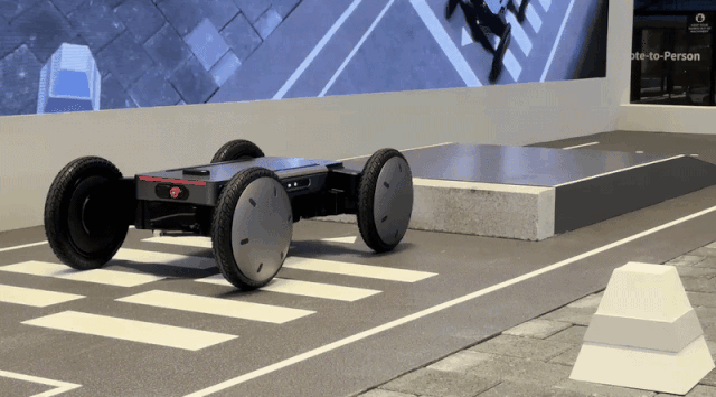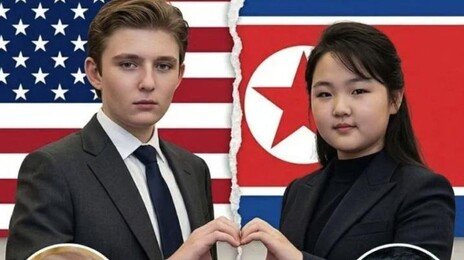공유하기
[오늘과 내일/홍찬식]‘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방법
-
입력 2008년 4월 9일 02시 58분
글자크기 설정

어디서 구해왔는지 옛 생활용품들을 잘 수집해 달동네 풍경을 재현했다. 식구들이 오순도순 저녁식사를 하는 모습, 구멍가게와 이발소 등 불과 20, 30년 전 우리 모습인데도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달동네 사람들의 의연한 추억담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독일에 산다는 어느 교포는 ‘어린 시절 뛰어놀던 이곳을 40년 만에 찾고 보니 그 시절을 회상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회고의 글 가운데 ‘달동네 사람들은 남보다 아침 일찍 집을 나가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일터까지 가는 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몸에 익힌 부지런함은 살아가는 데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살았던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는 내용이 마음을 숙연하게 한다.
참으로 어렵게 살았던 건 달동네 사람뿐 아닐 것이다. 우리 근현대사 전체가 ‘힘들었던 시절’로 점철되어 있다. 조선조 말 혼란 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뒤 식민지 압제를 거쳐 가까스로 광복을 맞았으나 6·25전쟁으로 전국이 잿더미처럼 됐다. 전쟁 직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지난 100여 년 이 땅에 살았던 서민들은 이런 역사의 잔인한 소용돌이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다.
‘교과서포럼’이라는 지식인단체가 한국 근현대사 대안교과서를 출간하자 다시 한번 그 시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근현대사는 개인에 따라서는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일 수 있다. 가난한 달동네에 살았던 일을 입 밖에 꺼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대안교과서가 기존 교과서와 차이를 보이는 점은 좌(左)편향 역사서술에서 탈피하려 한 것 외에 ‘힘들었던 시절’을 냉정히 바라보려는 자세다. 우리 근현대사가 외세 침략에 큰 피해를 당했음을 강조하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라며 돌을 던지면 속은 편하다. 남이 보기에 ‘멋진 진보’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의 진실일 수는 있어도 전체의 진실은 아니다.
우리 근현대사에는 역사의 고비가 몇 번 있었다. 남한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했던 것과 1960, 70년대 수출 주도정책으로 산업화를 이뤘던 것 그리고 80, 90년대 민주화를 크게 진전시킨 것이다. 어느 한 축만 삐끗했어도 오늘 우리의 삶은 존재하기 어려웠다. 기존 교과서는 이 ‘불편한 진실’에 눈을 감고 있으나 대안교과서는 시대의 공과(功過)를 같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조선조 말 외세 침략을 왜 우리 힘으로 막지 못했는지, 외세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내부 성찰도 해야 한다.
선진국 가려면 역사에 열려 있어야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대충 잊고 사는 것과 고통스러워도 그때를 직시하는 방법이다. 시각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나무라서는 안 된다. 대안교과서에 대해 역사학계가 “역사학 전공자가 쓰지 않았다”며 평가절하할 일이 아니다. 다양한 전공의 학자들이 가시(可視)거리 안에 있는 근현대사의 복원에 나서는 일은 역사학계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달동네 박물관에서 ‘그땐 그랬었지’라며 그리운 감상에 빠지는 것은 그때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다. 근현대사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감정을 지니려면 아직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을 꿈꾼다면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역사를 바로 볼 수 있어야 선진국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
씨네@메일 >
-

오늘의 운세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

만화 그리는 의사들
구독
트렌드뉴스
-
1
이라크 쿠르드 반군, 이란 지상전 개시… “美서 지원 요청”
-
2
美국방차관 “한국이 北 상대 재래식 대응 책임지기로 합의”
-
3
트럼프, 기지 사용 거부 스페인에 “모든 교역 중단”
-
4
트럼프 안 겁내는 스페인…공습 협조 거부하고 무역 협박도 무시
-
5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6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7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8
“배런을 전쟁터로”…트럼프 아들 입대 촉구 SNS 확산
-
9
제주 우도 해안 폐목선서 北노동신문 추정 종이 발견
-
10
[단독]한미, 주한미군 무기 중동으로 차출 협의
-
1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
2
‘증시 패닉’ 어제보다 더했다…코스피 12%, 코스닥 14% 폭락
-
3
[단독]한미, 주한미군 무기 중동으로 차출 협의
-
4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5
주가 폭락에…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
6
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 사퇴도 타이밍 있다”
-
7
국힘 또 ‘징계 정치’… 한동훈과 대구行 8명 윤리위 제소
-
8
李 “필리핀 대통령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인도 요청”
-
9
與 “조희대 탄핵안 마련”… 정청래는 “사법 저항 우두머리냐”
-
10
李 “檢 수사·기소권으로 증거조작…강도·살인보다 나쁜 짓”
트렌드뉴스
-
1
이라크 쿠르드 반군, 이란 지상전 개시… “美서 지원 요청”
-
2
美국방차관 “한국이 北 상대 재래식 대응 책임지기로 합의”
-
3
트럼프, 기지 사용 거부 스페인에 “모든 교역 중단”
-
4
트럼프 안 겁내는 스페인…공습 협조 거부하고 무역 협박도 무시
-
5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6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7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8
“배런을 전쟁터로”…트럼프 아들 입대 촉구 SNS 확산
-
9
제주 우도 해안 폐목선서 北노동신문 추정 종이 발견
-
10
[단독]한미, 주한미군 무기 중동으로 차출 협의
-
1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
2
‘증시 패닉’ 어제보다 더했다…코스피 12%, 코스닥 14% 폭락
-
3
[단독]한미, 주한미군 무기 중동으로 차출 협의
-
4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5
주가 폭락에…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
6
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 사퇴도 타이밍 있다”
-
7
국힘 또 ‘징계 정치’… 한동훈과 대구行 8명 윤리위 제소
-
8
李 “필리핀 대통령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인도 요청”
-
9
與 “조희대 탄핵안 마련”… 정청래는 “사법 저항 우두머리냐”
-
10
李 “檢 수사·기소권으로 증거조작…강도·살인보다 나쁜 짓”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씨네@메일]'인터뷰'에 대한 찬사와 저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