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사설]大운하, 국민 설득과 大합의 과정 없었다
-
입력 2007년 12월 23일 23시 05분
글자크기 설정
핵심 문제는 사업 타당성이다. 운하가 발달한 유럽과 달리 한국은 계절별 강수량 차가 커 갈수기(渴水期)에는 배를 띄우기 힘들다. 자연히 물을 저장하는 많은 댐과 보가 필요하다. 국토의 70%가 산이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상하류 표고차(標高差)가 100m나 돼 서울∼부산에 19개 갑문을 만들어야 한다. 교량 개축도 필수적이다. 이런 물길에 축구장 길이의 배를 띄우려면 천문학적인 건설비가 소요된다. 건설비 16조 원(이 당선자 측 주장)을 모두 민자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운영 손실 발생 시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조건을 달아야만 민자 유치가 가능하다.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승리했으니 국민 합의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이전 대선 공약도 유권자들이 그 공약에 동의해 투표한 것은 아니었다. 이 당선자도 서울시장 때 수도 이전 반대운동에 시 예산을 지원하며 동참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고속도로 철도 연안해운 등 대체운송 수단이 다양해 대운하가 관광용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선진국이 되려면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성장동력이 되는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청계천 복원 성공신화에 사로잡히면 실패할 수 있다. 도시의 하천 복원과 국토를 종단하는 대역사는 다르다.
2012년까지 경부운하 건설 과정에서만 4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자칫 건설경기는 이명박 정부 때 즐기고 비용은 다음 정부가 치르는 구조가 될까 걱정이다.
이 당선자는 대선 전 “집권하면 세계적인 기술로 검증하고 국내외 환경전문가들로 하여금 재검토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대로 선입견을 버리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당선자의 실용주의 국가경영 철학과 부합한다.
화제의 비디오 >
-

횡설수설
구독
-

밑줄 긋기
구독
-

새로 나왔어요
구독
트렌드뉴스
-
1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2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노블레스 오블리주 표본”
-
3
당뇨병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 받는다
-
4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5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6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7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8
버스서 韓 여학생 성희롱하고 불법 촬영…인니 남성 논란
-
9
“D램 품귀에 공장 100% 돌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가 증설 나서”
-
10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4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6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7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8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9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10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트렌드뉴스
-
1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2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노블레스 오블리주 표본”
-
3
당뇨병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 받는다
-
4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5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6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7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8
버스서 韓 여학생 성희롱하고 불법 촬영…인니 남성 논란
-
9
“D램 품귀에 공장 100% 돌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가 증설 나서”
-
10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4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6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7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8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9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10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화제의 비디오]분출구 못찾은 젊음 그린 「크랙시티」](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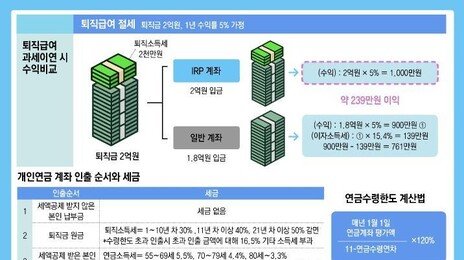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