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화문에서/홍권희]서비스산업이 ‘새 챔피언’이다
-
입력 2007년 9월 9일 20시 19분
글자크기 설정

초고속 경제성장의 주역인 우리 제조업도 과거처럼 응원가가 필요한 처지다. 국내 제조업은 위축된 지 오래고, 일본을 따라잡기는커녕 중국에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 현장에선 1980년대 말부터 노동운동과 부동산 투기 와중에 기업가정신이 흔들렸다.
조선, 휴대전화, 반도체, 자동차 등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품목을 포함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계속 지켜 낼 수 있다면 최선이다. 그러나 성장잠재력이 떨어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게 현실적인 고민이다. 그렇다면 1990년대 제조업에 쏟은 노력과 지원을 서비스산업에도 나눠 줬어야 옳지 않았을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산업이 커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안다. 우리도 이미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 의료, 여행 등 고급 서비스를 찾아 나서는 우리 자신을 본다. “세상 많이 변했다”고 말해 가면서 국경도 쉽게 넘는다. 올해 1∼7월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여행경비는 32억 달러,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에 쓴 돈은 92억 달러로 60억 달러 적자였다. 외국인의 국내 연수로 우리가 번 돈은 2500만 달러에 불과한데 우리 국민의 유학 및 연수비용은 그 100배가 넘는 29억 달러였다.
통신,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기타사업자서비스 등 생산자서비스도 여행수지(收支)에 맞먹는 적자를 내고 있다. 국내 수요는 많은데 자급(自給)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부문의 국내 서비스도 빠르게 성장하지만 세계는 더 앞서 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0년 이후 우리를 ‘서비스수지 만성 적자국’으로 분류했다.
국내 서비스산업은 줄곧 ‘찬밥 신세’였다. 인프라가 부족하고 규제가 너무 많으며 생산성은 낮다. 업체들은 영세한 데다 외국인 투자도 적고 개방도 덜 돼 있다. 실태 파악조차 미흡하다. 최근 정부가 두 차례 내놓은 경쟁력 강화 대책도 업계가 바라는 획기적인 규제 철폐가 아니라 정부가 일일이 도장을 찍어 가며 키워 주겠다는 식의 생색내기 수준이다.
서비스산업이 크면 제조업 성장에도 좋다. 지난 15년간 제조업 일자리는 67만 개 줄었는데 서비스업에서는 640만 개가 늘어났듯이 제조업에 비해 고용도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이 있다. 지식기반 서비스가 잘 육성되면 이 분야에서만 향후 15년간 30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방치해 온 것이 오히려 이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말해 준다는 역설(逆說)도 가능하다.
어제 중국 다롄(大連)에서 폐막된 하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은 신생 글로벌 성장기업을 ‘뉴 챔피언’이라 불렀다. 국내에서는 미래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을 ‘새 챔피언’이라고 이름 붙이고 응원가를 불러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다. 제조업 강국이며 서비스 적자국인 일본이 2005년 선정한 전략산업 7개 중 4개가 서비스 분야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차승재의 영화이야기]'영화 아카데미'의 빛과 그늘](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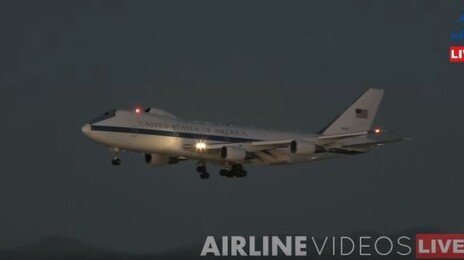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