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횡설수설/권순택]폴리페서(Poli-fessor)
-
입력 2007년 1월 22일 19시 37분
글자크기 설정

▷정치(Politics)와 교수(Professor)를 합성한 폴리페서는 정치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기 위해 정치권에 줄을 대는 교수들을 뜻하는 조어(造語)다. 역대 정권은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 교수들을 총리, 장관 등으로 기용하거나 국회로 보냈다. 폴리페서가 되는 동인(動因)은 학문적 신념과 식견을 구현하기 위해, 권력이 좋아서, 교수 세계의 무력감(無力感) 때문에 등등 다양할 것이다. 2002년 대선 때는 정치인과 ‘동업(同業)’하는 폴리페서가 많이 등장했다.
▷전상인 서울대 교수는 지식인의 정치참여 유형을 선거캠프 참여형, 싱크탱크 참여형, NGO 참여형, 인식공동체 참여형으로 분류한다. 캠프 참여형은 대선 전략을 만들면서 후보와 동업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캠프에 참여한 폴리페서들은 특히 투기성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쪽박 찰 가능성도 컸지만 결과적으론 대박의 단맛도 진했다. 노 캠프의 비주류 무명 교수들은 그 후 요직을 차지하고, 역시 비주류다운 정책모험에 용감했고 그 폐해가 국민을 힘들게 했다.
▷미국은 대학과 싱크탱크의 지식인들이 정관계에 진출했다 돌아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권장하는 나라이다. 전·현직 국무장관인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 콘돌리자 라이스와 로버트 라이히 전 노동장관,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이 대표적인 학자 출신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본업인 연구와 강의를 소홀히 하며 ‘정치 투기(投機)’를 일삼는 교수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과 다른 점이다.
권 순 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한국영화를 이끌 감독들 >
-

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구독
-

이기진의 만만한 과학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트렌드뉴스
-
1
‘정년 65세 연장’과 맞바꾼 버스파업 철회…혈세로 비용 메워야
-
2
트럼프 ‘반도체 포고문’ 기습 발표…“결국 美 생산시설 지으란 것”
-
3
탄산음료 제쳤다…한국인 당 섭취식품 1위는 ‘이것’
-
4
아시안컵 8강전 가시밭길…한국 U-23 대표팀, 우승 후보 호주와 격돌
-
5
[단독]‘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국토부 조사 끝나자마자 장남 분가
-
6
美,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한국은 제외
-
7
李 “중국발 미세먼지 걱정 안 해” 11일만에…‘관심’ 위기경보 발령
-
8
美 반도체 관세 ‘포고문’에… 정부, 삼성-SK 불러 긴급회의
-
9
野 중진까지 “한동훈 제명 재고”에… 장동혁, 징계 10일 미뤄
-
10
[단독]“북미 현지화 K팝 아이돌 ‘캣츠아이’, 최대 장점은 유연성”
-
1
한동훈은 생각 없다는데…장동혁 “재심 기회 줄 것”
-
2
장동혁, 단식 돌입…“與,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
3
李대통령이 日서 신은 운동화는 75만원짜리…“수행비서 신발 빌려”
-
4
[송평인 칼럼]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
-
5
90분 최후진술 尹 “이런 바보가 쿠데타하나”… 책상치며 궤변
-
6
[사설]딱하고 민망했던 尹 최후진술
-
7
‘정년 65세 연장’과 맞바꾼 버스파업 철회…혈세로 비용 메워야
-
8
정청래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수사-기소 완전분리 의지 밝혀
-
9
국힘 “이혜훈, 아들들 증여-병역 자료 제출 거부…청문회 무의미”
-
10
[사설]‘대선 후보 날치기 교체’ 떠올리게 한 한밤 한동훈 기습 제명
트렌드뉴스
-
1
‘정년 65세 연장’과 맞바꾼 버스파업 철회…혈세로 비용 메워야
-
2
트럼프 ‘반도체 포고문’ 기습 발표…“결국 美 생산시설 지으란 것”
-
3
탄산음료 제쳤다…한국인 당 섭취식품 1위는 ‘이것’
-
4
아시안컵 8강전 가시밭길…한국 U-23 대표팀, 우승 후보 호주와 격돌
-
5
[단독]‘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국토부 조사 끝나자마자 장남 분가
-
6
美,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한국은 제외
-
7
李 “중국발 미세먼지 걱정 안 해” 11일만에…‘관심’ 위기경보 발령
-
8
美 반도체 관세 ‘포고문’에… 정부, 삼성-SK 불러 긴급회의
-
9
野 중진까지 “한동훈 제명 재고”에… 장동혁, 징계 10일 미뤄
-
10
[단독]“북미 현지화 K팝 아이돌 ‘캣츠아이’, 최대 장점은 유연성”
-
1
한동훈은 생각 없다는데…장동혁 “재심 기회 줄 것”
-
2
장동혁, 단식 돌입…“與,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
3
李대통령이 日서 신은 운동화는 75만원짜리…“수행비서 신발 빌려”
-
4
[송평인 칼럼]군 통수권자의 최소한의 자격
-
5
90분 최후진술 尹 “이런 바보가 쿠데타하나”… 책상치며 궤변
-
6
[사설]딱하고 민망했던 尹 최후진술
-
7
‘정년 65세 연장’과 맞바꾼 버스파업 철회…혈세로 비용 메워야
-
8
정청래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수사-기소 완전분리 의지 밝혀
-
9
국힘 “이혜훈, 아들들 증여-병역 자료 제출 거부…청문회 무의미”
-
10
[사설]‘대선 후보 날치기 교체’ 떠올리게 한 한밤 한동훈 기습 제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한국영화를 이끌 감독들]'충무로 반항아' 임상수 감독](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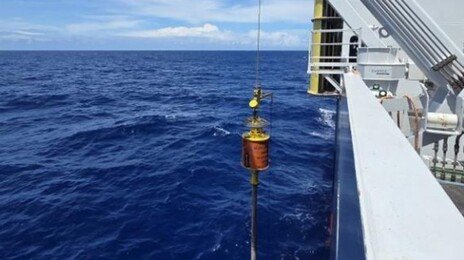

![[동아광장/송인호]‘헨리’ ‘니콜라’마저 좌절한다면, 청년에게 미래는 없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168706.1.thumb.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