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화문에서/정은령]지하철역에서
-
입력 2006년 8월 5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말 안 통하고 체제가 다른 나라라고 해도 출장자든, 배낭여행자든 도시의 모험가라면 노선도를 들고 지하철역으로 향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하철역은 여행자들에겐 한 나라나 한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첫인상’이 되기도 한다.
뉴욕의 지하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하철역에 터를 잡고 있는 거리의 악사들이다. 지하철역을 떠올리면 ‘링컨센터 앞 역 구내에서 하모니카 불던 친구, 42번가 역에서 플라스틱 양동이로 타악 연주하던 그 흑인 남자’ 하는 식의 기억이 덩달아 따라올 지경이다. ‘노래 한 곡에 동전 한 닢’을 바라는 그 불법이 그럭저럭 용인되는 이유는 이미 지하철역 악사가 뉴욕 지하철 문화의 일부분을 이루기 때문이지 싶다.
올여름 10년의 시간차를 두고 다시 타 본 로마의 지하철에서는 여전히 에어컨 달린 객차를 구경하기가 어려웠다. 낡은 객차 외관이 도화지인 양 온통 낙서해 놓은 험한 모습도 여전했다. 불편한들 어떠랴. 여전히 전 세계에서 인류 문명의 유적을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에겐 모든 길이 메트로(지하철)로 통하니 말이다.
도시는 아름답지만 무임승차를 적발하기 위한 지하철 검표원의 표 검색은 1980년대의 ‘불심검문’을 떠올리게 했던 체코 프라하. 사복 차림의 검표원이 굳은 표정으로 “표 좀 봅시다” 하는 모습은 80년대 대학가 근처에서 흔히 벌어지던 “가방 좀 봅시다” 장면으로 연결됐다.
이방인의 눈에 보이는 서울 지하철의 남다른 ‘첫인상’은 무엇일까. 어쩌면 경로석은 아닐까.
가끔 경로석을 두고 시비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승객은 경로석을 비워 둘지언정 앉지 않는다.
이런 문화 때문일까. 지하철 노인 이용객은 ‘급증’하고 있다. 지하철 1∼4호선 운행을 담당하는 서울메트로가 이번 주에 낸 운임 수입과 이용객 통계만 보아도 그 증가세는 확연하다. 1999년 5300여만 명이던 65세 이상 노인 이용객은 2005년 9790여만 명으로 갑절 가까이 늘었다.
이유는? 말할 것 없이 공짜이기 때문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전동차 리프트 등이 확충된 영향도 크다. 요즘은 자가용 있고 운전할 줄 아는 형편 넉넉한 노인들도 대부분 지하철을 이용한다. 운전 감각이 예전 같지 않은 데다 기름값, 주차비가 은퇴한 노인에게는 적잖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되는 무임승객의 증가는 지하철 운영에 고스란히 적자 부담이다. 무임승객 수송비가 지난해 전체 적자의 1.3배에 이르는 1041억 원이라고 서울메트로는 고충을 토로한다.
노인이나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다. 세상 속으로 마음껏 나다닐 수 있는 권리는 사회적 약자에겐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첫걸음이다.
무임승차의 한 면은 지하철 운영 만성 적자의 원인을 드러내지만 다른 한 면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보여 준다.
경로석이 있는 한국의 지하철이 어쩌면 이방인의 눈엔 ‘한국은 사회적 약자를 잘 배려하는 나라’라는 첫인상을 남길지도 모를 일이다.
현재 국회에는 무임수송비 정부 전액 지원에 관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은령 사회부 차장 ryung@donga.com
광화문에서 >
-

동아닷컴 신간
구독
-

사설
구독
-

게임 인더스트리
구독
트렌드뉴스
-
1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2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3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4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5
“불륜으로 성병 걸린 빌게이츠, 엡스타인에 SOS” 문건 공개
-
6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7
‘두쫀롤’이 뭐길래…새벽 오픈런에 ‘7200원→5만원’ 되팔기까지
-
8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9
자유를 노래하던 ‘파랑새’가 권력자의 ‘도끼’로…트위터의 변절
-
10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4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5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6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7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8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9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10
李 “부동산 정상화, 5천피-계곡 정비보다 쉬워”
트렌드뉴스
-
1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2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3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4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5
“불륜으로 성병 걸린 빌게이츠, 엡스타인에 SOS” 문건 공개
-
6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7
‘두쫀롤’이 뭐길래…새벽 오픈런에 ‘7200원→5만원’ 되팔기까지
-
8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9
자유를 노래하던 ‘파랑새’가 권력자의 ‘도끼’로…트위터의 변절
-
10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4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5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6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7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8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9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10
李 “부동산 정상화, 5천피-계곡 정비보다 쉬워”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조동주]162석 여당의 덧셈 정치, 107석 야당의 뺄셈 정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30/13326980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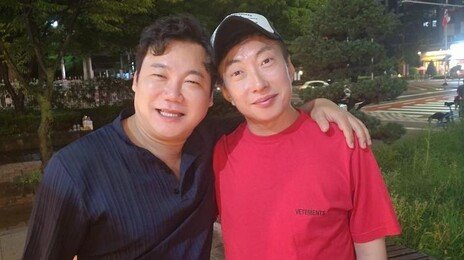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