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화문에서/홍권희]공청회도 못 하는 ‘토론공화국’
-
입력 2006년 6월 29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약 3년 뒤 5·31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열린우리당에 대한 내부비판 가운데 이런 지적이 나왔다. “몇몇이 쑥덕거리는 당정회의 같은 데서 나라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 결정된다.”
여기에 반대파의 실력 저지로 무산된 27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 장면이 겹친다. 반대파의 실력행사도 볼썽 사납지만 주최 측인 정부가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 차라리 ‘대(對)국민 설명회’로 바꾸고 공청회는 따로 했어야 옳았다.
우선 공청회 발언자와 진행방식 등이 하루 전날에야 공개됐다. 공청회에서 누가 어떤 발표를 하는지 알아야 이해당사자들도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정부는 반대파로부터 ‘엉터리’라는 소리와 함께 “진짜 공청회를 다시 열자”는 말을 들어야 했다.
‘한미 FTA에 찬성하는 사람들 위주로 토론자를 정했다’는 비난도 정부가 자초했다. 토론예정자들의 원고엔 협상에 대한 주문도 많았다. 그런데도 ‘토론자 22명 중 5명만이 시민단체 쪽 대표’라는 반발이 나온 것은 정부가 반대발언의 기회를 객관적으로 충분히 배정하지 않은 탓이다.
언제부터인지 공청회는 둘 중의 하나가 돼버렸다. ‘무산’ ‘저지’라는 단어가 뒤따르거나 ‘무늬만’ ‘반쪽’ 등 수식어가 앞에 붙는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 공청회가 푸대접을 받는 것이다.
19일 파행적으로 진행된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영형 혁신학교 추진 관련 공청회’도 그랬다. 공청회 몇 시간 전에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기자회견에서 ‘8월에 학교를 선정해 내년 3월 개교’라는 일정을 밝힌 터였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다 정해놓고 의견을 듣겠다는 거냐”는 일부 단체의 반발을 막기엔 벅찼다.
김 부총리가 치고 나온 외국어고 입학 지역제한 방안은 외고 설립인가권을 가진 시도 교육감과 충분한 협의도 없었고 청와대하고만 상의한 내용이라고 한다. 그 흔한 공청회 개최조차 자신 없어 하는 처지가 돼버렸다.
정부가 공청회를 방해하는 단체를 제대로 혼내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의 약점 때문 아닌가. 행정절차법 규정대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발표자, 발표신청 방법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널리 알리는 등 요건을 갖춘다면 훼방꾼을 엄히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 핵심은 끼리끼리 하는 ‘코드 토론’에는 능란할지 몰라도 공개토론으로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약하기만 하다. 약점을 보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공청회일 텐데 그 좋은 기회를 모두 날려 버리고 있다.
한미 FTA처럼 국민이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파급효과도 큰 현안이나 외고 입학문제처럼 다수가 큰 관심을 가진 쟁점일수록 공청회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반대파 때문에 괴롭겠지만, 명색이 ‘참여정부’에 ‘토론공화국’을 자처하지 않았는가.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
광화문에서 >
-

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새로 나왔어요
구독
트렌드뉴스
-
1
집무실 ‘가루’ 된 하메네이, 생사 불확실…권력 계승자 4명 정해놔
-
2
이란, 중동 美기지 4곳 ‘조준 공격’…“미군 4만명 이란 사정권”
-
3
지지율 하락을 전쟁으로 만회?…트럼프 ‘이란 공격’ 진짜 이유는
-
4
‘부화방탕 대명사’ 북한 2인자 최룡해의 퇴장 [주성하의 ‘北토크’]
-
5
‘총 쏘는 13세 김주애’ 단독샷 이례적 공개…또 가죽점퍼
-
6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7
이란 초교에 떨어진 미사일…여학생 최소 51명 사망
-
8
이란 공습에 코인 4~6% 급락…유가 배럴당 150달러 갈수도
-
9
공습 시작에 테헤란 직장인들, 울며 자녀 학교로 뛰어가…검은 토요일
-
10
홧김에 이웃 600가구 태워버린 남성…발단은 아내의 ‘외도’
-
1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2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더니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필요”
-
3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4
대구 간 한동훈 “죽이되든 밥이되든 나설것”
-
5
송광사 찾은 李대통령 내외…“고요함 속 다시 힘 얻어”
-
6
큰 거 온다더니 ‘틱톡커 이재명’…“팔로우 좋아요 아시죠?”
-
7
‘지지율 바닥’ 쇼크에도… 민심과 따로 가는 국힘
-
8
[책의 향기]무기 팔고자 위협을 제조하는 美 군산복합체
-
9
쿠팡 김범석, 정보유출 99일만에 영어로 “사과”
-
10
이란, 중동 美기지 4곳 ‘조준 공격’…“미군 4만명 이란 사정권”
트렌드뉴스
-
1
집무실 ‘가루’ 된 하메네이, 생사 불확실…권력 계승자 4명 정해놔
-
2
이란, 중동 美기지 4곳 ‘조준 공격’…“미군 4만명 이란 사정권”
-
3
지지율 하락을 전쟁으로 만회?…트럼프 ‘이란 공격’ 진짜 이유는
-
4
‘부화방탕 대명사’ 북한 2인자 최룡해의 퇴장 [주성하의 ‘北토크’]
-
5
‘총 쏘는 13세 김주애’ 단독샷 이례적 공개…또 가죽점퍼
-
6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7
이란 초교에 떨어진 미사일…여학생 최소 51명 사망
-
8
이란 공습에 코인 4~6% 급락…유가 배럴당 150달러 갈수도
-
9
공습 시작에 테헤란 직장인들, 울며 자녀 학교로 뛰어가…검은 토요일
-
10
홧김에 이웃 600가구 태워버린 남성…발단은 아내의 ‘외도’
-
1
국민 64%가 “내란” 이라는데… 당심만 보며 민심 등지는 국힘
-
2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더니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필요”
-
3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4
대구 간 한동훈 “죽이되든 밥이되든 나설것”
-
5
송광사 찾은 李대통령 내외…“고요함 속 다시 힘 얻어”
-
6
큰 거 온다더니 ‘틱톡커 이재명’…“팔로우 좋아요 아시죠?”
-
7
‘지지율 바닥’ 쇼크에도… 민심과 따로 가는 국힘
-
8
[책의 향기]무기 팔고자 위협을 제조하는 美 군산복합체
-
9
쿠팡 김범석, 정보유출 99일만에 영어로 “사과”
-
10
이란, 중동 美기지 4곳 ‘조준 공격’…“미군 4만명 이란 사정권”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조동주]6월 지방선거 코앞인데 8월 당권싸움 빠진 與](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2/27/13344018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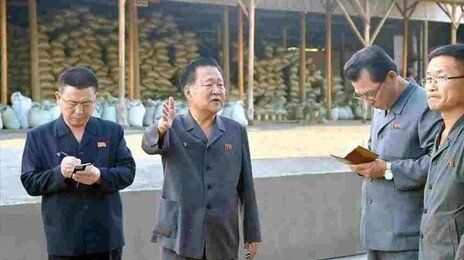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