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인문사회]영화는 ' 환상의 세계'로 가는 여행
-
입력 2002년 5월 17일 17시 57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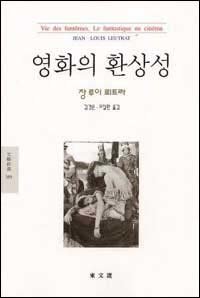
근대 사실주의 회화나 서사(敍事·이야기하기)의 전통은 사실과 실재(實在)에 대한 충실한 모사(模寫)를 자신들의 존립근거로 삼았다. 작가는 현상에 거울을 들이대듯 ‘리얼’을 반영했고 수용자는 ‘리얼리티’의 정도(degree)라는 잣대로 가치에 대한 평가를 내리곤 했다. 그것은 바로 이 리얼과 리얼리티가 서로 부딪치고 맞버티면서 그 사이에서 의미가 획득된다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 의미 획득의 지점에 판타즘이 자리한다.
바꿔 말하면 그 판타즘이란 예술작품을 사이에 두고 상상력 안에서 작가와 수용자가 이루는 상호작용이 근간이 됨을 말한다. 그런데 사진기의 발명에 이어 영화라는 전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예술들은 이전의 어느 때도 겪어보지 못했던 강력한 도전자를 만난 셈이었고, 그들은 생존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계발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영화는 기존의 예술들이 오랜 세월 각자의 장점으로 가지고 있던 특성들을 마치 흡혈귀처럼 대부분 흡수해버리면서 급성장한다. 그렇게 해서 영화는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의 감각을 확장하면서 다른 지평을 열었는데, 그것은 바로 리얼과 리얼리즘의 반열에 판타즘이라는 요소를 강력하게 밀어 올려 삼각구도를 만든 일이었다. 우리의 일상적 삶에 대한 모방이야말로 판타지로 이행하는 도약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영화로 인해 선명해졌다고 할까?
존재의 기록이며 보존이라는, 예술의 가장 오래된 테마는 사진을 넘어 영화에 와서 새로운 의미와 차원을 획득한다. 그것은 바로 제시된 시공간 내에서의 나타남과 사라짐(apparition/disparition)의 문제다. (그래서 영화 탄생 초기에 죠르쥬 멜리에스와 같은 마술사는 영화야말로 마술과 같은 반열의 ‘야바위’임을 득달같이 눈치채고 그 자신이 영화 감독이 되어 바로 이 나타남/사라짐을 실험한다) 이는 곧 생성과 소멸이다. 여기에 분할과 연결이라는 편집의 수준에서 발생하는 틈새(gap)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그것은 이미 지나감(과거)과 아직 오지 않음(미래)의 사이이다. 바로 그 사이의 시공간에서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발동되는지에 대해서는 영화사 초기 몽타쥬 이론을 세운 선각자들(쿨레쇼프와 그 후계자들)이 실험하고 입증했던 바다. 그 여백을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의 핵심이 바로 판타스틱(환상성)일 것이다.
일찍이 ‘기계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에서 발터 벤야민은 “정신분석이 우리에게 본능적 무의식의 체험을 열어줬다면, 영화는 우리에게 시각적 무의식에 대한 체험을 환기시킨다”라고 말했다. 어디 시각적 무의식뿐이랴. 그것은 공감각(共感覺)적이고 직접적이면서 우리를 심연(深淵) 속으로 밀어 넣어 버리거나 아니면 그 심연 속에서 솟구쳐 오르도록 추동(推動)한다. 이런 동력의 핵심이 바로 판타스틱일 것이다.
‘유령들의 삶. 영화의 환상성(Vie des fantomes. Le fantastique au cinema)’이라는 원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 책의 저자인 장-루이 뢰트라는 이제 막 탄생 100년을 넘긴 예술계의 신생아인 영화의 본성에 대해 바로 이 문제의 환상성 이라는 화두를 던져놓고 논의를 시작한다. 그뿐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논지에 대한 균형과 방증을 위해 영화계에서조차 이제까지 저급한 장르로 인식돼 왔던 호러-판타스틱 영화의 대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을 전면으로 불러낸다.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며 본질로서의 영화 그 자체에 대한 존재-인식론적인 사유를 한 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축은 영화의 이미지 속에 내재해 있는 어떤 디테일들로부터 영화적 기법들, 그리고 개별 작품의 주제에 이르기까지에서 크고 작은 화두들을 끄집어내 던져놓고 ‘내가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은 무엇이고 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일종의 자문자답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축을 씨줄과 날줄로 하여 텍스트는 직조돼 있다. 일견 맥락 없이 툭툭 던져진 화두들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꿰미로 꿰어내는 실은 바로 판타스틱이며, 흐트러진 퍼즐의 조각들처럼 보이지만 그 밑그림 역시 판타스틱이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저자가 이들 작품에 참여하였던 배우, 감독, 제작자들을 유령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그것이 단지 비유에 그치지 않고 시적인 여운을 획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탁월한 직관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시로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출몰하는 유령이며, 우리가 다시 관심을 가지고 그 작품들을 대할 때 그들의 존재는 바로 지금, 여기에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그 유령들은 우리의, 영화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가이드가 된다는 것이다.
쉽지 않은 책이다. 역자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눈에 선하게 다가온다. 꼼꼼하고 탄탄한 번역이 그것을 반증한다. 그런 이면에는 간단치 않은 부가 작업도 병행됐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한데, 그것은 이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150여 편에 이르는 영화들 중 우리나라에서 구하거나 볼 수 없는 작품들이 태반이 넘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번역은 원문에 대한 충실한 이해뿐만 아니라 언급하고 있는 내용적 맥락과 배경에 대한 일정한 지식과 확인도 요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만큼 견고하고 적확한 번역을 해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텍스트가 바로 이 책이다. 그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저자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책이 주는 부가적인 소득이랄까? 아니면 새로운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을 만한 것은, 세계영화사에서 호러-판타스틱 장르의 뿌리와 계보에 대한 새로운 추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인식론적 기초를 이 책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작품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하고 주제별로 영역을 세분화하면서 살을 붙여나가는 작업을 병행하면 그 자체로 매우 훌륭한 장르론적 연구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연구들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의 연구자들이 분발하도록 하는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서정남 영화평론가
트렌드뉴스
-
1
오세훈 “오늘은 공천 등록 못한다, 선거는 참여”…절윤 배수진
-
2
靑직원 또 쓰러지자, 李 “나를 악덕 사업주라고…”
-
3
[단독] 김경 “강선우가 돌려줬다는 5000만원, 내 돈 아냐”
-
4
전장 넓히는 이란…이라크 영해서도 美·그리스 유조선 타격
-
5
‘까마귀 모양 드론’으로 교도소에 마약 배달…美 신종 범죄 기승
-
6
가수 김완선, 미등록 1인 기획사 운영 혐의 검찰 송치
-
7
아스팔트 뚫고 ‘거대 철기둥’ 13m 솟구쳐…“이게 무슨일?”
-
8
“팁 꾸러미까지 주는 한국인…베트남서 호구로 통해”[e글e글]
-
9
“하늘에서 붉은 비가…” 유럽 덮친 ‘블러드 레인’ 원인은?
-
10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검토”…재보선 여부 불투명
-
1
‘보수의 심장’ TK도 뒤집혔다…민주 29%, 국힘 25% 지지
-
2
‘검찰 개혁’ 갈라진 與… “대통령 협박” “李도 배신자” 정면충돌
-
3
‘사드’ 다음은… 美, 韓에 ‘전쟁 지원 요청’ 우려
-
4
‘대출 사기’ 민주당 양문석 의원 당선무효 확정
-
5
李 “신속히 민생 지원…직접 지원땐 현금보다 지역화폐로”
-
6
장동혁, ‘절윤’ 후속조치 일축… 오세훈, 공천 신청 안밝혀
-
7
[사설]檢개혁안 마구 흔드는 與 강경파… 누굴 믿고 이리 무도한가
-
8
“팁 꾸러미까지 주는 한국인…베트남서 호구로 통해”[e글e글]
-
9
‘법왜곡죄’ 1호 고발은 ‘李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
10
오세훈 “오늘은 공천 등록 못한다, 선거는 참여”…절윤 배수진
트렌드뉴스
-
1
오세훈 “오늘은 공천 등록 못한다, 선거는 참여”…절윤 배수진
-
2
靑직원 또 쓰러지자, 李 “나를 악덕 사업주라고…”
-
3
[단독] 김경 “강선우가 돌려줬다는 5000만원, 내 돈 아냐”
-
4
전장 넓히는 이란…이라크 영해서도 美·그리스 유조선 타격
-
5
‘까마귀 모양 드론’으로 교도소에 마약 배달…美 신종 범죄 기승
-
6
가수 김완선, 미등록 1인 기획사 운영 혐의 검찰 송치
-
7
아스팔트 뚫고 ‘거대 철기둥’ 13m 솟구쳐…“이게 무슨일?”
-
8
“팁 꾸러미까지 주는 한국인…베트남서 호구로 통해”[e글e글]
-
9
“하늘에서 붉은 비가…” 유럽 덮친 ‘블러드 레인’ 원인은?
-
10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검토”…재보선 여부 불투명
-
1
‘보수의 심장’ TK도 뒤집혔다…민주 29%, 국힘 25% 지지
-
2
‘검찰 개혁’ 갈라진 與… “대통령 협박” “李도 배신자” 정면충돌
-
3
‘사드’ 다음은… 美, 韓에 ‘전쟁 지원 요청’ 우려
-
4
‘대출 사기’ 민주당 양문석 의원 당선무효 확정
-
5
李 “신속히 민생 지원…직접 지원땐 현금보다 지역화폐로”
-
6
장동혁, ‘절윤’ 후속조치 일축… 오세훈, 공천 신청 안밝혀
-
7
[사설]檢개혁안 마구 흔드는 與 강경파… 누굴 믿고 이리 무도한가
-
8
“팁 꾸러미까지 주는 한국인…베트남서 호구로 통해”[e글e글]
-
9
‘법왜곡죄’ 1호 고발은 ‘李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
10
오세훈 “오늘은 공천 등록 못한다, 선거는 참여”…절윤 배수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레포츠]낚시](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