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문학예술]3초에 한명씩 죽어간 미친 전쟁 '전투'
-
입력 2001년 10월 19일 18시 44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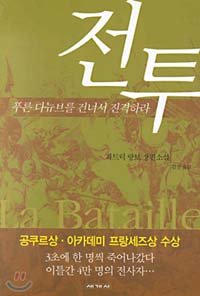
모든 전쟁은 미친 짓이다. 전쟁에 구경할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폭탄은 전쟁의 명분이 겨냥하는 범죄자들에게만 떨어지지 않는다.
프랑스의 작가 파트릭 랑보(55)의 소설 ‘전투’는 전쟁을 다루고 있다. 1998년 공쿠르상과 아카데미프랑세즈상 등 굵직한 문학상을 거머쥔 이 소설은 꼼꼼하게 읽어볼만하다. 지구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대전의 양상에 대해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더욱 흥미롭다.
우선 작가의 집필 동기가 남다르다. 작가는 170년 전에 프랑스의 사실주의 대작가 발자크가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에 옮기지 못한 문학 기획으로부터 출발한다. 발자크는 1809년 5월 21∼22일에 걸쳐 벌어졌던 아스테른-에슬링 전투에 대해 쓰고 싶어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이 기획을 작가 랑보가 실현에 옮긴다. 이 선택은 대단히 문학적으로 느껴진다. 영상문화에 떠밀려 점점 더 재현의 제왕으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문학의 위치를 되찾는 것.
그런데 왜 하필 에슬링이었을까? 나폴레옹을 세인트헬레나로 밀어넣은 워털루가 아니라? 작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것은 에슬링이 가장 멍청하고 미친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이틀 사이에 무려 4만 명이 죽었다. 3초에 한 명씩 죽어나간 꼴이다. 그런데도 이긴 자도 진 자도 없다. 이 전쟁을 계기로 나폴레옹 전쟁은 대학살의 양상을 띠기 시작한다. 구역질나는 무의미의 시작.
작가는 앞뒤 뚝 잘라내고 막바로 전쟁의 현장으로 들이닥친다. 전쟁의 명분? 한 마디 설명도 없다. 작가가 보여주는 것은 전쟁의 현장, 그것뿐이다. 아니, 전쟁의 ‘적신(赤身)’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겠다.
그의 시선은 냉혹하지도 열정적이지도 않다. 기계적이다. 주인공도 없다. 작중 인물들은 모두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다루어진다. 나폴레옹조차 그저 한 명의 등장인물에 불과할 뿐이다.
전쟁은 몇 개의 면과 몇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몇 개의 면을 정복하기 위해서 몇 개의 선이 그어진다. 그러나 우연의 요소에 의해서 선들이 잘려지고, 몇 개의 면 안에 병사들은 고립된다. 그리고 잔인한 살육. 피가 튀고, 살점이 으깨어지고, 뼈가 꺽인다, 야전병원의 의사는 목곡용 톱으로 부상자들의 다리와 팔을 썰어낸다. 사이사이 벌어지는 약탈, 강간. 군수품을 조달받지 못하는 병사들은 죽은 말고기를 토막내어 흉갑에 넣고 끓여먹는다. 양념이 없어 화약가루를 뿌린다. 소설에서 모든 것은 극도의 정확성으로 복원되어 있다.
전쟁이라고? 작가는 등장인물의 입을 빌어 너무나 정확하게 말한다. 아니, “어떤 추한 운명”이라고. 이기고 지는 것은 “한번의 바람, 강물의 변덕”에 달려있다. 그런데 세계여, 우리는 그 한번의 바람에 기대어 파들파들 떨고 있다.
정녕 그 “추한 운명”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매번? 아니, 매번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어이 매번 전쟁은 벌어지곤 했었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어리석음이다. 김철 옮김, 원제 ‘La Bataille’(1997)
김 정 란(시인·상지대 교수)
스타일 >
-

지금, 여기
구독
-

이은화의 미술시간
구독
-

공기업 감동경영
구독
트렌드뉴스
-
1
오천피 시대 승자는 70대 이상 투자자…2030 수익률의 2배
-
2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3
배우 얼굴 가린다고…아기 폭우 맞히며 촬영, ‘학대’ 논란
-
4
트럼프 “대규모 함대 이란으로 이동 중…베네수 때보다 더 큰 규모”
-
5
“담배 끊으면 60만 원”… 보건소 맞춤형 금연 코칭
-
6
‘린과 이혼’ 이수, 강남 빌딩 대박…70억 시세 차익·159억 평가
-
7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이 방향’이 맞는 이유
-
8
“전기차 편의품목까지 다 갖춰… 신차 만들듯 고생해 만들어”
-
9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10
‘HBM 왕좌’ 굳힌 SK하이닉스…영업이익 매년 두배로 뛴다
-
1
李 “담배처럼 ‘설탕세’ 거둬 공공의료 투자…어떤가요”
-
2
국힘, 내일 한동훈 제명 속전속결 태세… 韓 “사이비 민주주의”
-
3
법원 “김건희, 청탁성 사치품으로 치장 급급” 징역 1년8개월
-
4
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
5
장동혁 “한동훈에 충분한 시간 주어져…징계 절차 따라 진행”
-
6
李, 이해찬 前총리 빈소 찾아 눈시울… 국민훈장 무궁화장 직접 들고가 추서
-
7
“中여성 2명 머문뒤 객실 쑥대밭”…日호텔 ‘쓰레기 테러’ [e글e글]
-
8
‘김어준 처남’ 인태연, 소진공 신임 이사장 선임…5조 예산 집행
-
9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10
광주-전남 통합 명칭,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
트렌드뉴스
-
1
오천피 시대 승자는 70대 이상 투자자…2030 수익률의 2배
-
2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3
배우 얼굴 가린다고…아기 폭우 맞히며 촬영, ‘학대’ 논란
-
4
트럼프 “대규모 함대 이란으로 이동 중…베네수 때보다 더 큰 규모”
-
5
“담배 끊으면 60만 원”… 보건소 맞춤형 금연 코칭
-
6
‘린과 이혼’ 이수, 강남 빌딩 대박…70억 시세 차익·159억 평가
-
7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이 방향’이 맞는 이유
-
8
“전기차 편의품목까지 다 갖춰… 신차 만들듯 고생해 만들어”
-
9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10
‘HBM 왕좌’ 굳힌 SK하이닉스…영업이익 매년 두배로 뛴다
-
1
李 “담배처럼 ‘설탕세’ 거둬 공공의료 투자…어떤가요”
-
2
국힘, 내일 한동훈 제명 속전속결 태세… 韓 “사이비 민주주의”
-
3
법원 “김건희, 청탁성 사치품으로 치장 급급” 징역 1년8개월
-
4
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
5
장동혁 “한동훈에 충분한 시간 주어져…징계 절차 따라 진행”
-
6
李, 이해찬 前총리 빈소 찾아 눈시울… 국민훈장 무궁화장 직접 들고가 추서
-
7
“中여성 2명 머문뒤 객실 쑥대밭”…日호텔 ‘쓰레기 테러’ [e글e글]
-
8
‘김어준 처남’ 인태연, 소진공 신임 이사장 선임…5조 예산 집행
-
9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10
광주-전남 통합 명칭,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스타일]'비대칭형' 헤어컷…중성미가 찰랑 찰랑](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2/01/17/6845660.1.jpg)
![[김형석 칼럼]새해에는 우리 모두 다시 태어나야 한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253670.1.thumb.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