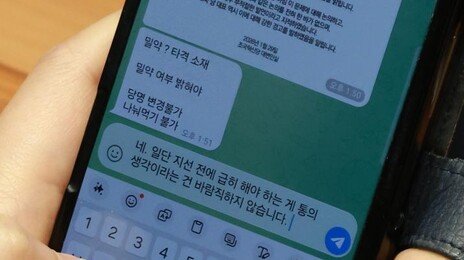공유하기
[인터뷰]국내 근무 새내기 여성3인의 '한국생활'
-
입력 2000년 6월 6일 20시 16분
글자크기 설정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의 세 여성이 한국 근무를 택한 이유. 이제 ‘낯이 익어가는’ 한국에서의 일과 삶은 어떨까.
미국계 외국어 교육기업 벌리츠코리아의 원장 레비탈 골란(Revital Golan·31)은 한국생활 7개월 째. 벌리츠의 영어교육법 ‘영어에 푹빠지기(Total Immersion)’처럼 한국에 ‘푹 빠졌다’.
그의 주요 업무는 기업관계자들을 만나 직원 영어연수프로그램을 설명하고 40여명의 외국인 강사진을 챙기는 일.
“원장이 젊은 이스라엘 여성이라 다들 놀라지만 ‘여자라서’ 힘든 점은 별로 없어요. 다만 기업 임원들이 직원들의 토익점수 올리는 데만 신경을 써 회화위주의 교수법을 설득하기가 좀 어렵더군요.” 주말이면 3개월된 딸을 데리고 공원에 가거나 쇼핑을 즐긴다는 골란. 롤러 블레이드 타고 유모차를 쌩쌩 모는 모습은 이미 동네에서 유명하다.
프랑스 기업 까르띠에는 고급 보석과 시계로 잘 알려진 기업. 마케팅 부장 까롤린 르 글로앙(Carolin Le Gloan·33)은 동대문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한국 여성들을 유심히 살핀다. 어떤 분위기의 보석이 어울릴지를 가늠해 보기 위한 것.
글로앙은 제품기획·홍보·고객관리 등 마케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말이 서툴러 한국고객과 직접 대화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죠. 대신 시내를 다니며 관찰하고 매일 백화점 매장 판매원의 의견을 모니터하는게 아주 중요한 일과에요.”
독일계 은행 도이체방크의 기업금융담당 회계과장인 케르스틴 기어(Kerstin Giere·26)는 은행경력 8년째. 한국근무는 한달이 조금 넘었다. 한국에 있는 외국기업을 상대로 사업계획에 맞는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구좌관리를 하는 일이 주 업무다.
“독일에서는 높은 실업률 때문에 주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했는데 한국사람들은 개인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일하더군요. 한국에 온 후 저도 일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어요.”
한국에 온지 얼마 안돼 시내 구경에 재미를 붙인 그는 주말마다 서울의 이곳저곳을 찾아다닌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
애니메이션 >
-

김도언의 너희가 노포를 아느냐
구독
-

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구독
-

기고
구독
트렌드뉴스
-
1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2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3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4
자유를 노래하던 ‘파랑새’가 권력자의 ‘도끼’로…트위터의 변절
-
5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6
“불륜으로 성병 걸린 빌게이츠, 엡스타인에 SOS” 문건 공개
-
7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8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9
‘두쫀롤’이 뭐길래…새벽 오픈런에 ‘7200원→5만원’ 되팔기까지
-
10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4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5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6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7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8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9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10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트렌드뉴스
-
1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2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3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4
자유를 노래하던 ‘파랑새’가 권력자의 ‘도끼’로…트위터의 변절
-
5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6
“불륜으로 성병 걸린 빌게이츠, 엡스타인에 SOS” 문건 공개
-
7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8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9
‘두쫀롤’이 뭐길래…새벽 오픈런에 ‘7200원→5만원’ 되팔기까지
-
10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4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5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6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7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8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9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10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애니메이션]'환타지아 2000' 8월 5일 개봉](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