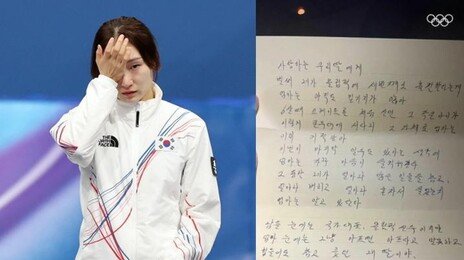공유하기
[축구]올림픽팀, 패자의 설움 일찍 맛본게 보약됐으면…
-
입력 1999년 9월 27일 18시 44분
글자크기 설정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열린 97세계청소년(20세 이하)축구 B조 예선에서 브라질에 3―10으로 대패한 것.
그리고 2년 뒤. 그날 그곳에 있었던 주축 멤버들이 올림픽대표팀에 모였다. 박진섭 서기복 안효연 조세권 심재원.
이날이 이들에게 ‘비극의 끝’은 아니었다. 지난해 방콕아시아경기 8강전에서 홈팀 태국에 골든골을 내줘 1―2로 졌고 최근에는 7일 일본올림픽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1―4로 무너졌다.
이 얘기만 나오면 박진섭은 지금도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박진섭은 브라질전에서 최종수비파트인 스위퍼를 맡아 공격진과 맞섰기에 10골을 모두 자신이 내준 심정인 것. 태국전에서도 상대 공격수의 옷을 잡아당기는 파울을 해 결국 태국에 프리킥에 의한 골든골을 내주고 말았다.
왜 이들이 어린 나이에 이처럼 ‘산전수전’을 다 겪었을까.
전문가들은 한국축구의 문제점이 이들 세대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한다.
즉 선배 세대들은 몸을 던지며 ‘악으로 버텨’ 떨어지는 실력을 만회했다. 이들도 몸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옛날과는 달리 세계축구수준은 멀찌감치 달아나 있었다.
올림픽대표팀 허정무감독은 이런 아픔을 일찍 겪은 게 ‘자산’이라고 말한다.
“개인 기량이 세계 수준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기에 더 열심히 한다. 또 최악의 상황을 세번이나 겪어 이젠 어지간한 위기 상황에서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 많은 축구전문가도 역시 “앞으로도 세계 축구와 자주 부딪쳐 이들의 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에게 더 이상의 아픔은 없을 것인가. 축구팬은 숨죽이고 있다.
〈김호성기자〉ks1011@donga.com
김유리 >
-

어린이 책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
구독
트렌드뉴스
-
1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2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3
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韓 대미 투자, 반도체-車 영향은?
-
4
송가인 LA공연 펑크…“비자가 제때 안 나와”
-
5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
6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7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8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9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10
‘신격호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향년 85세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4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6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7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8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9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10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트렌드뉴스
-
1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2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3
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韓 대미 투자, 반도체-車 영향은?
-
4
송가인 LA공연 펑크…“비자가 제때 안 나와”
-
5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
6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7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8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9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10
‘신격호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향년 85세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4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6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7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8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9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10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김유리의 일본패션 엿보기]'포켓 몬스터'의 피카츄](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취권하는 중국 로봇, ‘쇼’인 줄 알았더니 ‘데이터 스펀지’였다? [딥다이브]](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393695.1.thumb.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