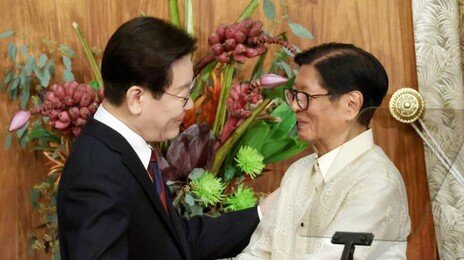공유하기
[소설]오래된 정원(198)
-
입력 1999년 8월 18일 18시 39분
글자크기 설정
송영태가 화실에서 제 동아리들과 모임을 가졌던 날로부터 시작하자.
나는 저녁을 끝내고 막 휴식을 취하려는 참이었다. 음반을 걸어 놓고 화실 안에 붙은 내 방에서 쿠션에 기대어 두 다리를 죽 뻗고 누워 있는데 바깥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먼저 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영태라는 걸 알았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잖아.
그가 내 방안을 기웃이 넘겨다보며 서있었다. 나는 가까스로 일어나 앉는 시늉을 했다.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애 밴 여자처럼 왜 그래?
말투가 아주 엉망이네.
영태는 방문 턱에 걸터앉으면서 내게 물었다.
면회 갔었다면서?
누가…그래?
영태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꾸했다.
정희씨가 그러던데. 만나봤어?
직계가족이 아니라 안된대. 그리구 같은 사건 연루자라나.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았더니 혼자말 하듯이 중얼거렸다.
까짓거, 현우 형 우리가 꺼내주자.
무기수를 어떻게 꺼내주니?
그러니까 독재를 타도해야지.
나는 골백번 들은 소리라 묵묵 부답.
그냥 돌아왔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처져 있는거야?
아니, 저녁 먹구 배가 불러서. 야 나 좀 혼자 놔둬라아 응? 느이 떨거지들은 오는 거야 안오는거야?
음 곧 올거야.
그럼 난 여기서 한숨 붙일테니까 이따가 갈 때쯤 해서 깨워 줘.
나는 송을 문턱에서 밖으로 밀어내고 유리 장지문을 드르륵 닫아버렸다. 여덟 시쯤 되었을까 바깥쪽에서 두런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오고 이어서 화실 안으로 들어와 앉는지 의자를 밀고 당기는 소리가 들렸다. 스무 명 가까이 되는 것 같다. 서로 인사를 나누는 말들이 오가고, 저건 송영태의 목소리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상반기 투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점검하고 하반기의 당면 과제들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준비위측에서 정세 분석을 해주시지요.
빠르고 거침없는 목소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뒤를 잇는다.
작년 말부터 현정권은 학살과 폭력이라는 일방적인 억압에서 국민화합 조치를 단행한다면서 학원자율화라는 유화국면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적이 현재 강하고 우리는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화책이 어디서 연유되었는가를 냉정히 분석해내지 못하고, 이른바 비공개 지도부에서는 적의 함정이 분명하므로 신중하게 행동 반경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패배적이고 반주체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대중동원력을 가동시키지도 못하면서 학원자율화 문제에만 매달렸던 것입니다.
<글: 황석영>
화제의 당선자 >
-

고양이 눈
구독
-

허명현의 클래식이 뭐라고
구독
-

동아광장
구독
트렌드뉴스
-
1
‘K패트리엇’ 천궁-Ⅱ, 이란 미사일 잡았다…UAE서 첫 실전 투입
-
2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3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4
미스 이란 출신 모델 “하메네이 사망, 많은 국민이 기뻐해”
-
5
‘文정부 치매’ 발언 이병태 “정제되지 않은 표현…용서 구한다”
-
6
이란, 이스라엘에 장거리 미사일 ‘가드르’, ‘에마드’ 발사
-
7
‘충주맨’ 김선태, 개인 유튜브 채널 개설…청와대行 아니었다
-
8
“개학 늦춰주세요” 李대통령 틱톡 몰려간 학생들
-
9
휘발유 1713.7원, 환율 1466.1원…중동發 물가 불안 커진다
-
10
살아서 3년, 죽어서 570년…“단종-정순왕후 이젠 만나게 해달라” 청원
-
1
‘尹 훈장’ 거부한 교장…3년만에 李대통령 훈장 받고 “감사”
-
2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3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4
“정파적 우편향 사상, 신앙과 연결도 신자 가스라이팅도 안돼”
-
5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6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7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
8
한동훈 “나를 탄핵의 바다 건너는 배로 써달라…출마는 부수적 문제”
-
9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10
조희대 “사법제도 폄훼-법관 악마화 바람직하지 않아”
트렌드뉴스
-
1
‘K패트리엇’ 천궁-Ⅱ, 이란 미사일 잡았다…UAE서 첫 실전 투입
-
2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3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4
미스 이란 출신 모델 “하메네이 사망, 많은 국민이 기뻐해”
-
5
‘文정부 치매’ 발언 이병태 “정제되지 않은 표현…용서 구한다”
-
6
이란, 이스라엘에 장거리 미사일 ‘가드르’, ‘에마드’ 발사
-
7
‘충주맨’ 김선태, 개인 유튜브 채널 개설…청와대行 아니었다
-
8
“개학 늦춰주세요” 李대통령 틱톡 몰려간 학생들
-
9
휘발유 1713.7원, 환율 1466.1원…중동發 물가 불안 커진다
-
10
살아서 3년, 죽어서 570년…“단종-정순왕후 이젠 만나게 해달라” 청원
-
1
‘尹 훈장’ 거부한 교장…3년만에 李대통령 훈장 받고 “감사”
-
2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3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4
“정파적 우편향 사상, 신앙과 연결도 신자 가스라이팅도 안돼”
-
5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6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7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
8
한동훈 “나를 탄핵의 바다 건너는 배로 써달라…출마는 부수적 문제”
-
9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10
조희대 “사법제도 폄훼-법관 악마화 바람직하지 않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4·15총선]공장-논밭-실험실서도 입성…이색경력 당선자들](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