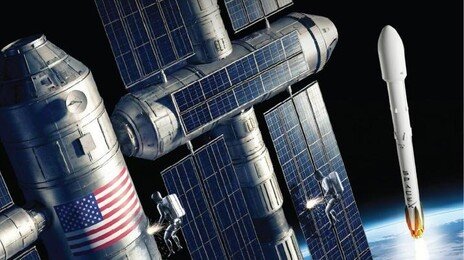공유하기
[옴부즈맨칼럼]박형상/기사출처 공개는 언론윤리 기본
-
입력 1999년 8월 8일 18시 26분
글자크기 설정
그러나 한국 신문들은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심지어 그 출처가 연합뉴스나 외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자가 취재하고 작성한 듯 버젓이 자사 기자의 실명을 다는 사례가 많다. 이는 기자실명제의 취지에도 반하지만 더 나아가 기자윤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독자는 기만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2차 가공 정보인지 1차적 정보인지, 전화인터뷰인지 직접 만나 인터뷰했는지 아니면 따로 출처가 있는 기사를 대충 베껴 쓴 것이지, 보도자료를 가공한 것인지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올브라이트 외교용 브로치’ 기사(7월5일자)는 기본적 윤리를 지킨 사례로 칭찬받을 만하다. 해당기사와 사진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자사기자 실명을 단 대부분의 신문들과 달리 동아일보는 ‘뉴욕 AP연합과 동아일보자료사진’이라는 크레디트를 달아주었다.
반면 ‘국내 최초 자매대학총장기사(7월29일자)’의 경우 같은 날 여타 중앙지에도 천편일률적으로 실린 기사였음에도 기자가 취재한 것인지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흔히 우리는 ‘그 신문이 그 신문’이라는 식으로 신문의 몰개성을 비판한다. 일류 고급지의 자부심을 지키려 한다면 배급기사나 보도자료를 짜깁기하는 관행이나 출입처 기자단의 담합에서 한 발짝 비켜나 동아일보 기자, 동아일보 기사만의 독자적 개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신문기자들 역시 립싱크 가수의 허위성을 경계해야 한다.
기사에 딸린 게재사진마저 똑같고 기사내용마저 대동소이한 상태에서 동아일보만의 품격을 어떻게 찾겠는가. 언론개혁만 하여도 신문의 차별성, 즉 기자와 기사의 개성을 찾아주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섬뜩한 표현도 자제해야 한다. ‘야, 등 뒤서 비수꽂아(7월31일자)’‘회창칼 YS겨눈다’(2일자) ‘이회창―YS 격돌, 칼 뽑고 칼 갈고’(5일자) 등의 표현은 너무 끔찍하다. 최근 들어 ‘저격수’ ‘∼죽이기’라는 비유적 표현이 유행하는데 설령 신랄한 풍자요 비유적 강조라 한들 칼로 시작하여 칼로 끝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다. 동아일보의 ‘바로잡습니다’는 지면 한구석 후미진 곳에 숨겨 있다시피 실려 있다. 왜 한국 신문들은 반론보도문, 정정보도문에 인색한가. 이는 결코 자존심의 손상이나 치욕, 굴복으로 여기거나 감출 일이 아니다. 반론보도 정정보도를 떳떳이 해주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신문의 신뢰도와 품격을 한결 드높여줄 것이다.
전문성 부족으로 기사제목이 잘못 뽑힌 사례도 있다. ‘한글 글꼴 저작권, 엇갈린 판결(7월27일자 A21면)’의 경우 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표제이다. 판결문에도 명시돼 있듯이 한글서체(typeface, 글꼴)의 독자적 저작권을 논단한 차원이 아니었다. 단지 ‘서체파일(font file)’의 경우 저작권법의 특별법과 같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보호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었다. 이처럼 법원 판결을 전달하는 법조기사를 보면 구체적 전후맥락을 거두절미한 채 그 판단결과를 곡해하는 사례가 많다. 판결문은 전문을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박형상<변호사>
트렌드뉴스
-
1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2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3
자유를 노래하던 ‘파랑새’가 권력자의 ‘도끼’로…트위터의 변절
-
4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7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8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9
이란 남부 항구도시 8층 건물서 폭발…“원인 불명”
-
10
김현철, 동심 나눈 박명수-클래식이 붙어… 그가 투명한 감정 고집하는 이유는? [유재영의 전국깐부자랑]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3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4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5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6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7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8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9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10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트렌드뉴스
-
1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2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3
자유를 노래하던 ‘파랑새’가 권력자의 ‘도끼’로…트위터의 변절
-
4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7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8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9
이란 남부 항구도시 8층 건물서 폭발…“원인 불명”
-
10
김현철, 동심 나눈 박명수-클래식이 붙어… 그가 투명한 감정 고집하는 이유는? [유재영의 전국깐부자랑]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3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4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5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6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7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8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9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10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