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감격의 우승? 끝내 못푼 저주? 울고 웃는 ‘무관의 제왕들’
- 동아닷컴
-
입력 2009년 11월 12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미국 메이저리그의 알렉스 로드리게스(뉴욕 양키스) 앞에는 세 가지 수식어가 붙는다. 1998년 이후 12년 연속 30홈런 이상을 때리면서 ‘최고 타자’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최고 연봉(3300만 달러) 선수’가 됐다. 하지만 1994년 데뷔 후 지난해까지 한 번도 우승 경험이 없어 ‘무관의 제왕’으로 불렸다. 5일 끝난 월드시리즈에서 양키스의 우승이 확정된 후 그는 동료들을 번갈아 안으며 눈물을 쏟았다. 중계 카메라는 그의 눈물을 연방 비춰댔다.》
로드리게스는 2004년 텍사스에서 양키스로 팀을 옮겼다. 양키스가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양키스는 공교롭게도 지난해까지 월드시리즈에 나가지 못했다. 그의 한은 양키스 유니폼을 입은 지 6시즌이 지난 올해에야 풀렸다.
박찬호(필라델피아)도 올해로 16시즌째를 맞았지만 우승 경험이 없다. 월드시리즈에 나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그는 10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내년에도 월드시리즈에 나갈 수 있는 팀에서 뛰고 싶다”고 말했다.
선수에게 우승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다. 하지만 축복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다. 각 종목에는 로드리게스처럼 최고의 스타이면서도 우승을 못해 무관의 제왕으로 불리는 선수들이 있다. 이들의 입장에선 ‘영혼을 팔아서라도 한번 우승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법하다.
국내에서는 1995년 삼성에 입단해 최고 타자로 군림한 이승엽(요미우리)이 우승 갈증에 목이 탔다. 그는 2002년 LG와의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극적인 동점 3점 홈런으로 우승을 이끌며 스스로 저주를 풀었다. 그의 뒤를 이은 국가대표 4번 타자 김태균(한화)도 입단 9년째 우승 경험이 없다.
농구에도 우승에 한 맺힌 스타가 많다. 1990년대 미국프로농구 최고의 파워포워드였던 찰스 바클리와 칼 말론은 우승을 위해 부상을 참고 은퇴도 미뤘다. 연봉 삭감의 수모를 겪으며 팀도 옮겨봤지만 번번이 눈물을 흘렸다. 게리 페이턴(1990년 데뷔)과 알론조 모닝(1992년 데뷔)은 2006년에야 마이매이에서 한을 풀었다.
현주엽은 ‘한국의 바클리’로 불린다. 고교 시절부터 이름을 알린 스타였지만 프로 9시즌 동안 우승은 못한 채 은퇴했다. 축구의 이동국(전북)도 사정은 비슷했다. 그는 올해 생애 처음으로 정규리그 1위와 득점왕에 오르며 부활을 알렸다. 무관의 제왕은 있어도 무관의 황제는 없다. 팬들은 우승컵을 안지 못한 스타는 황제라 부르지 않는다. 수많은 선수가 고통스러운 훈련을 견디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트렌드뉴스
-
1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2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3
자유를 노래하던 ‘파랑새’가 권력자의 ‘도끼’로…트위터의 변절
-
4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5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6
“불륜으로 성병 걸린 빌게이츠, 엡스타인에 SOS” 문건 공개
-
7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8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9
이란 남부 항구도시 8층 건물서 폭발…“원인 불명”
-
10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4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5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6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7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8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9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10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트렌드뉴스
-
1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2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3
자유를 노래하던 ‘파랑새’가 권력자의 ‘도끼’로…트위터의 변절
-
4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5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6
“불륜으로 성병 걸린 빌게이츠, 엡스타인에 SOS” 문건 공개
-
7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8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9
이란 남부 항구도시 8층 건물서 폭발…“원인 불명”
-
10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4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5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6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7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8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9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10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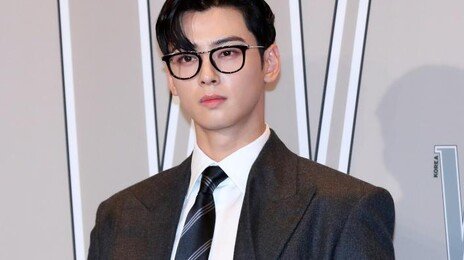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