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경북]‘세일즈맨의 죽음’ 아직 안보셨나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6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흔히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자식을 키우는 부모 마음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자식을 위해 무엇인가 남기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기 때문이다.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공연되고 있는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은 부모의 그런 심정을 잘 보여준다. 지난달 26일 무대에 오른 이 연극은 매회 230석 규모의 공연장이 관객으로 가득 찬다. 대구시립극단이 대구에서 처음 선보이는 장기 공연인 데다 다소 무거운 주제여서 대중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당초 걱정과는 반대다.
12일 오후 5시 공연도 마찬가지였다. 관객은 아버지와 함께 온 중학생과 고교생, 자녀를 결혼시킨 50대 후반 부부, 3040세대 직장인,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대학생, 손자가 많을 듯한 70대 부부 등 다양했다. 관객들은 “꼭 우리 집 이야기 같다”는 느낌으로 2시간 20분가량 이어지는 공연 내내 가족을 떠올리는 분위기였다. 1949년 미국에서 처음 공연된 연극이지만 시대와 관계없이 사람들의 가슴을 깨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아버지를 맡은 연극계 원로 배우 전무송 씨(71)가 두 손에 큰 가방을 들고 힘겹게 걸어 들어오는 첫 장면. 자식을 키우면서 평생 세일즈맨(외판원)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고단함과 쓸쓸함, 가정에 대한 책임,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가방에 들어 있는 듯하다. 60대 중반 부부가 두 아들을 걱정하며 나누는 이야기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들과의 갈등은 보통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하지만 바로 이 풍경 때문에 관객들은 배우들의 연기를 그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객석에서 자신이 마치 배우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죽기 전에 채소 씨앗을 뿌리고 싶다는 아버지의 말은 ‘빈손’으로 갈 수 없다는 가장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이고 절규다. “뭔가 남겨야 한다. 자식들이 나를 우습게 알지만 내 장례식에 사람들이 몰려오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아이들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례식에서 그를 보낸 사람은 결국 가족뿐이다. 마지막 장면은 가방을 든 아버지의 첫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아내의 말처럼 그의 죽음은 ‘출장 간 느낌’이다. 세일즈맨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삶’이다. 다음 달 9일까지 수 목 금요일(오후 7시 반), 토요일(오후 5시) 공연된다. 053-606-6323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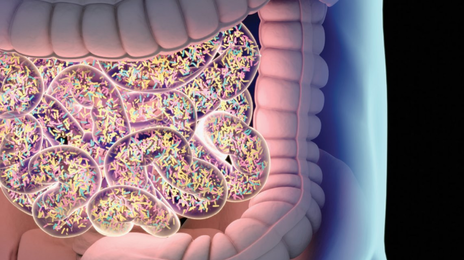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