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신나는 공부]미국 유학 성공의 관건, ‘REAL ENGLISH’를 입에 익혀라!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하버드대 우등으로 졸업한 박원희 씨
농담… 최신 유행어… 속사포 강의…
‘현지 영어’ 안되면 외톨이 신세
자존심 철저히 버리고
파티-동아리 등 적극 참여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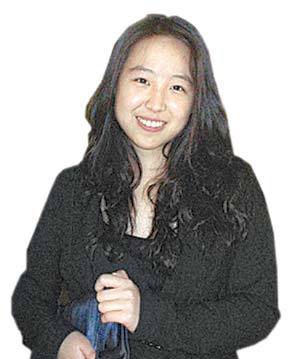
이맘때쯤이면 3, 4월 발표될 해외 명문대의 합격소식을 기다리는 고3 학생이 적지 않다. 특히나 외국어고나 자립형사립고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토플이나 미국식 대학수학능력시험(SAT)에서 고득점 한 학생이라면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하리라는 자신감에 넘쳐있다.
유학생활, 과연 그들의 꿈처럼 순탄할까? 해외 유수대학에 합격하고도 적응에 실패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귀국하는 학생이 부지기수다. 그들의 문제는 ‘학문영어’가 아닌 ‘현지영어’에서 시작된다. 이런 문제는 문화적 장벽 전반으로 심화된다. 대학 1학년 때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학생활은 더 어려워진다.
해외 명문대 유학엔 어떤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뭘 해야 할까.
박 씨는 대학 입학 후 첫 1년이 유학생활의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한다. 해외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박 씨의 혹독했던 ‘하버드대 적응기’를 직시하자. 유학생활은 장밋빛이 아니다. 생존 그 자체다.
“너 영어 못해? 하버드대는 어떻게 들어왔어?”
하버드대에 입학한 박 씨가 기숙사를 함께 쓰는 미국인 남학생에게 들은 말이다. 특히 해외 명문대는 영어에 서툰 유학생을 관대하게 받아주지 않는다.
박 씨가 말하는 ‘영어실력’이란 단순히 영어로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능력이 아니다. 현지인과 농담을 주고받거나 최신 유행어를 재빨리 알아듣고 재치 있게 받아치는, 이른바 ‘소통의 능력’을 뜻한다. 또래 사이에선 세계 문화와 역사는 물론이고 유치원생들이 보는 만화부터 최신 히트곡까지 현지인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대화가 시종일관 오고간다. 이를 모르는 한국 유학생들은 대화에서 소외되기 일쑤다. 대화에 동참할 수 없으니 친구 사귀기란 더 어려워진다. 강의시간에 교수가 영어로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내용도 전부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있다.
박 씨는 학교식당을 ‘사교의 장’으로 삼았다. 또래 학생들로 붐비는 저녁시간의 학교식당은 현지인들과 뒤섞일 절호의 공간이었다. 그는 매일 저녁 학교식당에서 두 시간동안 식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식사를 천천히 하면서 옆 친구들의 대화에 끼어들기 위해서였다. 친구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을 할 때도 일단 경청했다. 눈치껏 따라 웃고 “근데, 아까 한 말, 뜻이 뭐야?”라고 되물으면서 현지 영어와 문화를 하나씩 익혔다. 친구의 기숙사 방에 찾아가 미국 드라마를 함께 보며 얘기를 나눴다. 동아리 활동에도 일주일에 8시간 넘게 투자했다.
박 씨는 “미국 사람들이 즐겨보는 만화, 즐겨듣는 음악, 인기 연예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면 현지적응에 도움이 된다”면서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 영화, 드라마, 뉴스를 보면서 ‘진짜 영어’를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업 부담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 과목별로 매 시간 과제가 주어지는데, 대부분 100∼200쪽에 달하는 서적을 읽고 에세이를 쓰는 식의 숙제가 주어진다. 박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밤을 꼬박 새워야 했다. 에세이 주제가 주어지는 대신 책에서 학생이 스스로 뽑아내야 하므로 영어쓰기에 서툰 데다 스스로 주제를 찾는 자기주도력이 약한 한국학생들은 애를 먹기 십상이다.
5, 6명이 스터디그룹을 짜서 읽기 과제의 분량을 나누고 토론하면서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끝낼 수 없는 과제도 많다. 결국 현지인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그들과 친분을 쌓고 인맥을 만들지 못하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팀워크에 약한 한국 유학생들이 그만큼 취약한 이유다.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결정적인 ‘무기’로 박 씨는 자신감을 제안했다. 박 씨는 열등감을 갖고 위축되기보단 현지인 친구들에게 “난 ○○만큼은 잘한다”면서 자신을 당당히 보여줬다. 영어실력은 서툴지만 움츠러들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먼저 함께 공부하자고 제의했다.
“이런 수업환경에 빨리 익숙해지지 않으면 낙오될 수밖에 없어요. 신입생 때 현지에서 쓰는 진짜 영어를 온몸으로 익히도록 노력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파티에 참석하면서 꾸준히 인맥을 쌓는 게 유학생활 성공을 위한 핵심 ‘키(key)’예요.”(박 씨)
이혜진 기자 leehj08@donga.com
트렌드뉴스
-
1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2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3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4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5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6
‘대륙의 아이콘’서 밉상된 구아이링, “中 위해 39개 메달 땄다. 당신은?”
-
7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8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9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10
“한동훈 티켓 장사? 김어준은 더 받아…선관위 사전 문의했다”[정치를 부탁해]
-
1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2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8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9
李, 국힘 직격 “망국적 투기 옹호-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이제 그만”
-
10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트렌드뉴스
-
1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2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3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4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5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6
‘대륙의 아이콘’서 밉상된 구아이링, “中 위해 39개 메달 땄다. 당신은?”
-
7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8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9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10
“한동훈 티켓 장사? 김어준은 더 받아…선관위 사전 문의했다”[정치를 부탁해]
-
1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2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8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9
李, 국힘 직격 “망국적 투기 옹호-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이제 그만”
-
10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