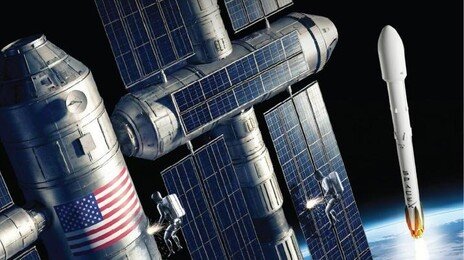공유하기
[홍찬식 칼럼]교육복지 정책은 만능 아니다
-
입력 2009년 8월 13일 20시 12분
글자크기 설정

제도가 저절로 공부시켜주진 않아
이 대통령은 교육 복지에 남다른 열정이 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17조 원을 서민층을 위한 교육 복지에 투입하겠다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과거 어느 정권도 시도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등록금 지원제도에다 얼마 전 농촌 학생들에게 ‘100% 면담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 이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없어 보인다. 이런 제도가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길을 다소간 넓혀줄 것이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일은 간단치 않다. 공부를 잘하고 못 하는 데는 경제적 요인 이외에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한국인 2세 고등학생들은 전체의 50%가 A학점을 받는다. 반면에 같은 지역 흑인 고교생이 A학점을 받는 비율은 12.8%에 불과했다.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대의 루벤 럼버트 교수가 조사한 결과다. 이런 격차는 가정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인 2세 학생은 87%가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성장했다. 흑인 학생이 부모와 같이 사는 비율은 44.6%에 그쳤다.
최근 일본에서 나온 연구 결과는 암담한 느낌마저 갖게 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생활습관을 조사했더니 성적이 상위 4분의 1 안에 드는 학생의 부모는 책과 신문을 읽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반면에 성적이 낮은 학생의 부모는 TV를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릴 적부터 책을 많이 읽는 환경에서 자라야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국에도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 공부를 잘하려면 경제력의 유무를 떠나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도 같을 것이다. 이런 태생적 불리함, 출발선의 차이가 사회 제도를 통해 얼마나 극복될 수 있을지 솔직히 회의적이다.
이 문제를 놓고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택한 방식은 ‘직접 화법’이었다. 지난달 그는 흑인 부모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집 안에 게임기를 치우고 아이들의 취침 시간을 관리하라’ ‘학부모 모임에 참가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숙제를 도와주라’고 충고했다. 흑인 아이들에게는 ‘환경이 안 좋은 것이 나쁜 성적과 수업을 빼먹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백인 학생보다 불리한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스스로 최선 다하라” 다그친 오바마
미국은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도의 원조이며 소외계층 배려에서는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럼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저소득층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한계가 있음을 간파하고 쓴소리를 한 것이다. 듣는 사람은 불편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이었음이 분명하다.
교사들에 따르면 요즘 저소득층 학생들은 환경의 차이에 쉽게 기가 꺾이고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교사뿐 아니라 국가지도자는 이들에게 현실적 동기를 부여하고 잠자고 있는 꿈을 일깨워줄 책임이 있다. 쉽게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보다는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아픈 충고가 더 약이 될 성싶다. 그래야 저소득층을 위한 다른 제도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우리 지도자도 각계각층 국민에게 “두 유어 베스트(Do your best)!”를 주문해야 나라와 개인의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다.
홍찬식 수석논설위원 chansik@donga.com
트렌드뉴스
-
1
“불륜으로 성병 걸린 빌게이츠, 엡스타인에 SOS” 문건 공개
-
2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3
자유를 노래하던 ‘파랑새’가 권력자의 ‘도끼’로…트위터의 변절
-
4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5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6
소니 집어삼킨 TCL, 다음 목표는 삼성-LG… 중국의 ‘TV 굴기’
-
7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8
이란 남부 항구도시 8층 건물서 폭발…“원인 불명”
-
9
‘텍스트 힙’ 넘어 ‘라이팅 힙’으로… 종이와 책 집어드는 2030
-
10
‘두쫀롤’이 뭐길래…새벽 오픈런에 ‘7200원→5만원’ 되팔기까지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4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5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6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7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8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9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10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트렌드뉴스
-
1
“불륜으로 성병 걸린 빌게이츠, 엡스타인에 SOS” 문건 공개
-
2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3
자유를 노래하던 ‘파랑새’가 권력자의 ‘도끼’로…트위터의 변절
-
4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5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6
소니 집어삼킨 TCL, 다음 목표는 삼성-LG… 중국의 ‘TV 굴기’
-
7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8
이란 남부 항구도시 8층 건물서 폭발…“원인 불명”
-
9
‘텍스트 힙’ 넘어 ‘라이팅 힙’으로… 종이와 책 집어드는 2030
-
10
‘두쫀롤’이 뭐길래…새벽 오픈런에 ‘7200원→5만원’ 되팔기까지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4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5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6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7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8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9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10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스타기상도/흐림]연예인들 부정입학 파문 확산](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0/12/27/680378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