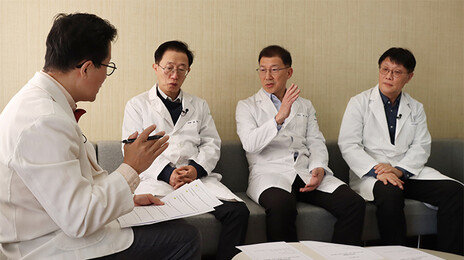공유하기
하루 3000원 벌이 ‘지하의 삶’…놓칠수 없는 ‘희망의 끈’
-
입력 2009년 1월 23일 02시 58분
글자크기 설정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에 맞닿아 있는 지하철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폐휴지 가격이 4분의 1 정도로 떨어졌음에도 신문을 줍기 위해 지하철에 나오는 노인들은 늘어만 간다. 지하철 내 상인들은 단돈 1000원짜리 생필품을 팔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날이 어두워지면 멀쩡해 보이던 사람도 지하철역에 박스를 깔고 차가운 바닥에 몸을 누인다. 기자는 21일 첫차부터 막차가 끊어질 때까지 하루 동안 서울 지하철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살펴봤다. 불황의 고통은 서민들의 삶에 예상보다 더 깊게 스며들어 있었다. 설을 앞둔 설렘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07:00, 신문 수거 노인들 “이거라도 주워야지…”
14:00, 먼지떨이 판매상 “경쟁자 늘고 수입은 뚝”
22:00, 술병 든 노숙자 “인력시장 가도 허탕만”
오전 5시 반경.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플랫폼에 방화행 첫차가 들어왔다. 아직 한산한 지하철엔 몇 사람만이 앉아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지하철 2호선 시청방향으로 갈아타 6시가 넘으니 사람들이 서서히 늘어났다. 일찍 출근길에 나선 회사원 양영우(35) 씨는 “최근 지하철 이용객이 증가한 데다 불황 때문에 다들 더 긴장을 하는지 직장인들 출근시간이 전반적으로 빨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오전 7시가 넘었다. 직장인들의 출근물결이 거세지자 시민들이 보고 버린 신문을 모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손길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무가지가 쌓여가자 노인들은 선반 위 신문들을 수레, 배낭, 마대 등에 쓸어 담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 노인들이 아침시간 꼬박 신문을 모아서 버는 돈은 2000∼3000원 안팎에 불과하다. 국내 경기침체로 폐지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제지업체가 생산량을 줄이는 바람에 1kg에 200원 하던 폐휴지가 40∼50원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하방에 혼자 살며 신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종순(70·여) 씨는 “요즘은 폐휴지 가격이 뚝 떨어져 반찬값도 안 나온다”며 “할 것 없는 노인은 물론 일 없어 노는 젊은 사람들까지 나서 갈수록 지하철에서 신문 줍기도 힘들어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출근 행렬과 폐휴지 수거 노인들의 ‘신문 줍기 전쟁’이 잦아든 오전 11시경. 1호선 인천행 지하철은 한결 한가로워졌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자 생계를 위해 지하철을 누비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바로 지하철 객차 안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다.
오후 2시 10분경 1호선 시청역 플랫폼에서 마주친 먼지떨이 판매상은 “요즘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20% 정도 늘어난 것 같다”며 “하도 상인들이 많다보니 때로는 다른 상인 없는 차량을 기다리며 열차를 몇 대씩 그냥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워낙 경기가 어려워 장사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판매 품목도 CD, 조명 등에서 장갑, 스타킹 등의 1000원짜리 생필품으로 단순화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지갑을 꼭꼭 닫아 장사는 쉽지 않아 보였다.
2호선 시청역 가판대에서 신문을 판매하는 조옥난(66·여) 씨는 “요즘은 사람들이 몇백 원짜리 신문 한 부를 살 때조차도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고민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오후 10시경 1호선 종각역. 역사는 노숙인들의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박스로 잠자리를 만들어 몇몇 노숙인이 잠을 청하는 가운데 일부는 구석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술자리에 끼어 말을 붙이자 한 노숙인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며 “인력시장에 아침마다 가지만 다 공치고 돌아온다”며 소주 한잔을 들이켰다.
종각역 지하상가에서 경비를 보고 있는 임명수(67) 씨는 “확실히 불경기라 그런지 노숙인이 늘었다”며 “겉보기에는 말끔해 보이는 사람들이 여기서 자고 아침이면 일어나 나간다”고 말했다. 막차는 끊겨도 뒷 정리를 해야 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바쁜 모습이었다. 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부지런히 순찰을 돌던 종각역 공익근무요원은 역 입구에 쓰러진 한 남성을 발견하고선 일으키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막차를 놓친 뒤 역을 빠져나가던 김영화(45·여)씨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선 “노숙자들이나 취객들을 보면 마음이 짠하다”며 “설만이라도 걱정 없이 보내야 할 텐데…”라고 말을 흐리며 발걸음을 돌렸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dongA.com 뉴스스테이션에 동영상
이 기사의 취재에는 본보 대학생 인턴기자 임지현(22·서울대 사회교육과 3학년) 씨가 참여했습니다.
트렌드뉴스
-
1
李 “北, 南에 매우 적대적 언사…오랜 감정 일순간에 없앨순 없어”
-
2
“남편 암 눈치챘던 애견, 이번엔 내 가슴 쿡쿡…유방암 발견”
-
3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후임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
4
中텐센트 AI, 작업수정 5차례 지시했더니 “개XX” 욕설 내놔
-
5
與지도부 일각 “계양을로 이사한 송영길 성급했다”
-
6
BTS 정국, 심야에 취중 라방…“답답하고 짜증나” 불만 쏟아내
-
7
강남3구·용산 집값 떨어졌다…다주택자 매물 하락 거래
-
8
K팝 걸그룹에 손등 키스…룰라가 반색한 아이돌 누구?
-
9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10
국힘 중진들 장동혁에 쓴소리…윤상현 “속죄 세리머니 필요”
-
1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2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
3
李 “인천공항서 지방공항 가려면 ‘김포’ 거쳐야…시간 너무 걸려”
-
4
한미동맹 잇단 엇박자… 야외 기동훈련도 공개 이견
-
5
李 “저도 꽤 큰 개미였다…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 복귀”
-
6
“2살때 농지 취득 정원오 조사하라” vs “자경의무 없던 시절”
-
7
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막판 부랴부랴 수정…본회의 상정
-
8
[송평인 칼럼]‘빙그레 엄벌’ 판사와 ‘울먹이는 앵그리버드’ 판사
-
9
추미애 “법왜곡죄 위헌이라 왜곡말라…엿장수 판결 두고 못봐”
-
10
서울 구청장 예비후보, 민주 35명 등록-국힘은 13명 그쳐
트렌드뉴스
-
1
李 “北, 南에 매우 적대적 언사…오랜 감정 일순간에 없앨순 없어”
-
2
“남편 암 눈치챘던 애견, 이번엔 내 가슴 쿡쿡…유방암 발견”
-
3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후임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
4
中텐센트 AI, 작업수정 5차례 지시했더니 “개XX” 욕설 내놔
-
5
與지도부 일각 “계양을로 이사한 송영길 성급했다”
-
6
BTS 정국, 심야에 취중 라방…“답답하고 짜증나” 불만 쏟아내
-
7
강남3구·용산 집값 떨어졌다…다주택자 매물 하락 거래
-
8
K팝 걸그룹에 손등 키스…룰라가 반색한 아이돌 누구?
-
9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10
국힘 중진들 장동혁에 쓴소리…윤상현 “속죄 세리머니 필요”
-
1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2
김정은 “한국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동족서 영원히 배제”
-
3
李 “인천공항서 지방공항 가려면 ‘김포’ 거쳐야…시간 너무 걸려”
-
4
한미동맹 잇단 엇박자… 야외 기동훈련도 공개 이견
-
5
李 “저도 꽤 큰 개미였다…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 복귀”
-
6
“2살때 농지 취득 정원오 조사하라” vs “자경의무 없던 시절”
-
7
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막판 부랴부랴 수정…본회의 상정
-
8
[송평인 칼럼]‘빙그레 엄벌’ 판사와 ‘울먹이는 앵그리버드’ 판사
-
9
추미애 “법왜곡죄 위헌이라 왜곡말라…엿장수 판결 두고 못봐”
-
10
서울 구청장 예비후보, 민주 35명 등록-국힘은 13명 그쳐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