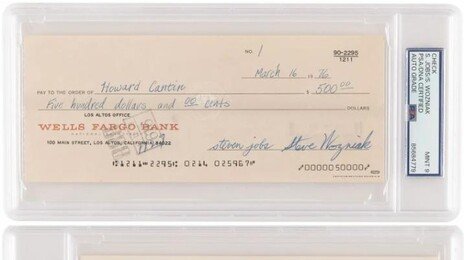공유하기
[동아광장]남찬순/北이 ‘상봉행사’ 꺼리는 이유
-
입력 2001년 10월 12일 18시 40분
글자크기 설정

서울에 무슨 엄청난 위기상황이라도 발생한 것처럼 느닷없이 방문일정을 보류하겠다는 북측의 속내는 뭘까. 정말 지금 정세로는 ‘남조선’에 마음놓고 갈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일까. 여전히 테러리스트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그들로서는 마침 테러와의 전쟁이 격렬한 때여서 방문단을 남으로 내려보내는 일이 마음에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북측은 9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자면서 남측에 최종 상봉자 명단을 통보했다. 말하자면 9일이나 지금이나 아프가니스탄 전황과 ‘남조선의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불과 사흘 사이에 북측의 마음만 변한 셈이다.
▼여전히 정치적 차원서 계산▼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북한이 마음 내켜 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들은 그동안 “이산가족 문제는 통일이 되면 자연히 해결된다”며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래서 뒤늦게 “잘됐다” 싶어 ‘남조선의 위기상황’을 핑계로 ‘상봉행사’를 뒤로 미루는 것은 아닐까.
북한은 여전히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이 아닌, 정치적 차원에서 생각한다. 70년대 초반 이산가족상봉문제가 남북한 간에 처음 논의될 때 북측은 우선 ‘요해(了解)사업’부터 하자고 제의했다. 남북한이 각자 적십자요원을 상대방의 면 단위지역까지 내려보내 이산가족 상봉사업의 취지를 설명토록 하자는 것이었다. ‘요해사업’ 요원을 파견해 남한 사회를 흔들어 보자는 속셈이었다. 남측이 ‘그렇게 하자’고 맞장구를 치자 이번에는 느닷없이 조건환경개선론을 들고 나왔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등 주변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우여곡절을 겪다가 85년 9월 처음으로 이산가족 교환 방문이 성사됐지만 그 행사에도 정치색이 짙게 깔려 있었다. 고향방문단 50명에 예술공연단이 50명이었다. 그 뒤 ‘상봉행사’는 북측이 혁명가극 ‘꽃 파는 처녀’의 남한 공연을 주장하는 바람에 흐지부지됐다.
90년대 후반부터 북측은 ‘상봉행사’를 어떤 ‘대가성 카드’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북측은 98년 남측의 끈질긴 이산가족상봉 요구에 먼저 비료부터 달라고 요구한다.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남측의 절실한 요구를 들어 주는 대신 남측도 그에 상응한 보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북측이 자기들 체제에 대해 갖는 불안감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또 다른 장애다. 이산가족 교류로 인한 자본주의 물결의 침투, 북한지도부는 그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작년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마지못해 응한 세 차례 상봉행사만 봐도 그런 징후는 곳곳에 나타난다.
지난번 북에서 온 상봉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그쪽 사회의 지도급이다. 북한체제의 혜택을 받은, 선택된 사람들만 왔다. 남쪽사람들이야 어떻게 보든 ‘장군님 은혜’를 외치는 그들의 태도는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철저히 검증받고 서울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체제에 대한 불안감 드러내▼
그러다 보니 북측으로서는 상봉행사의 인적 자원에 문제가 생겼다. 아직도 북한에서는 남한출신임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남한과 연관되면 뭔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심리가 여전하다고 한다. 또 웬만한 남한출신 인사들은 이미 서울을 한 차례씩 다녀왔다. ‘상봉요원’을 선발하는 자체가 북한당국에는 점차 어려운 작업이 되고 있다는 게 북한 사정을 비교적 잘 읽고 있는 사람들의 분석이다.
그러니 ‘상봉행사’를 행사로만 끝나게 하지 말고 정례화 제도화하자, 한번에 몇 천명씩 만나게 하자, 면회소를 설치하고 편지를 교환하도록 하자는 남측 주장이 북한 당국의 귀에 들어가겠는가.
이제는 다 준비된 100명 상봉행사마저 보류하겠다고 한다. 지금으로서는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북측의 기본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별다른 묘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가슴만 답답할 뿐이다.
chansoon@donga.com
트렌드뉴스
-
1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2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3
홍석천 “부동산에 속아 2억에 넘긴 재개발 앞둔 집, 현재 30억”
-
4
인간은 구경만…AI끼리 주인 뒷담화 내뱉는 SNS ‘몰트북’ 등장
-
5
한국인의 빵 사랑, 100년 전 광장시장에서 시작됐다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8
‘역대급 실적’ 은행들, 최대 350% 성과급 잔치…金 단축 근무도
-
9
美 수출 막힌 中 전기차, 중남미-캐나다 車 시장 휩쓸어
-
10
0.24초의 기적…올림픽 직전 월드컵 우승 따낸 ‘배추 보이’ 이상호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5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6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10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트렌드뉴스
-
1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2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3
홍석천 “부동산에 속아 2억에 넘긴 재개발 앞둔 집, 현재 30억”
-
4
인간은 구경만…AI끼리 주인 뒷담화 내뱉는 SNS ‘몰트북’ 등장
-
5
한국인의 빵 사랑, 100년 전 광장시장에서 시작됐다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8
‘역대급 실적’ 은행들, 최대 350% 성과급 잔치…金 단축 근무도
-
9
美 수출 막힌 中 전기차, 중남미-캐나다 車 시장 휩쓸어
-
10
0.24초의 기적…올림픽 직전 월드컵 우승 따낸 ‘배추 보이’ 이상호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5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6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10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