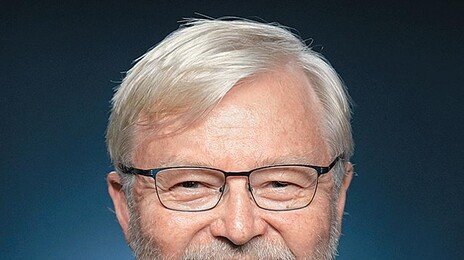공유하기
[사설]‘후배가 대법관 되면 선배 사퇴’는 낡은 관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6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올해 말까지 2명의 대법관이 바뀌고 내년에 또 대법관 4명이 교체된다. 기존 관행대로라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법원장급의 대거 사퇴가 예상된다. 법원장은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오랜 경륜을 쌓은 법관이다. 이들이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 50대 중후반에 나가버리면 법원의 역량은 큰 타격을 입는다. 옷을 벗은 선배 판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면 현직의 후배 판사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의 폐단도 뒤따른다. 기수 문화는 낡은 관료주의 유산으로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조직 관행과 무관치 않다. 이런 문화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헌법으로 보장된 사법부에도 남아 있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지법합의부 배석판사→지법 단독판사→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고법 부장판사→법원장→대법관으로 올라가는 판사 계급의 사다리를 개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물론 평생법관제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승진 자리를 원하는 후배들의 보이지 않는 사퇴 압력을 감수한다고 해도 법원장을 하다가 옮길 자리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2004년 최병학 당시 수원지법원장이 자원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가는 순환보직제가 처음 시행됐으나 이후 흐지부지됐다. 법원장을 끝내고 내려오더라도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 판사에게 평생법관이 되기 위한 유인(誘因)은 커지고 있다. 11월부터 전관예우 금지법이 시행되면 퇴직 후 1년간은 직전 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보수를 많이 주는 로펌에도 갈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이주의 PICK
구독
-

글로벌 현장을 가다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트렌드뉴스
-
1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2
특검 내부선 ‘무기징역’ 다수의견…조은석이 ‘사형 구형’ 결론
-
3
[사설]참 구차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
4
차 창문 내리자 또 다가와 손잡아…다카이치 ‘극진한 환송’
-
5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6
美, 마두로 체포때 러 방공시스템 ‘먹통’…창고에 방치돼 있었다
-
7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8
‘119년 전통’ 광주 중앙초교, 올해 신입생 0명 충격
-
9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10
“제명 승복해야” “억울해도 나가라”…與, 김병기 연일 압박
-
1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2
특검 “尹, 권력욕 위해 계엄… 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
3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4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5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6
[사설]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
7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
8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9
[속보]한동훈 “윤리위 제명 결정, 또다른 계엄 선포…반드시 막을 것”
-
10
특검 내부선 ‘무기징역’ 다수의견…조은석이 ‘사형 구형’ 결론
트렌드뉴스
-
1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2
특검 내부선 ‘무기징역’ 다수의견…조은석이 ‘사형 구형’ 결론
-
3
[사설]참 구차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
4
차 창문 내리자 또 다가와 손잡아…다카이치 ‘극진한 환송’
-
5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6
美, 마두로 체포때 러 방공시스템 ‘먹통’…창고에 방치돼 있었다
-
7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8
‘119년 전통’ 광주 중앙초교, 올해 신입생 0명 충격
-
9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10
“제명 승복해야” “억울해도 나가라”…與, 김병기 연일 압박
-
1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장동혁호 ‘뺄셈 정치’ 가나
-
2
특검 “尹, 권력욕 위해 계엄… 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
3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
4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
5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
6
[사설]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
7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
8
[단독]김경 “1억원 줄때, 강선우도 함께 있었다” 자수서
-
9
[속보]한동훈 “윤리위 제명 결정, 또다른 계엄 선포…반드시 막을 것”
-
10
특검 내부선 ‘무기징역’ 다수의견…조은석이 ‘사형 구형’ 결론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韓日 ‘훈풍 속 더딘 협력’… 민심의 공감대 더욱 넓혀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13/13315157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