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화문에서/박현진]600년 만에 부활한 ‘鄭和원정대’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국내 금융회사의 채권 딜링룸에는 최근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한국 국채(國債)를 사겠다는 외국 투자자들의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7월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채권 수요가 몰려 값이 오르면서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한국만은 아니다. 일본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잃어버린 10년’을 다시 떠올릴 정도로 처참했지만 경제성적을 반영한다는 통화가치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엔화 가치는 지난주 15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 이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달러와 미 국채를 사재기하면서 미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중국이 미 국채와 달러를 팔아치우면서 미국 경제를 보이지 않게 압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국가들의 경제 움직임에는 한결같이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이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현상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 및 역사학자들은 600여 년 전 환관 출신인 중국의 정화(鄭和)가 대함대를 이끌고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동부까지 세력을 넓혔던 세계 원정이 부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15세기 초(1405∼1433년) 정화의 원정과 21세기 초 중국의 대약진은 그러나 최소 두 가지 점에서 다른 듯하다. ‘문명과 바다’의 저자인 주경철 서울대 교수(서양사학)는 당시 정화의 대원정군이 항로를 중국으로 다시 틀지 않았더라면 200여 년에 걸친 서양 중심의 세계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당시 정화 원정대는 “중국은 해외에 나갈 필요 없이 내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명(明) 왕조의 쇄국정책에 따라 눈물을 머금고 귀환해야 했다. 21세기 중국은 최근의 행보를 되돌릴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첫 번째 차이다.
중국은 주체할 수 없는 달러를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과 소비시장’을 넘어 글로벌 금융 및 자산시장에서도 G2로 등극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이 같은 변곡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을까. 불행히도 한국의 금융회사와 기업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뒷걸음치고 있는 것 같다. 금융회사들은 중국에 기껏해야 연락사무소 1, 2곳을 둘 뿐이다. 선진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대(對)중국 FDI 비중은 2004년(10.3%)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올 상반기 현재 2.8%로 급감했다.
정화가 대해양을 누비고 당시 세계통화였던 은(銀)이 중국으로 몰릴 때 조선의 해외 수출품은 인삼 등 손에 꼽을 정도였다. 당시 세계경제의 흐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재빨리 보폭을 넓혔더라면 2010년 한국은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한다. 또 되풀이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쉬운 역사를 되풀이할거냐 말거냐는 선택의 문제다. 중국은 이미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것 같다.
박현진 경제부 차장 witness@donga.com
광화문에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고양이 눈
구독
-

이준식의 한시 한 수
구독
-

알쓸톡
구독
트렌드뉴스
-
1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2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3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4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5
이혜훈 “비망록 내가 쓴것 아냐…누군가 짐작·소문 버무린 것”
-
6
압수한 비트코인 분실한 檢… 수백억대 추정
-
7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8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9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10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치나…현 환율로 韓 135억 달러 많아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3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4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5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6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7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8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9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10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트렌드뉴스
-
1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2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3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4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5
이혜훈 “비망록 내가 쓴것 아냐…누군가 짐작·소문 버무린 것”
-
6
압수한 비트코인 분실한 檢… 수백억대 추정
-
7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8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9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10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치나…현 환율로 韓 135억 달러 많아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3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4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5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6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7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8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9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10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장윤정]아틀라스가 던진 미래 향한 ‘불편한’ 질문](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22/133214574.1.jpg)
![추워서 감기 걸렸다? 알고 보니 ‘착각’ [건강팩트체크]](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216134.3.thumb.jpg)
![‘할머니 김장 조끼’에 꽂힌 발렌티노…630만원 명품 출시 [트렌디깅]](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215453.1.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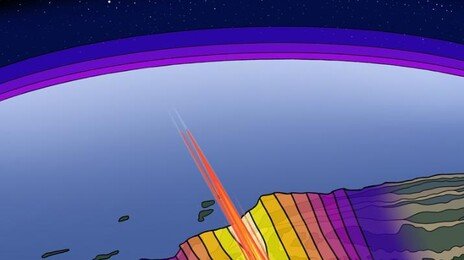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