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김순덕 칼럼]행복하지 않을 자유
-
입력 2008년 1월 4일 03시 01분
글자크기 설정

올해도 그랬다. 그 나라에서 사상 첫 선거가 치러졌다는 보도가 나온 날, 지하철에서 한 청년이 옆 친구를 쿡 찌르며 물었다. “너 부탄에 선거도 없었다는 거 알았어?”
권력의 행복이 국민의 행복?
부탄엔 선거뿐 아니라 정치인도, 정당도 없다. 민주화단체는 추방당했고, 차별과 탄압에 시달리다 쫓겨난 네팔계 10만 명은 18년째 네팔 난민촌에서 비참한 삶을 산다. 여기까지 알고 나면, 아무리 왕과 승려들이 “내적 행복이 참행복”이라고 외쳐왔대도 더는 순수하게 봐주기 힘들어진다. 행복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진정 행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행복이 내적 기준에 달렸다는 건 맞다. 하지만 국민의 3분의 1이 빈곤층 이하인데도 내적 행복만이 참이라는 권력층을 모셔야 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나라 유일의 일간지 쿠엔셀은 신년호에서도 “부탄은 공평하게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이상적 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7세의 젊은 왕은 영국 옥스퍼드대를 나왔는데 국민의 절반이 글을 못 읽는다는 걸 알게 되면 행복지수를 만든 저의까지 궁금해진다.
역사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된들 뭐 하느냐던 대통령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는 차기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1, 2점 때문에 울고 웃는 게 안타까워 수능 등급제를 했다”며 평등정책에 강한 집착을 드러냈다.
미안하지만 울고 웃는 것도, 무엇이 행복인지도 사람마다 시대마다 달라지는 추세다. 197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터린이 “소득증가가 행복을 증가시키는 건 아니다”고 발표한 이래, 경제성장과 행복이 같이 가지 않는다는 ‘행복의 패러독스’가 금과옥조처럼 여겨졌지만 이젠 다르다.
2006년 갤럽의 130개국, 퓨리서치의 50개국, 미시간대의 80개국 조사는 잘사는 나라일수록 대부분이 행복하다고 답했다. 와튼스쿨의 경제학자 저스틴 울퍼스는 이스터린의 연구를 되짚으면서 “소득 증가가 행복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소득은 행복과 연관된다는 강한 증거가 있다”고 했다.
물론 소득보다 일자리가, 문화가, 심지어 유전자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끊임없이 나온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어떤 권력도 행복의 기준을 제시할 순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국민이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보장하고 기회를 넓혀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회적 안전망은 그래서 중요하다.
TV 채널이 많아져도 시청의 즐거움이 커지진 않는 것처럼, 선택의 폭이 커진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래도 기본적 채널은 보장하는 게 정부의 일이다. 채널을 돌리다 피곤해지든 아예 TV를 안 보든, 선택과 책임은 각자에게 달렸다. 이 이상 개입하는 정부는 이젠 정말 떨쳐버리고 싶은 전체주의, 권위주의 정부와 다를 바 없다.
각자의 선택과 책임에 맡겨야
우리가 원하든 말든 세계는 자유화, 민영화로 달리고 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세계노동인구가 30억 명으로 뛰어오르면서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 경쟁시대다.
새 정부가 자율과 경쟁으로 경제 살리기의 길은 터주겠다지만 그건 행복을 추구할 기회만 넓혀 줄 뿐이다. 성장동력을 기업 스스로 찾아야 하듯 개개인의 행복 역시 정부가 키워 줄 수도 없고 키워 주겠다고 나서도 곤란하다. 소득 3만 달러이든 수능 점수 1, 2점이든,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그걸 추구할지 말지 또한 각자의 선택과 책임에 달렸다.
김순덕 편집국 부국장 yuri@donga.com
새 비디오 >
-

샌디에이고 특별전 맛보기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정치를 부탁해
구독
트렌드뉴스
-
1
몸에 좋다던데…부자들이 피하는 ‘건강식’ 5가지
-
2
이동국 세 딸 일본 미녀 변신…“행복했던 삿포로 여행”
-
3
임성근 “전과 6회있어…손녀 등 가족 비난은 멈춰달라”
-
4
러시아 폭설의 위력…아파트 10층 높이 쌓여 도시 마비
-
5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의지, ‘이 사람’이 불씨 지폈다[지금, 이 사람]
-
6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7
롤스로이스 끌고다니던 아파트 주민… 알고보니 ‘1.5조 돈세탁’ 총책이었다
-
8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9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10
“트럼프 싫다”… ‘MANA’ 외치는 그린란드 주민들
-
1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2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3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4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5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
6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
7
李 “일부 교회, 설교때 이재명 죽여야 나라 산다고 해”
-
8
李 “정교유착, 나라 망하는길…‘이재명 죽여라’ 설교하는 교회도”
-
9
덴마크 언론 “폭력배 트럼프”… 英국민 67% “美에 보복관세 찬성”
-
10
21시간 조사 마친 강선우 ‘1억 전세금 사용설’ 묵묵부답
트렌드뉴스
-
1
몸에 좋다던데…부자들이 피하는 ‘건강식’ 5가지
-
2
이동국 세 딸 일본 미녀 변신…“행복했던 삿포로 여행”
-
3
임성근 “전과 6회있어…손녀 등 가족 비난은 멈춰달라”
-
4
러시아 폭설의 위력…아파트 10층 높이 쌓여 도시 마비
-
5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의지, ‘이 사람’이 불씨 지폈다[지금, 이 사람]
-
6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7
롤스로이스 끌고다니던 아파트 주민… 알고보니 ‘1.5조 돈세탁’ 총책이었다
-
8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9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10
“트럼프 싫다”… ‘MANA’ 외치는 그린란드 주민들
-
1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2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
3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4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
5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
6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
7
李 “일부 교회, 설교때 이재명 죽여야 나라 산다고 해”
-
8
李 “정교유착, 나라 망하는길…‘이재명 죽여라’ 설교하는 교회도”
-
9
덴마크 언론 “폭력배 트럼프”… 英국민 67% “美에 보복관세 찬성”
-
10
21시간 조사 마친 강선우 ‘1억 전세금 사용설’ 묵묵부답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새비디오]「단짝친구들」/청춘남녀의 사랑과 배신](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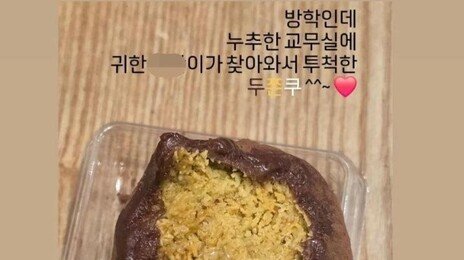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