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내 맘속의 별]카피라이터 최인아의 어깨 펴준 소설가 강석경
-
입력 2007년 1월 13일 02시 57분
글자크기 설정


스물일곱 무렵 시작된 그와의 끈은 서른을 거쳐 마흔이 넘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어져 그의 신간이 나올 때마다 사 본 책들이 전부 1쇄다. 몇 년 전 조희봉이라는 사람이 이윤기 선생을 좋아해 그의 작품은 모조리 읽고 그 얘기를 ‘전작주의자(全作主義者)의 꿈’이라는 책으로 펴냈는데, 나야말로 강석경의 전작주의자를 자처할 만하다.
그를 만나 본 적은 없다. 그저 소설에 실린 작가의 사진이 내가 본 그의 모습 전부다. 하지만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진을 보는 것으로 족하다. 그런 글을 쓸 것 같은 사람이다. 늘 본질에 눈이 가 닿고 표면은 차가우나 안은 슬픔으로 그득 차 있을 것 같은 사람.
세상이 치는 그의 출세작은 ‘숲 속의 방’일 거다. 하지만 내가 치는 그의 대표작은 1987년에 나온 ‘일하는 예술가들’이라는 인터뷰집이다. 그 책과 나의 만남은 ‘본질적’이라 할 만한데 그 무렵 나는 광고에 입문하고도 한참이나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터였다.
평생의 업으로 여겨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 카피라이터가 뭘 하는 직업인지 알지도 못했으면서 뭔가를 쓰는 일이라는 설명이 반가워 발걸음을 떼어 본 일이었다. 그조차도 그 다음 해까지 1년만을 해보겠다 작정한 시작이었다. 하지만 작정한 1년이 지나고 2년, 10년이 지나도록 나는 떠나지 못했다. 그렇게 쌓인 한 해 두 해의 시간은 결국 나의 인생이 되었고 이제 마흔다섯 나의 생은 광고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어설프게 시작해서였을까. 아니면 ‘왜’를 묻지 않고는 못 배기는 나의 성향 탓이었을까. 광고를 이생에서의 나의 일로 받아들이기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 직업의 보람이 무엇인지, 세상에 어떤 가치를 발생시키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만난 책이 강석경의 ‘일하는 예술가들’이다.
예술가 열네 분과의 인터뷰를 엮은 이 책은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것은 구도(求道)와 다름없음을 행간마다 적어 놓은 글이다. 아니다. 그 물음이 어디 예술에 국한될까. 결국 삶이란 무엇인지를, 산다는 것과 예술 한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거다.
화가 장욱진 선생 인터뷰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네가 하는 일이 불도(佛道)에서 하는 일과 똑같다. 화가는 화가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 사는 거다”라는. 장욱진을 출가시킬 마음을 접으셨다며 하신 만공 스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들에서 스물일곱 나는 위안을 얻었다. 광고를 만들고 카피를 쓰는 것 또한 구도일 수 있다는 희망을 얻고서.
이 책을 50권쯤은 샀을까. 특히 새로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읽게 했다. 지금부터 네가 가려는 카피라이터의 길은 겉은 재미있어 보여도 실은 즐거움보다 고통이 더 큰 길이라는 것, 그 과정에서 겪는 산고만큼은 예술가의 그것과 과히 다르지 않다는 것,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우리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토를 달아서.
예술과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는 작가의 물음은 다양하게 변주돼 그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된다. ‘가까운 골짜기’에서는 도예가 홍희조로, 최근작 ‘미불’에서는 화가 이평조 등 예술가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반복되고 강화되며 깊어진다.
그의 글은 소설도 좋지만 산문 또한 아름답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 읽어도 좋은 글, ‘능으로 가는 길’이라는 산문집이 있다. 이 책을 읽으며 비로소 나는 어째서 내가 그의 글들을 사모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영혼의 닮음이랄까.
누구는 이파리 무성한 여름날의 나무가 인생으로 치면 청년처럼 보기 좋다고 칭찬한다. 하지만 그 많은 이파리가 내 눈엔 번뇌로 보인다. 그러므로 ‘잎 떨군’ 11월의 빈 가지 나무야말로 내겐 번뇌를 지나 생의 정수(精髓)에 가 닿은 수도자처럼 본질 그 자체로 보인다. 그래서 나는 11월이 좋고 11월은 나의 달이다. 그의 문장도 이런 뜻을 담은 것일까. 그는 ‘능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적었다.
“첼로의 저음 같은 11월은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달이다. 화려한 단풍도 옷을 벗고 낙엽이 쌓이기 시작하는 달. 나뭇잎도 땅 빛깔과 닮아 가고 이불처럼 대지를 덮고 근원으로 돌아갈 채비를 한다. … 잎을 떨군 겨울나무는 본질만 남아 있는 것 같다. 겨울나무엔 실존의 깊이가 있다.”
이런저런 순례와 방황을 거쳐 옛 자리로 돌아올 때의 심경조차 그의 것과 같음을 느끼는데 작가는 2000년 1월 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시안(西安)행 밤 기차를 타며 이렇게 썼다. “떠남에도 지쳤지만 또 떠나자. 안주는 내 몫이 아닌 것 같지만 돌아올 곳이 있으니 이 떠남은 행복하지 않은가.”
지난해 나는 안식년을 가졌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아주 먼 데로 떠났다. 그곳에 이르자 비로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들여다보였다. 지금 나는 떠나기 전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 있지만 돌아올 때의 마음은 떠날 때와 달리 평화롭고 순하다.
생각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호흡과 무드와 취향이 같은 사람을 보면 영혼이 닮았음을 알아차린다. 내게 강석경은 그런 작가다. 긴 시간 함께 늙는 작가를 가졌다는 건 행복한 일이다. 얼굴이 닮았다는 말조차 실례가 되기 십상인데 작가에게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인아 카피라이터·제일기획 제작본부장
■ “슬픈 영혼의 작가”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 주세요’ 등의 광고카피로 유명한 최인아(사진) 제일기획 제작본부장이 작가 강석경을 생각하며 쓴 한 줄짜리 카피다.
최 씨를 인터뷰한 기자에게는 ‘최인아의 거울과 같은 작가’라는 표현이 떠올랐다. 그만큼 강석경의 작품들은 최 씨의 자아발견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올해 1월로 광고업계에 들어온 지 만 23년이 된다는 그는 원래 신문기자를 꿈꿨다고 했다. 그만큼 글쓰기에 대한 굶주림이 컸다.
“제 외모나 성격이 톡톡 튀고 도발적인 광고업계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강석경 씨의 ‘일하는 예술가들’을 읽으면서 광고도 결국은 제품의 본질에 대한 차분한 통찰에서 나올 때 빛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글쓰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그의 생각은 3년 전 라면을 열심히 먹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삼양라면 캠페인에서도 확인됐다.
그가 1991년 두 달의 휴가를 신청하고 인도여행을 떠난 것도 강석경의 인도기행문을 읽은 영향이었다.
“직장생활 하면서 두 달이나 휴가를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얌전하고 내성적인 제 성격에 일대 변화를 가져온 것이어서 주변에서 모두 놀랐죠. 인도여행은 논리에 집착하는 제 성격도 바꿔 놨어요. 하나가 옳으면 다른 하나는 그를 수밖에 없다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원성에 눈을 떴으니까요.”
‘11월을 자신의 달’로 받아들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더욱 흥미롭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릴 때도 이파리 하나 없이 벌거벗은 나목만 그렸다. 그 이유가 ‘잉여에 대한 거부와 본질에 대한 집착’에 있다는 뒤늦은 자기분석도 강석경의 작품을 읽으며 발견한 것이라고 한다.
“11월의 나무들은 텅 비어 본질에 가깝지만 그만큼 외롭고 슬프죠. 그래서인지 저는 아름다움의 본질이 슬픔에 있다고 생각해요. 강석경을 ‘슬픈 영혼의 작가’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트렌드뉴스
-
1
“과거사 사죄는 평생의 사명” 日목사…“日 정부와 국민은 달라요”
-
2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3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4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5
한국이 제빵 강국이 된 비결
-
6
엇갈리는 미군 사상자…美 “3명 전사” vs 이란 “560명 죽거나 다쳐”
-
7
“귀 안까지 찌릿”…뒤통수 통증 부르는 이 질환은?
-
8
싱가포르, 난초 교배종에 ‘이재명-김혜경 난’ 이름 붙여
-
9
트럼프 “모든 목표 달성 때까지 이란 공격…미군 죽음 복수할 것”
-
10
역대급 불황이라고? 실상은 자산 계층 중심으로 소비 확산하는 국면
-
1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2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3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4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5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
6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7
장동혁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정청래 “부럽다, 난 0주택”
-
8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9
李대통령 “국민 여러분 전혀 걱정 않으셔도…일상 즐기시길”
-
10
“과거사 사죄는 평생의 사명” 日목사…“日 정부와 국민은 달라요”
트렌드뉴스
-
1
“과거사 사죄는 평생의 사명” 日목사…“日 정부와 국민은 달라요”
-
2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3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4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5
한국이 제빵 강국이 된 비결
-
6
엇갈리는 미군 사상자…美 “3명 전사” vs 이란 “560명 죽거나 다쳐”
-
7
“귀 안까지 찌릿”…뒤통수 통증 부르는 이 질환은?
-
8
싱가포르, 난초 교배종에 ‘이재명-김혜경 난’ 이름 붙여
-
9
트럼프 “모든 목표 달성 때까지 이란 공격…미군 죽음 복수할 것”
-
10
역대급 불황이라고? 실상은 자산 계층 중심으로 소비 확산하는 국면
-
1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2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3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4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5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
6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7
장동혁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정청래 “부럽다, 난 0주택”
-
8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9
李대통령 “국민 여러분 전혀 걱정 않으셔도…일상 즐기시길”
-
10
“과거사 사죄는 평생의 사명” 日목사…“日 정부와 국민은 달라요”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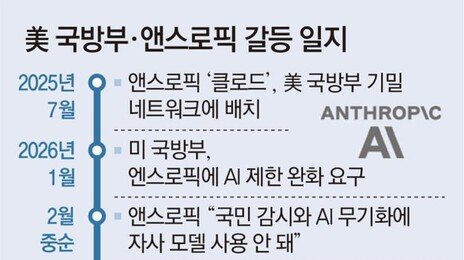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