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기자의 눈/손택균]‘無爲의 조직’ 국립현대미술관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미술관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특수독립법인 전환.’
국립현대미술관에 얽힌 문제가 불거지면 조건반사처럼 나오는 이야기다. 10여 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돼 지난 정부와 현 정부가 잇달아 추진했지만 법안 상정과 폐기를 거듭하는 어정쩡한 상황만 이어지고 있다.
조직 위상이 불투명하다 보니 구성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몰두하기 쉽지 않다. 법인화 추진 이후 채용된 서울관의 계약직 학예직원과 과천관의 정규직 학예직원 간 업무교류 단절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굳이 시간 들여 찾아가 보라고 주변에 권할 만큼 내실 있는 전시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만나기 어렵게 된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해외 유수 미술관이 대부분 법인체로 운영된다고 해서 꼭 똑같이 따를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일면 옳다. 영국 런던 테이트미술관,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MoMA) 등은 모두 대규모 컬렉션 또는 지원금 기부를 바탕으로 설립됐다. 내용물에 앞서 껍데기 공간부터 마련해 놓고 시작한 국립현대미술관은 선행 모델 없는 제 나름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관장 자리를 공석으로 둔 채 반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최근 상황을 취재하면서 확인한 것은 법인화를 경계하며 잔뜩 움츠러든 무위(無爲)의 조직이었다. 현대미술은 거침없이 새로운 일을 저지르고 뜨거운 논란을 발생시킴으로써 존재 가치를 얻는다. 그 논란의 포화를 뚫고 살아남는 결정체가 미술사의 표석으로 후대에 남는다. ‘새로운 시도를 절대 앞장서서 하지 않는 공무원 조직’은 처음부터 현대미술에 맞지 않는 옷이었다. “작품 설치하는 데 거쳐야 하는 결재 절차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 지난해 한 기획전에 참여한 작가의 말이다.
지원 없이 성과 없다? 안이한 핑계다. 대학원 논문 쓰듯 뜬구름 잡는 어휘를 늘어놓으며 ‘미술에 대한 전문지식에 무지몽매한 일반 관람객’을 가르치려 들고 있지 않은지, 구태의연한 과거 전시 형식에서 벗어나 관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즐길 방법을 절실히 고민해 봤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손택균기자 sohn@donga.com
기자의 눈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광화문에서
구독
-

게임 인더스트리
구독
-

새로 나왔어요
구독
트렌드뉴스
-
1
[단독]폴란드, 韓 해군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 무상 양도 안받기로
-
2
‘노인 냄새’ 씻으면 없어질까?…“목욕보다 식단이 더 중요”[노화설계]
-
3
李대통령 “큰 거 온다…2월 28일 커밍순”, 뭐길래?
-
4
李 “나와 애들 추억묻은 애착인형 같은 집…돈 때문에 판 것 아냐”
-
5
‘연대생’ 졸리 아들, 이름서 아빠 성 ‘피트’ 뺐다
-
6
대구 찾은 한동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설것” 재보선 출마 시사
-
7
4급 ‘마스가 과장’, 단숨에 2급 국장 파격 직행…“李대통령 OK”
-
8
K팝 걸그룹에 손등 키스…룰라가 반색한 아이돌 누구?
-
9
한국인의 땀과 살과 주름을 그린 화가 황재형 별세
-
10
밥과 빵, 냉동했다가 데워먹으면 살 빠진다?[건강팩트체크]
-
1
‘똘똘한 한채’ 겨냥한 李…“투기용 1주택자, 매각이 낫게 만들것”
-
2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
3
국힘서 멀어진 PK…민주 42% 국힘 25%, 지지율 격차 6년만에 최대
-
4
李 “나와 애들 추억묻은 애착인형 같은 집…돈 때문에 판 것 아냐”
-
5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개혁 반발 고조
-
6
“정원오, 쓰레기 처리업체 후원 받고 357억 수의계약”
-
7
대구 찾은 한동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설것” 재보선 출마 시사
-
8
[사설]계엄 때보다 낮은 지지율 17%…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민심
-
9
오늘 6시 이준석·전한길 토론…全측 “5시간 전에 경찰 출석해야”
-
10
‘4심제’ 재판소원법 與주도 국회 통과…헌재가 대법판결 번복 가능
트렌드뉴스
-
1
[단독]폴란드, 韓 해군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 무상 양도 안받기로
-
2
‘노인 냄새’ 씻으면 없어질까?…“목욕보다 식단이 더 중요”[노화설계]
-
3
李대통령 “큰 거 온다…2월 28일 커밍순”, 뭐길래?
-
4
李 “나와 애들 추억묻은 애착인형 같은 집…돈 때문에 판 것 아냐”
-
5
‘연대생’ 졸리 아들, 이름서 아빠 성 ‘피트’ 뺐다
-
6
대구 찾은 한동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설것” 재보선 출마 시사
-
7
4급 ‘마스가 과장’, 단숨에 2급 국장 파격 직행…“李대통령 OK”
-
8
K팝 걸그룹에 손등 키스…룰라가 반색한 아이돌 누구?
-
9
한국인의 땀과 살과 주름을 그린 화가 황재형 별세
-
10
밥과 빵, 냉동했다가 데워먹으면 살 빠진다?[건강팩트체크]
-
1
‘똘똘한 한채’ 겨냥한 李…“투기용 1주택자, 매각이 낫게 만들것”
-
2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
3
국힘서 멀어진 PK…민주 42% 국힘 25%, 지지율 격차 6년만에 최대
-
4
李 “나와 애들 추억묻은 애착인형 같은 집…돈 때문에 판 것 아냐”
-
5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개혁 반발 고조
-
6
“정원오, 쓰레기 처리업체 후원 받고 357억 수의계약”
-
7
대구 찾은 한동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설것” 재보선 출마 시사
-
8
[사설]계엄 때보다 낮은 지지율 17%…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민심
-
9
오늘 6시 이준석·전한길 토론…全측 “5시간 전에 경찰 출석해야”
-
10
‘4심제’ 재판소원법 與주도 국회 통과…헌재가 대법판결 번복 가능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KLPGA, 시드권 특전 주며 스스로 권위 날렸다[기자의 눈/김정훈]](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11/07/13272798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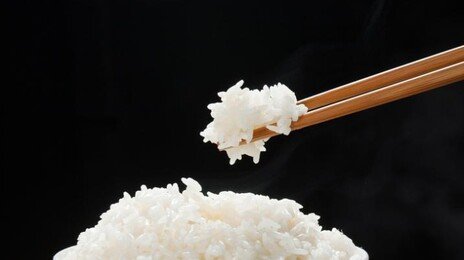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