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한미FTA 4대 선결조건 중 하나였던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비판이 또 다시 정치권에서 터져 나왔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입법지식데이터베이스 스크린쿼터제 자료를 발표, "스크린쿼터가 축소된 이후 2007~2009년 사이 한국영화 평균 관객 수는 64만여 명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이전인 2003~2005년 사이에 관객 수(110만여 명)에 비해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에 같은 기간 할리우드 영화는 축소이전 평균 관객수 43만2000여 명에서 축소 이후 55만900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한미FTA의 선결조건 중 하나였던 스크린쿼터 축소 결과 한국영화 관람객이 반 토막이 됐다. 아직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시장을 잠식할 정도는 아니지만 향후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경우 한미FTA상 역진방지조항으로 인해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다시 늘릴 수 없게 된다"면서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협약 제6조에 따라 대표적인 문화보호조치인 스크린쿼터를 다시 연장하는 조치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크린쿼터란 자국영화를 자국 내 시장의 극장에서 일정기준 이상 상영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한국에서는 1964년 도입 이후 다양한 변화를 겪어오다 2006년 7월1일부터 종전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된 바 있다.

●편당 관객 수로 시장저하를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시장분석
먼저 캐치프레이즈가 된 "한국영화 관람객이 반토막이 됐다"는 주장부터 살펴보자. 박 의원 측 주장의 토대는 한국영화 '편당' 관객 수다. 2003~2005년 사이 편당 관객 수 110만여 명에 비해 스크린쿼터가 축소된 2006년 이후, 2007~2009년 사이 편당 관객 수 64만 명은 너무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차이가 곧 스크린쿼터 축소의 폐해인양 주장됐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통계의 장난에 불과하다. 2003~2005년은 한국영화 상영편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점이었다. 2003년 한국영화 상영편수는 70편이었고, 2004년 78편, 2005년 87편이었다. 반면 대비해 제시한 2007~2009년의 경우 2007년 119편, 2008년 119편, 2009년 139편이었다.
평균치로 나눠봤을 때 2007~2009년은 2003~2005년에 비해 상영편수가 무려 160.5% 성장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같은 총 관객 수라는 조건 하에서도 37.7%로 편당 관객 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영화 관객 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03~2005년의 연당 평균 한국영화 관객 수는 약 7651만4443명이다. 한편 2007~2009년의 연당 평균 한국영화 관객 수는 이와 거의 비등한 7235만5명이다. 정확히는 5.4% 감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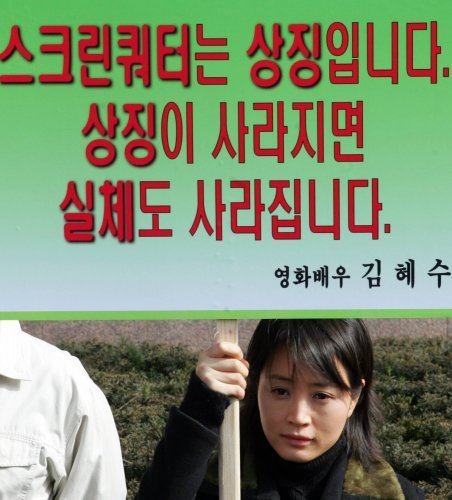
불과 이 정도 감소 치였음에도 무려 160.5%나 성장한 상영편수로 나눠버리니 박주선 의원이 주장한 편당 관객 수 "40%가량 감소"라는 수치가 나오게 된 것이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전체 관객 수는 늘어난데 반해 한국영화 관객 수가 소폭이나마 줄었다는 점만큼은 분명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영편수 조절의 문제를 놓고, 이를 "반 토막"이라 표현한 부분은 사실상 왜곡에 가깝다.
상영편수에 정비례해 관객 수가 늘어난다는 공식은, 한국시장 내 할리우드 영화는 물론 그 어느 시장의 어느 국가 콘텐츠를 놓고서도 절대 통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선동형 공식이라고밖에 달리 말할 길이 없다. '꿈의 공장' 할리우드가 위치한 미국조차도 상영편수에 따른 전체 수익구조를 놓고 매년 새로 계획을 세워 편수를 조절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2011년 1~9월기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은 명백히 '상승했다'
다음으로, 의무상영일수가 73일로 줄어든 후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이 2007년 50.0%, 2008년 42.1%, 2009년 48.8%, 2010년 46.5% 등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라는 주장에 대해 생각해보자. 액면 그대로는 그럴싸해 보이는 수치통계다. 그러나 당장 올해, 2011년 상황만 돌아봐도 이 같은 주장은 말이 맞지 않는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2011년 1~9월 영화산업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상영작 기준 한국영화 점유율은 51.9%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6205만5515 명이 한국영화를 관람했다. 이는 분명 지난해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 쾌거다. 지난해 1~9월기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은 43.9%, 관객은 전국 5155만5556 명에 불과했다.
나아가 이 자료는 올해 전체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이 4년 만에 50%대를 재 돌파하는 것은 물론, 현재까지 나온 51.9%라는 수치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본래 할리우드 영화는 여름시장을 싹쓸이하며 1~9월기까지 승승장구하는 패턴이기 때문이다.
한국영화는 추석을 기점으로 연말까지 강세를 보이며 여름시장의 대패를 만회한다. 당장 지난해만 해도 같은 1~9월기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은 43.9%에 불과했지만, 추석 이후 만회하기 시작해 46.5%까지 전체 점유율을 끌어올린 바 있다.
결국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을 떨어뜨린다는 박주선 의원 측 논리는 지금, 2011년 현 상황만 바라봐도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애초 2006년 이후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추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한동안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할리우드 벤치마킹의 화제성이 약발을 다한 탓으로 볼 수 있다.
한국영화가 이 같은 방향성으로 이른바 '우리도 할 수 있다'식 자긍심을 대중에 선사하기 시작한 건 1998년 '퇴마록'이 '한국형 블록버스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하면서부터다. 이듬해 '쉬리'는 더욱 노골적인 할리우드 벤치마킹을 시도했고, '쉬리'가 대성공을 거두자 한국영화 흥행 키워드는 새로 씌어지게 됐다.
당연한 얘기지만, 한국만 그랬던 건 아니다. 할리우드 영화들에 시장을 침식당해온 국가들은 대부분 바로 그 할리우드 영화들을 벤치마킹하면서 하나둘 시장탈환에 성공한 바 있다.
1982년 혼성장르 블록버스터 '최가박당'을 기점으로 시장탈환에 대성공한 홍콩, 2006년 '일본침몰' '데스노트' '리미트 오브 러브 우미자루' 등 할리우드식 블록버스터들로 무려 21년 만에 시장점유율 50% 돌파에 성공한 일본, 1990년대 후반부터 뤽 베송과 파테사(社)를 중심으로 '택시' '아스테릭스' '크림슨 리버' 등 무수한 할리우드 벤치마킹을 통해 시장을 재점령한 프랑스 등이 예다.
문제는 이 같은 전략의 효용기간은 어디서나 짧았다는 점이다. 홍콩만 해도 1990년 성룡의 '용형호제 2' 등 화려한 할리우드 벤치마킹 콘텐츠를 주성치의 난장판 소품 코미디가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별의 별 유사 할리우드 콘텐츠가 난무하던 프랑스도 2008년 소품 코미디 '스틱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가 역대 흥행기록을 갈아 치우면서 시장분위기가 한 차례 큰 변화를 겪었다.
일본 역시 올해 들어 '간츠' 등이 다소 실망스런 흥행을 보이며 서서히 할리우드 벤치마킹 약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7~8년, 길어야 10년 정도만 그 약발을 봤던 셈이다.
결국 한국도 '한국형 블록버스터' 천명으로부터 딱 8년 만인 2006년으로 그 약발이 다했다고 봐야한다. 이니후부턴 한국적인 콘텐츠, 자국영화로서 메리트 있는 콘텐츠가 성공했다. 이에 업계는 한동안 판단착오로 부침을 겪다가 마침내 시장변화에 적응해냈다.

2011년 1~9월기 동안 한국영화 흥행을 이끈 영화들은 더 이상 할리우드 벤치마킹 콘텐츠가 아니었다. 세대정서를 고스란히 담아낸 '써니', 한국 무협활극의 완성도를 극단적으로 높인 '최종병기 활', 한국에서 늘 인기 있는 실화소재 사회파 드라마 '도가니' 등이었다.
업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시장분위기를 파악, 자국영화로서 프리미엄이 높은 장르와 소재를 찾아내 매진한 결과라는 것이다. 결국 2007~2010년 사이는 그저 시장분위기 변화에 따른 전략 수정 및 적응기간에 불과할 뿐 스크린쿼터 축소 폐해와는 별반 관계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인 분석이다.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1996년 이미 한 차례 줄었다
끝으로, 애초 스크린쿼터 축소와 한국영화산업 저하가 과연 관계가 있기는 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박주선 의원실측 보도자료만 보면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계속 146일로 유지돼오다 2006년 7월1일부터 갑자기 그 절반인 73일로 축소된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스크린쿼터에 의해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가 146일로 규정된 것은 1984년이다. 당시 개정된 5차 개정 '영화법'에서 총 상영일의 5분의 2인 146일이 의무상영일수로 지정됐다.
그러나 그로부터 12년 뒤인 1996년 7월, 신정·설·추석 등 성수기 한국영화 상영은 1일을 5/3일로 계산토록 하고,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할 경우 의무상영일을 추가로 20일 경감해주는 방안이 통과됐다.
단 총 경감일수는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건이었다. 결국 1996년 7월 이후부터는 사실상 기존 146일에서 40일이 빠진 106일로 의무상영일수가 줄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처럼 40일이 빠져나간 뒤 한국영화산업은 과연 타격을 입었을까. 정확히 그 반대다. 한국영화산업은 전에 없을 정도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다. 할리우드 영화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자 업계 내부에서 위기를 절감, 자연스럽게 체질개선을 꾀한 덕택이다.
특히 1999년을 기점으로 한국영화산업은 투자처를 대폭 확대·다양화하고, 배급을 체계화시켰으며, 크리에이티브 측면에서도 젊은 피를 다수 수혈, 신선한 장르 콘텐츠와 대범한 블록버스터 콘텐츠를 계속해서 실험했다. 스크린쿼터에 의존하며 의무상영일수 채우기 용 졸속영화나 제작하던 기존의 안일한 분위기와 크게 달랐다.
이는 1990년대 한국영화 제작편수와 시장점유율 변화로도 상당부분 확인이 된다. 146일의 의무상영일수가 지켜지던 1990~1996년 사이 한국영화 제작편수는 1991년 121편까지 치솟았다가 1996년에 이르러선 68편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다 1998년 43편까지 내려앉은 뒤 1999년 49편으로 반등하면서 이후 지속적인 상승을 이뤘다. 특히 1999년은 전년도 25.1%에서 무려 39.7%로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린 해이기도 했다. 시장점유율 역시 이후 2006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결국 1998년 이후 계속 시장점유율을 상승시키다 2006년 63.8%까지 치솟은 상황도, 알고 보면 1984~1996년에 비해 의무상영일수가 40일 줄어든 상황에서 이룩한 쾌거였다는 얘기다.
특히 1993년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발족되면서 146일의 상영일수가 엄격히 감시된 1993~96년 상황과 견줘봤을 때도 1999년 이후의 발전상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다. 보호주의 조치와 자유경쟁체제 확립 중 어느 쪽이 더 시장과 산업을 살찌우는 결과를 낳았는지는 자명해진다.
●시장 침해하는 정치적 프로퍼갠다를 철저히 경계해야
사실 박 의원의 스크린쿼터 연장 주장은 바로 지난해에만 제기됐어도 일정부분 데이터 상 반박의 여지를 남기기 어려웠을 수 있다. 그러나 하필이면 올해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하고 스크린쿼터 축소가 다시금 도마에 오르면서 앞뒤가 맞지 않게 됐다.
올해는 한국영화가 반등에 성공한 해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전략적 변화가 상당부분 먹혀들어간 해다. 시장경쟁이란 무릇 이런 식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마련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업계와 미디어는 더욱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언급했듯, 바로 지난해에만 이 같은 주장이 등장했어도 이는 주류적 주장으로서 대서특필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치적 프로퍼갠다에 의해 시장이 침해당하고 왜곡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최소한 혼란 정도는 충분히 야기됐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 시점 한국영화산업이 진정 경계해야 할 대상은 거대 블록버스터들을 차례로 내놓는 할리우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계속해서 시장을 오판시키는 우리 내부의 정치세력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철저한 경계와 견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문원 대중문화평론가 fletch@empa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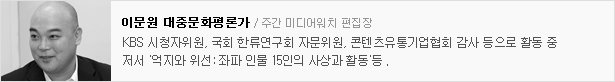
※오·감·만·족 O₂플러스는 동아일보가 만드는 대중문화 전문 웹진입니다. 동아닷컴에서 만나는 오·감·만·족 O₂플러스!(news.donga.com/O2) 스마트폰 앱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사기 피의자로부터 100만 원 뇌물수수”…현직 형사팀장, 곧 출석 조사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중견기업 성장한 중소기업, 세제혜택 5년 연장…유망 중기 100개 집중지원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대구·경북 ‘서울시 모델’로 통합 논의…내일 4자 회동서 논의 예정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