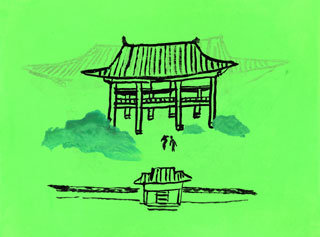
다시 눈길을 밀양강으로 돌리자, 삼각주에 황새 한 쌍이 있었다. 너무 멀어서 잘은 안 보이지만, 몸짓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부리를 커다란 날개 속에 처박고…털을 다듬고 있군…황새 처음 보는 것 같네…아니지, 늘 보면서도 눈여겨보지 않은 거지. 오늘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눈에 보인다. 내가 보려 하지 않아도, 상대가 내 눈 속으로 뛰어든다…아아, 그렇지…안녕이라고 작별 인사를 하나 보다…들리고말고…안녕…안녕…기와는 양산을 왼손에 옮겨 쥐고, 오른손을 들어 강에게 살랑살랑 흔들었다. 그때 돌계단 아래에서 하얀 러닝셔츠에 짧은 바지 차림의 청년이 뛰어올라왔다. 앗, 기와는 조그맣게 소리 지르고 양산을 뒤로 젖혔다.
“이우근씨죠?”
청년이 멈춰섰다.
“이나모리 기와라고 해요. 청년을 받았던 산파입니다.”
“…아, 예…어머니한테서 말씀 들었습니다. 형님한테서도….” 우근은 숨을 고르면서 셔츠 깃에서 수건을 꺼내 땀을 닦았다.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데.”
“…그럼, 영남루 정자로 가시죠.”
“네, 그래요.”
기와는 옆에서 나란히 걷는 청년의 얼굴을 보려고 양산을 접었다.
“갓 태어났을 때는 얼굴이 5월인형*처럼 생겼었는데, 지금은 위태천(爲太天) 같군요, 오호호호호.”
“여기 앉으시죠.” 우근은 쑥스러운 듯이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옛날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5월인형:5월 단오절에 사내아이를 위해 차려 놓는 무사 차림의 인형.
글 유미리
8월의 저편
구독-

정덕현의 그 영화 이 대사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13년 전 900원 때부터 “제발 비트코인 사라”던 남성 지금은…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대생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최소 60명…‘함정 추적’으로 3년만에 검거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계환 사령관, ‘VIP 격노설’ 물음에 침묵…박정훈 대령과 대질조사 가능성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소설]8월의저편 453…잃어버린 계절(9)](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