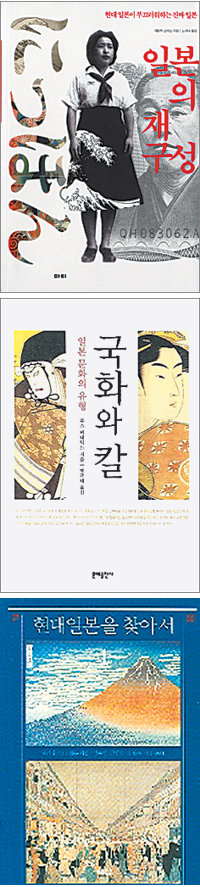
일본인에 대한 서양인들의 시각은 대체로 ‘순종적이고,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며, 권위에 맹종하는 사람들’로 요약된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허상이며 “종신 고용과 무파업의 신화 속에 가려진 일본 노동운동의 역사, 신음하는 일본 소시민들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일본의 오늘”이라고 역설한다. 그는 “일본을 갈등 없는 순종자들의 집단이라고 믿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만든 창작의 결과다”라고 진단한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의 ‘잘못된 창작’은 2차 대전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쟁 직후만 해도 미국은 일본의 오래된 봉건주의적 관습을 뿌리 뽑고 서구식 민주주의를 심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반공주의를 강조하면서 보수주의 정치 엘리트들을 정계로 복귀시키고, 일본 재벌 세력을 원위치시키면서 기회를 잃었다.
실권을 찾은 보수 세력은 구습을 지속시켰다. 이에 따라 봉건사회를 거치며 도전과 저항의 한계를 겪은 대중은 여전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저자는 “이처럼 만들어진 과거, 의도적으로 잊혀진 역사 속에서 개개인이 자신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정립하기란 불가능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1987∼1991년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의 도쿄 지국장으로 근무했던 저자는 “이제는 일본이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를 버리고 스스로를 재해석할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말한다.
정당한 권리를 위해 집단에 대항하는 개인이 늘어나는 등 ‘안정과 현상 유지를 원하는 국민’이라는 이미지가 조금씩 깨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작업을 거치다 보면 일본이 타의에 의해 스스로를 구속했던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서 ‘세계화’ 시대의 세상에 서서히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내다봤다.
서양인의 시각에서 일본을 분석한 책으로는 ‘국화와 칼’을 먼저 꼽을 수 있다. 미국의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쓴 이 책은 국내에서도 꾸준히 번역돼 나오고 있으며 올해 초에도 문예출판사가 새로운 번역본을 내놨다. 국화 가꾸기에 정성을 기울이는 ‘섬세한 심미주의’를 가졌고, 동시에 칼을 숭상하고 무사에게 최고의 영예를 돌리는 ‘공격적 무력 숭배’ 전통을 가진 일본인의 양면성을 파헤친 책이다. 베네딕트는 이 책을 쓰기 전 전시 일본인의 행동을 집중 관찰한 연구서 ‘일본인의 행동패턴’(소화)을 쓰기도 했다.
‘현대 일본을 찾아서 1, 2’(이산)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일본에서 군 생활을 한 것이 계기가 돼 전역 후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일본사를 전공한 마리우스 잰슨의 저작. 일본의 근대적 변혁이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이런 변화에 일본의 지식인과 민중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실존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풀어썼다. 로이터통신, 타임스, 뉴스위크 등의 기자를 지냈으며 ‘마지막 황제’를 쓴 작가 에드워드 베르는 ‘히로히토-신화의 뒤편’(을유문화사)을 썼다. ‘천황을 알아야 일본이 보인다’는 게 그의 생각. 2차 대전이 끝난 뒤 히로히토의 전범 행위가 곧바로 묻힐 수 있었던 이유, 천황제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 등을 짚으며 일본 사회를 해석했다.
금동근 기자 gold@donga.com
인간 배아 줄기세포 : 희망의 메시지 >
-

부동산 빨간펜
구독
-

사설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