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독이 토해 낸 깊은 울림
‘내 속의 나’를 들여다보다
#깊은 생각
똑…똑…똑…. 적막한 공간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은 생각보다 큰 울림을 내면서 바닥에 고인 물에 파문을 일으킨다. 천장엔 거대한 종이 오브제가 매달려 있다. 언어가 아니라, 몸짓으로 소통한 마이미스트들의 흔적을 담은 작품이다. 전시장의 낡은 벽돌에는 선명한 혹은 희미한 이름들이 쓰여 있다. 유년시절 이후 작가의 기억 속에서 떠도는 670여 개 이름이다. 세월의 흔적과 개인의 기억을 교직한 설치작업을 본 뒤 소극장에 들어가니 이름들이 어렴풋이 부유하는 영상 작업이 기다린다.
내년 1월 18일까지 서울 종로구 원서동 공간사옥 지하에 있는 공간화랑(02-3670-3500)에서 열리는 김승영의 ‘흔적’전. 작가는 작품과 빈 공간을 중첩시키면서 새로운 생명력을 지닌 환경을 만들어낸다. 관객이 그 안에 발을 딛는 순간, 작품이 온전하게 탄생하는 것. 이번 전시도 마찬가지다. 설치와 영상작업을 보면서 관객은 진정한 소통을, 살아오면서 내 기억 속에 자취를 남긴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 지나온 흔적을 돌아보며 성마른 영혼을 치유하는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다.
#깊은 침묵
푸르고 검다. 깊고 깊은 바다인가, 머나먼 우주인가. 거대한 화면에 점점이 떠 있는 빛과 커다란 물결처럼 꽃잎처럼 일렁이는 이미지들. 보는 이의 마음을 따스한 침묵으로 감싸 안아준다.
30일까지 서울 종로구 팔판동 갤러리 상(02-730-0030)에서 이어지는 한은선의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전. 그린다는 것이 “삶의 한 방식이자 태도이며, 같기도 하고 또 아니 같기도 한 너와 나, 그리고 이 경이로운 세계에 대한 정직한 질문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작가. 그의 작업은 ‘언어가 들어서기 전,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세상이 무한히 확장되는 순간’을 겨누고 있다.
한지 위에 퍼져나간 물과 먹, 물감이 스며드는 효과를 내려면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한다. 작가는 힘들게 완성한 작업을 통해 보이는 세계와 이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 신비한 침묵을 드러내려 한다. 그 덕분에 작가가 작업할 때 듣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전시장에서 만난 작품들은 복잡했던 마음을 부드럽게어루만져 준다. 자기 안의 내밀한 감정을 가만히 응시하는 순간이다.
#깊은 고독
지하로 들어가는 나무계단을 내려서면 앞이 막막하다. 어둠 속 텅 빈 전시장. 폐허의 공간 같다. 찬찬히 보면 맨살을 드러낸 벽면과 기둥마다 목탄 드로잉이 펼쳐져 있다. ‘수행적 드로잉 작업’으로 삶의 의미를 스스로 묻고 답해온 작가가 30일 동안 작업한 결과다. 명상하듯 잠시 벽을 따라 걸은 뒤엔, 전시장 구석의 골방 같은 공간으로 들어간다. 영상으로 기록된 작가의 흔적이 흘러나온다.
19일까지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자리한 전시장 사루비아다방(02-733-0440)에서 열리는 허윤희의 ‘날들의 흔적’전. ‘기억을 잡고 싶지만, 그러나 잡히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다. 영원을 꿈꾸지만, 그러나 순간일 뿐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작가의 말은 고스란히 그의 드로잉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영원하지 않아도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고 응원을 보내는 듯하다.
사유와 감성이 절묘하게 결합된 세 전시는 내가 내 삶에서 너무 멀리 튕겨 나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찾아보면 좋을 법하다.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침묵의 소리와 만날 기회는 그리 흔치 않으므로.
고미석 기자 mskoh119@donga.com
인간 배아 줄기세포 : 인간 복제 가능한가
-

박재혁의 데이터로 보는 세상
구독
-

동아시론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사람 떨어지려 한다” 아파트 15층 매달린 치매 여성 극적 구조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싱가포르서 외국여성 성폭행 시도한 한국 50대 男의 최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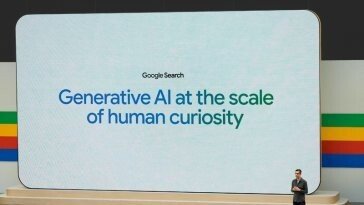
구글 “AI로 인터넷 검색”… 복잡한 질문도 OK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