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강은 물론 80년대의 젊은이들을 해방의 바다로 데려가주지 않았다. 혁명의 환상이 소멸한 이후 종옥이 거쳐온 역정은 주체성의 파산이라고 부를 만한 과정을 이룬다. 역사에 대한 환멸만이 아니라 일상에 대한 환멸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종옥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세계 속에서 구차하게 자신을 보존하고 있음을 느낀다. 자신이 ‘버러지’ 같다는 괴로운 자학의 극점에서 그녀가 다시 시작하는 글쓰기는 그녀의 무너진 주체성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한다. 그녀가 작중에서 펼치는 회상은 실제로 주체성의 재건을 향한 서사적 운동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녀는 ‘감동적인 유서’를 쓰는 일에 골몰했던 자신의 소녀 시절로까지 거슬러올라가는 기억의 회복을 통해, 특히 그녀에게 민중적 삶의 육체를 실감하게 해준 여성노동자 미례에 대한 기억의 쇄신을 통해 ‘자기 삶의 주인’으로 돌아오는 계기를 잡는다. 그 계기는 자기 안에 존재하면서 또한 자신을 타인들과 이어주는 ‘생명’의 거대한 운동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온다.
‘강·섬·배’와 같은 운동권 출신 젊은이의 문학적 회상기는 독자들에겐 이미 친숙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종래의 유사품에선 보지 못한 덕목이 있다. 그 이야기 서술은 ‘좋았던 옛날’ 식의 감상적 회고에 탐닉하지도, 80년대의 젊음을 당위론적으로 미화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민중의 환상’을 비롯한 관념적 편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제시하고 그 젊음의 업적을 개인의 근원적인 욕망과의 보다 심오하고 구체적인 연관 속에서 이해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또한 환멸 이후의 역사적 경험에서 단지 배신과 타락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순정주의적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그것을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대하여 의미있는 형태로, 특히 여성의 관점에서, 장악하려는 의지도 보여준다. 게다가 ‘버러지’의 진실을 육화한 인물 미례는 ‘외딴 방’의 신경숙이 그려낸 희재언니와 견주고 싶은 마음을 부추길 정도로 선렬하다. ‘강·섬·배’가 진작에 세상에 나오지 않은 것이 아쉽다.
그러나 감동을 방해하는 요소도 있다. 예컨대, ‘내 마음에도 물살이 인다’, ‘푸르른 내음이 불어온다’, ‘깊은 슬픔을 봉인한 채’, ‘섬광처럼 반짝이는 기억의 편린들’, ‘상처입은 거대한 짐승처럼’, ‘심연이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등의 표현. 이런 종류의 수사적 표현이 혹시 서정적이거나 문학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그렇게 판에 박힌, 자동화된 언어는 어떤 고양된 서정적 주체성에도, 언어 예술의 창조성에도 이르지 못한다. 이미 상표가 붙은 상투적 수사를 별로 경계하지 않는 폐습은 기성작가들에게 흔하지만 정혜주의 경우 조금 심한 듯하다. ‘강·섬·배’의 주제는 ‘생’을 향한 충일한 열망이다. 그러나 그 주제를 담은 언어는 그러한 열망을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 상투적 수사는 생생한 언어가 아니라 죽은 언어이다. ‘생’이라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문학에서 그것은 그것을 이미 기록하고 표상한 언어들의 무덤을 부수지 않고서는 현시되지 않는 법이다.
황종연<문학평론가·동국대교수>
출판
-

애널리스트의 마켓뷰
구독
-

아파트 미리보기
구독
-

이럴땐 이렇게!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이철희 칼럼]반갑다, 윤석열의 외교 ‘동문서답’](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25025304.1.thumb.jpg)
[이철희 칼럼]반갑다, 윤석열의 외교 ‘동문서답’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고준위 방폐장법’ 폐기 수순… 2030년 원전가동 차질 우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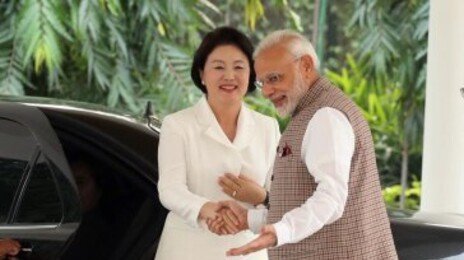
![[출판가]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아내의 상자」 돌풍](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