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오늘과 내일/방형남]한미동맹의 비전 ‘북한 자유화’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27, 28일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50여 명이 모였다. 더그 밴도, 브루스 벡톨, 고든 창,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브루스 클링너, 래리 닉시, 마커스 놀랜드, 마이클 오핸런….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미국 전문가들은 대부분 참석했다. 한미안보연구회가 ‘2012년 한국 미국의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를 위해서였다. 참석자들은 한미의 대통령 선거와 러시아 중국의 리더십 교체가 겹친 특수상황이 불러올 변화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수동적 소극적
세미나가 열린 장소도 예사롭지 않았다. ‘시거 아시아 연구센터.’ 1986년부터 3년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를 지낸 개스턴 시거의 이름을 땄다. 격동기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개입했던 시거를 회상하며 한국인들이 미국인들과 양국의 대선을 변수로 놓고 토론을 벌이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시거는 1986년 필리핀의 민주혁명이 성공한 여세를 몰아 한국의 민주화에 개입했다. 당시 주한 미대사였던 제임스 릴리는 ‘시거는 한국 민주화 지원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민주화 개혁에 동의하도록 전두환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앞장섰다’고 회고록에 썼다. 한국 국민에게 시거는 민주화를 지지하고 군의 정치 개입에 반대하는 미국의 대한(對韓)정책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세미나 둘째 날 오찬연설을 한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대사는 “2등서기관 시절 시거가 한국 지도자들을 만나 민주화를 촉구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지켜봤다. 오늘 시거센터에서 한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양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니 6월 민주항쟁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며 흐뭇해했다.
미국이 한국을 세계전략 실현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한 측면도 있다. 한국을 방어선에서 제외해 6·25전쟁 발발의 한 원인이 된 애치슨 선언이 대표적 사례다. 전쟁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서 한미관계는 비로소 동맹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동맹에도 여러 단계가 존재한다. 1980년대 말 한국은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로 교류할 수준이 못 됐다. 그래서 미국 쪽으로 심하게 기울던 역학관계를 바로잡은 오늘날 한미관계가 대단해 보이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유리한 조건일 뿐 목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동맹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뤄내야 할 무엇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니 한미 전문가들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한국 측에서는 수동적 소극적 발언이 많이 나왔다. 대북(對北)정책은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면서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패턴을 넘어서지 못했다.
‘동맹 100% 활용전략’ 구축할 때다
미국 쪽에서는 과감한 주장이 제기됐다.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안보연구소 부소장은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는 유일한 방안은 통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2주 전 한미 외교 국방장관이 ‘2+2회담’을 한 뒤 7쪽이나 되는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단 한 줄도 통일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식의 대응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뿌리 뽑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를 지낸 월리스 그레그슨의 만찬 연설 제목은 ‘자유 북한(A Free North Korea)’이었다. 미국인보다 한국인이 앞장서서 제시해야 할 목표들이다. 우리가 복원된 한미동맹에 자족해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한미동맹을 100% 활용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일깨운 세미나였다. ―워싱턴에서
오늘과 내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알쓸톡
구독
-

D’s 위클리 픽
구독
-

컬처연구소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오늘과 내일/김윤종]‘尹 계엄선포문’ 따라 읽는 청년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12/07/132918738.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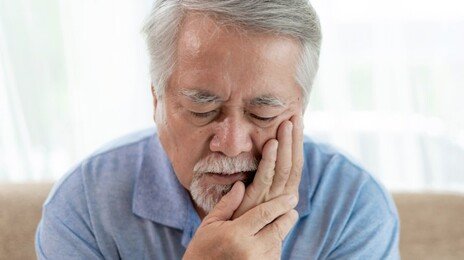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