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으로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권력 등 실력수단, 정보통제, 지도자 우상화를 포함한 사상교육이라는 3가지 수단을 독점하고 있어야 한다. 이 수단들을 제대로 갖추는 게 쉽지 않지만 일단 갖춰진 후에는 암살이나 쿠데타 이외의 수단으로 정권을 전복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제군주나 독재자가 친위대나 근위부대를 조직하는 것은 외부의 적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주변을 충성 분자로 공고화하고 암살이나 쿠데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주창한 것도 군대의 지지를 확실히 해 루마니아나 옛 소련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리비아 사태를 지켜보노라면 만약 카다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다국적군이 개입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결과 정부군의 승리와 반정부군에 대한 대학살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된다. 이는 곧 “중동의 민주화운동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감스럽지만 이런 지적은 틀린 게 아니다. 오히려 너무나 적절하다. 북한에서 내전으로 발전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화된 저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반정부적 움직임이 나타나면 김정일은 주저하지 않고 카다피보다 심하게 탄압할 것이다. 외국으로부터의 간섭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것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국제기관이든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엄중히 경고할 것임에 틀림없다.
9·11테러 후 부시 정권의 테러 지원 국가에 대한 협박외교로 카다피가 대량살상무기의 포기를 선언했을 때 김정일도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 하지만 김정일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반면 김정일의 핵무기는 지역패권과 관련이 없다. 북한의 체제 유지, 즉 생존수단이나 다름없다. 당시 김정일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바로 현재 리비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태다. 그렇다면 리비아의 사태에서 교훈을 얻은 쪽은 김정일이 아니고 ‘우리’일 수 있다.
리비아 사태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핵 공격의 위험을 상정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내전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직시하면서 긴급대응 시나리오나 장기적 통일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동일본 대지진에서도 밝혀졌듯 원자력발전소의 취약성은 새롭게 떠오른 걱정거리 중 하나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동서대 석좌교수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의 눈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그 마을엔 청년이 산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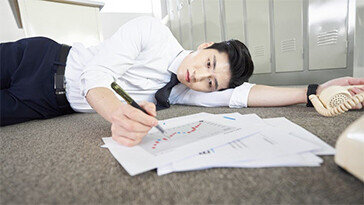
-
![출산율 꼴찌 한국이 외롭지 않은 이유(feat.피크아웃)[딥다이브]](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25225389.1.thumb.jpg)
출산율 꼴찌 한국이 외롭지 않은 이유(feat.피크아웃)[딥다이브]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당론 1호법안 ‘5대 분야 31개’ 쏟아낸 與… “재탕에 백화점식 나열”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계의 눈/파투 케이타]아비장의 창가에서](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11/04/08/36249866.1.jpg)
![[세계의 눈/오코노기 마사오]리비아에 핵무기가 있었다면](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