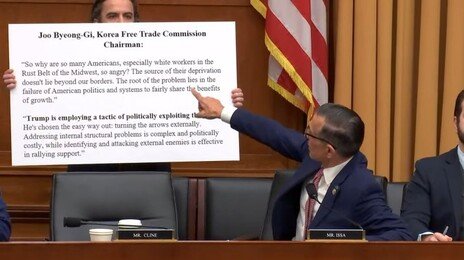공유하기
[메트로 인사이드]가리봉동 「벌집촌」
-
입력 1998년 10월 21일 19시 48분
글자크기 설정
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 속칭 ‘벌집마을’. 64년 구로공단 조성이후 ‘팔도 젊은이가 다 모였다’는 그 곳. ‘개발독재’시절 서울에 대한 환상을 갖고 무작정 상경했던 그 젊은이들의 애상이 잔잔히 남아 있는 장소다.
‘벌집’은 겉보기에는 그냥 보통의 주택이다. 그러나 들어가 보면 작은 방이 많게는 30개 이상 다닥다닥 붙어있다. 모양 그대로 이름이 붙었다.
벌집촌의 주민은 ‘공순이 공돌이’였다. 스스로 비하시켜 불렀던 그 이름은 그 젊은 근로자들이 벌집과 ‘공장의 굴뚝’ 사이를 오가며 겪은 고된 삶의 편린들의 집합이다.
90년 벌집에 들어와 지금은 전세방으로 옮겼다는 김인화(金仁和·27)씨.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전 공순이라는 말에 애착이 가네요. 우린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서로를 위하며 살았고 그때를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합니다.”
벌집촌 거주 20년 경력의 김정기(金正基·69)씨도 이렇게 말한다. “그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겨. 공순이들이 피땀흘려 일했으니께 오늘 우리가 이 정도라도 사는 거 아녀.”
당시 벌집에는 요즘 아파트촌에서 문제가 되는 ‘소음시비’가 전혀 없었다. 어느 방이든 들리던 시끌거림은 모두에게 생명의 박동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잔업까지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가리봉시장 한귀퉁이 길바닥에 차린 행상 앞에서 수다 떨며 먹던 그 순대와 떡볶이는 ‘생명의 양식’ 같았다.
12∼14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속에서도 ‘함께 산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이랬다.
그러나 지금 벌집촌은 변했다. 벌집은 화장실 부엌이 딸린 두칸방 전셋집으로 모습을 바꾸고 있다.
남은 벌집도 적막강산처럼 조용하다. 모두가 떠난 까닭이다. 제조업체들이 구로공단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92년을 기점으로 공단에서 여성근로자들이 현저히 줄어든 탓이다. 벌집도 이제는 일용직 노동자들 차지가 됐다.
벌집 주인들이 원하는 것은 재개발. 최근 구로3동 방향의 일부 벌집(5백13가구)에 대한 재개발안이 구청을 통과했다.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나게 일했는지.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구로공단도 벌집도 모두 다 잊혀지는 거지.”
30여년만에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벌집촌 주민 김태환(金泰煥·43)씨의 쓸쓸한 소회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NGO현장 >
-

함께 미래 라운지
구독
-

염복규의 경성, 서울의 기원
구독
-

e글e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NGO 현장]'밑빠진 독'상에 금융감독위원회 선정](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0/12/21/680329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