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고려大 미래과학 콘서트]베르틸 안데르손 싱가포르 난양공대 총장 “상에 연연 말고 독창적 연구 해야… ”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해외 우수인재 적극 활용하라”
다양한 학문 결합한 ‘융합 연구’ 활발… 학자간 교류·협력 중요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방법이요? 더 우수한 학문적 성과, 해외 학자의 적극적 활용,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벨상 조급증부터 버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시아의 매사추세츠공대(MIT)’로 불리는 싱가포르 난양공대(NTU)의 첫 외국인 수장(首長)인 베르틸 안데르손 총장(64·사진)의 조언이다. 스웨덴 출신으로 1989년부터 노벨재단과 인연을 맺은 그는 2006∼2010년 노벨상 수상자를 최종 결정하는 노벨재단 평의회 아홉 명 중 한 명으로 활동하며 노벨 화학상 수상자 선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 자신 또한 유명 화학자인 안데르손 총장은 노벨재단 업무 외에도 유럽과학연합회장, 유럽과학재단(ESF) 최고위원, 스웨덴 스톡홀름 린셰핑대 총장 등을 역임한 세계 과학계의 거두다.
28, 29일 고려대에서 열리는 ‘MFS 2013’ 연사로 참석하기 위한 준비로 바쁜 안데르손 총장을 1일 싱가포르 난양공대 총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영국 잡지 ‘타임스 고등교육(THE)’ 매년 10월 초 발표하는 세계 100대 대학 순위에서 아직 상위 20안에 포함된 아시아 대학이 없는 것이 그 증거라고 했다. 올해는 일본 도쿄대가 23위, 싱가포르국립대가 26위, 한국 서울대가 44위였다.
안데르손 총장은 미국인 노벨상 수상자의 상당수가 유대계일 정도로 유대인의 두뇌가 우수하지만 이스라엘도 1945년 건국 후 57년 만인 2002년에야 첫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나의 모국인 스웨덴에 어린아이를 수출하는 가난한 나라였다”며 “(노벨상을 받으려면) 좀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데르손 총장은 탁월한 학문적 성과의 비결은 ‘연구의 독창성’이라며 1996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해럴드 크로토 교수를 예로 들었다. 크로토 교수는 자연계의 탄소분자가 다이아몬드와 흑연 두 종류뿐이라는 설이 세계 과학계를 지배할 때 ‘버키 볼(bucky ball)’이라는 축구공 모양의 탄소분자, 즉 풀러렌의 존재를 주장했고 결국 이를 입증했다.
안데르손 총장은 최근 노벨상 수상의 가장 큰 특징이 ‘활발한 학문 간 융합’이라며 노벨 화학상과 노벨 의학상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두 분야의 최근 수상자 중 화학, 물리, 의학, 재료공학 등 다양한 학문을 결합한 연구로 성과를 거둔 사람이 많다”며 “두 분야의 수상자를 선정하기 전 화학상위원회와 의학상위원회 위원들이 ‘수상자가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나눈 적도 있다”고 알려줬다.
그는 “융합 연구의 증가는 팀워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라며 “굳이 노벨상 수상만이 아니라 더 나은 연구 성과를 위해 다른 분야의 학자와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자력만으로 노벨상을 타려고 애쓰지 말고 해외 인재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미국 국적의 노벨상 수상자의 절반이 이민 2세대이거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므로 한국도 더 많은 글로벌 우수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안데르손 총장은 “1980년대만 해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던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의 덫’에 갇힌 이유도 국제감각의 부재”라며 “자원도, 인구도 부족한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잘사는 나라가 된 것도 여러 인종이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는 풍토가 오래전부터 뿌리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우수 학생과 연구에 아낌없이 투자한다 ▼


난양공대가 이처럼 짧은 시간에 급성장을 거둔 비결은 크게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 △대대적인 해외 인재 유치로 요약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가 약 5조 원을 출연해 만든 싱가포르 국가연구재단(NRF)에서는 국적에 상관없이 매년 우수한 연구를 시작하는 학자 약 10명을 선발해 월급 외의 순수 연구비용만 300만 달러(약 33억 원)를 지원한다.
NRF는 주로 이공계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된다. 조남준 난양공대 재료과 교수도 ‘NRF 연구원(fellow)’이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 정부는 바이오 등 지식기반 산업의 해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컨택 싱가포르(Contact Singapore)’라는 헤드헌팅 전담기관도 설립했다. ‘컨택 싱가포르’는 2015년까지 유학생 15만 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종이 몰려 있는 싱가포르처럼 난양공대의 인적 구성 또한 매우 다양하다. 우선 1700여 명인 난양공대 교수진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다. 특히 2011년 7월 취임한 베르텔 안데르손 총장은 스웨덴 출신의 화학자로 싱가포르 주요 대학 중 사상 첫 외국인이다.
안데르손 총장도 무엇보다 글로벌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싱가포르 스웨덴 이스라엘처럼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에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라며 “자국민에 대한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해외 각국의 인재를 유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장자 우대, 암기식 교육 등 아시아 문화의 특징이 최근 한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면이 있다”며 “언어와 문화가 다른 각국 인재가 한 곳에 모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하정민 기자 dew@donga.com
트렌드뉴스
-
1
아침 공복 따뜻한 물 한 잔, 정말 살 빠지고 해독될까?[건강팩트체크]
-
2
美, 최신예 미사일 ‘프리즘’ 이란서 처음 쐈다…“추종 불허 전력”
-
3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4
[단독]“두건 쓴 무장경비대 길목마다 검문…택시로 20시간 달려 탈출”
-
5
美상원, ‘이란 공격 중단 결의안’ 부결…트럼프 제동 실패
-
6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7
美국방차관 “한국이 北 상대 재래식 대응 책임지기로 합의”
-
8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9
한국 유조선 7척, 호르무즈에 갇혔다…“1척당 국내 하루 소비량”
-
10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1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
2
李 “주유소 휘발유 값 폭등…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해”
-
3
李 “‘다음은 北’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 있어…무슨 득 있나”
-
4
[단독]한미, 주한미군 무기 중동으로 차출 협의
-
5
트럼프, 결국 ‘대리 지상전’…쿠르드 반군 “美요청에 이란 공격”
-
6
與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단수 공천
-
7
與 “조희대 탄핵안 마련”… 정청래는 “사법 저항 우두머리냐”
-
8
국힘, 靑 앞서 의총…“李, 사법 악법 공포하면 역사 죄인될 것”
-
9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10
한병도 “쌍방울 사건 조작, 명백한 인간 사냥…모래성 공소 취소돼야”
트렌드뉴스
-
1
아침 공복 따뜻한 물 한 잔, 정말 살 빠지고 해독될까?[건강팩트체크]
-
2
美, 최신예 미사일 ‘프리즘’ 이란서 처음 쐈다…“추종 불허 전력”
-
3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4
[단독]“두건 쓴 무장경비대 길목마다 검문…택시로 20시간 달려 탈출”
-
5
美상원, ‘이란 공격 중단 결의안’ 부결…트럼프 제동 실패
-
6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7
美국방차관 “한국이 北 상대 재래식 대응 책임지기로 합의”
-
8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9
한국 유조선 7척, 호르무즈에 갇혔다…“1척당 국내 하루 소비량”
-
10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1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
2
李 “주유소 휘발유 값 폭등…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해”
-
3
李 “‘다음은 北’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 있어…무슨 득 있나”
-
4
[단독]한미, 주한미군 무기 중동으로 차출 협의
-
5
트럼프, 결국 ‘대리 지상전’…쿠르드 반군 “美요청에 이란 공격”
-
6
與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단수 공천
-
7
與 “조희대 탄핵안 마련”… 정청래는 “사법 저항 우두머리냐”
-
8
국힘, 靑 앞서 의총…“李, 사법 악법 공포하면 역사 죄인될 것”
-
9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10
한병도 “쌍방울 사건 조작, 명백한 인간 사냥…모래성 공소 취소돼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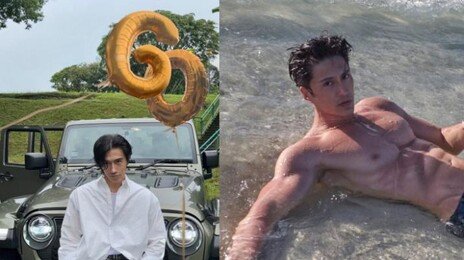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