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감독 꿈꾼 高3때 ‘땡땡이’ 치며 운명적 시청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7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최동원-선동열 1987년 명승부 그린 ‘퍼펙트게임’ 박희곤 감독

자존심 센 주연 배우 조승우(최동원)와 양동근(선동열), 수십 명의 조연, 스태프를 조련해 거친 야구 영화를 찍은 연출자라면 적어도 해태 타이거즈 김응용 전 감독 정도의 ‘포스’는 있으리라 상상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레스토랑에서 만난 ‘퍼펙트게임’의 박희곤 감독(42)은 마른 체구에 동그란 안경을 끼고 있었다. 겉보기가 다는 아니다. “(제) 성격이 그리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야구 장면 찍는 첫날, 박 감독은 미술 디자인이 원래 주문과 다르다는 걸 알고 첫 샷 들어가기도 전에 테이블 위의 고가 모니터 4대를 다 엎었다.
22일 개봉한 ‘퍼펙트게임’은 1987년 5월 16일 벌어진, 당대의 에이스 최동원과 선동열의 연장 15회 완투 대결 실화를 영화로 만든 작품이다. 당시 박 감독은 경기고 3학년이었다. 경기 시간은 오후 2시. 영화감독을 꿈꾸며 몰래 극장 드나들던 2학년 때부터 ‘땡땡이’엔 이골이 나 있었다. 그날도 친구 둘과 몰래 교실을 빠져나와 식당 TV 앞에 자리를 잡았다. 1000원씩 돈도 걸었다. 5시쯤 경기 끝나면 쏜살같이 학교로 돌아가려 했는데 경기는 오후 7시에야 끝났다. “선생님께 혼쭐났죠. 부모님 호출되고. 무승부니 돈도 못 따고.”
박 감독의 뇌리에 ‘그날’이 다시 떠오른 건 15년 뒤였다. CF 감독과 KBS 단막극 PD, 영화 비주얼 디렉터를 거쳐 “이제 내 영화를 찍어보자”던 때다. “TV 야구 프로를 보다 문득 ‘아, 고3 때 희한한 경기 하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흥분됐습니다.”
제작진과 함께 영화사에 전례 없는 ‘트러스 캠’과 ‘슬라이드 캠’을 고안했다. 전북 군산시 월명 야구장에 콘서트장에서 쓰는 트러스를 높이 6m, 가로세로 25m의 정방형으로 설치했다. 거기 달린 카메라는 압축 공기 분사의 힘으로 공을 쫓아 날게 했다. 포수 미트로 낮게 빨려 들어가는 공은 레일 위를 유압의 힘으로 달리는 ‘슬라이드 캠’으로 잡았다. 이렇게 찍은 화면들을 3D 컴퓨터그래픽으로 부산 사직구장 촬영분에 합성해 붙였다.
기술이 드라마까지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 조승우, 양동근 등 배우들의 피땀이 뒤섞였다. “선동열 감독이 투구 전 미세하게 손을 터는 버릇이 있는데 첫 촬영 때 양동근이 그걸 하더라고요. 소름 끼쳤죠. 조승우는 최 감독님의 신발과 안경 매만지는 디테일을 그대로 복제해왔죠. 자기 장면이 없을 때 양동근은 3루 쪽, 조승우는 1루 쪽에서 말없이 투구 연습 하는데 치열했어요. 공 다섯 개만 던지면 땀나는 8월에…. 직부감(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샷)으로 둘의 투구 모습을 잡았는데 최동원과 선동열이 보였죠.”

임희윤 기자 imi@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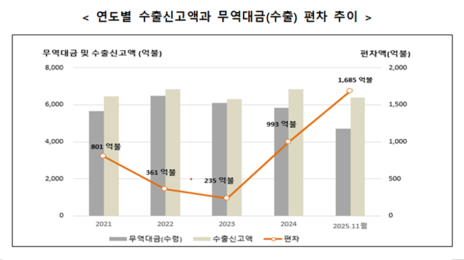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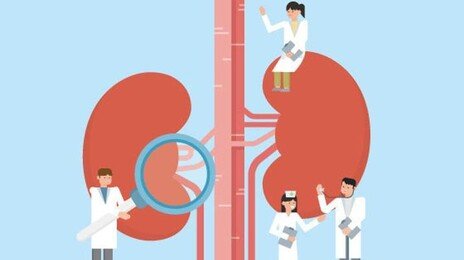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