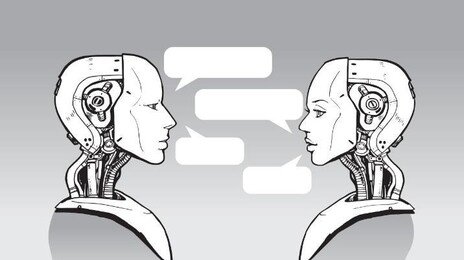공유하기
[엔딩크레디트]포스터 제작 김혜진 실장
-
입력 2009년 7월 7일 02시 56분
글자크기 설정

‘박하사탕’ ‘집으로’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죽어도 좋아’ ‘아내가 결혼했다’ ‘7급 공무원’ ‘박쥐’까지…. 제목만 들어도 머리에 떠오르는 포스터들은 모두 디자인 회사 ‘꽃피는 봄이 오면’의 작품이다. 1995년 출범한 이 회사는 1999년부터 한국 영화 포스터를 제작하고 있다.
“영화 포스터는 사진과 타이포그래피 등 다양한 예술기법이 녹아 있는 종합예술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의 ‘목숨’이 걸린 작업이기도 하죠. 영화제작자, 투자배급사, 마케팅 업체의 치밀한 전략이 포스터에 다 담겨 있습니다.”
3일 만난 ‘꽃피는 봄이 오면’ 김혜진 실장(39)의 말이다.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는 16일 개봉하는 영화 ‘차우’에 나오는 멧돼지 얼굴이 새겨진 포스터가 여럿 걸려 있었다. 언뜻 보기엔 같은 포스터지만 가까이서 보면 미세한 차이가 있다. 제작진에겐 멧돼지를 노출할지 아니면 보여주지 않은 채 멧돼지의 위압감만 표현할지가 고민거리였다고. 결국 여러 차례 씨름한 끝에 멧돼지의 솜털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표현된 그림을 선택했다.
포스터는 영화의 ‘첫인상’을 좌우한다. 그래서 디자이너 3명으로 짜인 한 팀이 시나리오와 콘티를 꼼꼼하게 분석한 뒤 포스터의 전체 구도와 글자체, 카피를 구상하고 촬영을 한다. 가장 바쁜 때는 영화 개봉 직전이다. 극장 버스 지하철 등 포스터가 걸릴 공간에 따라 다양한 ‘버전’을 만든다. 극장용 포스터 사이즈는 건물마다 제각각이어서 200여 개를 따로 제작하기도 한다.
개봉 이후에도 포스터는 관객의 반응에 따라 변화한다. 흥행이 순조로우면 300만, 500만 관객 돌파 기념 포스터를 미리 만든다. 10년 전만 해도 서울극장에 줄이 어디까지 이어지냐가 판단 기준이었지만 요즘엔 예매사이트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국 영화 포스터에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 배우가 유명할수록 얼굴이 커지고, 얼굴이 클수록 관객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김 실장은 “예술적인 욕심을 부리고 싶지만 영화 산업은 이제 ‘그들만의 문화’가 아니다”라며 “클로즈업된 배우의 표정 속에 많은 느낌을 담으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했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트렌드뉴스
-
1
당뇨병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 받는다
-
2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3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노블레스 오블리주 표본”
-
4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5
버스서 韓 여학생 성희롱하고 불법 촬영…인니 남성 논란
-
6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7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8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9
“D램 품귀에 공장 100% 돌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가 증설 나서”
-
10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4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6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7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8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9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10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트렌드뉴스
-
1
당뇨병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 받는다
-
2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3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노블레스 오블리주 표본”
-
4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5
버스서 韓 여학생 성희롱하고 불법 촬영…인니 남성 논란
-
6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7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8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9
“D램 품귀에 공장 100% 돌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가 증설 나서”
-
10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4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6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7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8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9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10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