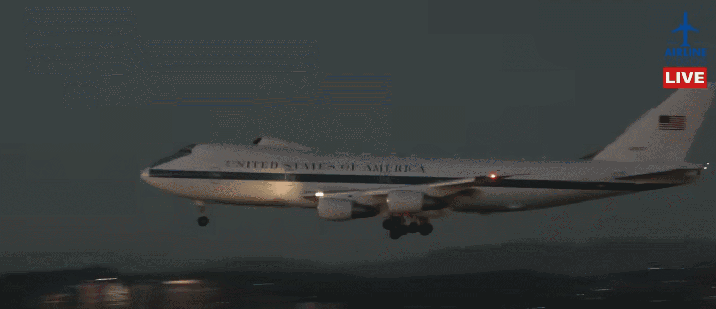공유하기
“작은 고추가 맵다” 독립영화 전성시대
-
입력 2009년 5월 19일 02시 55분
글자크기 설정


‘제2 워낭소리’ 줄줄이 개봉 앞둬
“다큐영화 재미없다” 편견 깨고
기획 영화에 식상한 관객들 열광
작지만 강했다.
가뭄에 콩 나듯 주목받았던 작은 영화들의 ‘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독립영화 관객 1만 명=대박’이라는 흥행 공식에 따른다면 올해 ‘대박을 터뜨린’ 작은 영화는 다섯 편. 물꼬를 튼 건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였다. 40년에 걸친 소와 사람의 정을 다룬 ‘워낭소리’가 독립영화 최다 관객(293만 명)을 기록하더니 곧이어 1000만 원으로 만든 ‘낮술’(2만5000명)이 터졌다. 4월 20일 개봉한 ‘똥파리’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관람객 12만4409명으로 역대 독립 극영화 중 흥행 1위를 기록한 것. 순제작비 8억 원을 들인 영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도 1만9000명을 넘기며 순항 중이다. 기독교 다큐멘터리라는 낯선 장르로 개봉 6주 만에 3만 명을 돌파한 ‘소명’도 있다.
이러한 기세를 타고 ‘제2의 워낭소리’를 꿈꾸는 작은 영화들도 개봉을 앞두고 있다. 기면증을 앓는 소녀의 이야기 ‘바다 쪽으로 한 뼘 더’(21일 개봉)를 시작으로 탈북자와 이주노동자의 동행을 그린 ‘처음 만난 사람들’(6월 4일), 최민식이 주연한 전수일 감독의 ‘히말라야, 바람이 머무는 곳’(6월 11일), 벵골어로 참 좋은 친구라는 뜻의 ‘반두비’(6월 25일) 등이 개봉된다.
○ 그들만의 이야기? 작은 영화가 변했다
하지만 요즘 작은 영화 제작자들은 스스로도 변화를 실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워낭소리’. 다큐멘터리는 어렵고 재미없다는 편견을 부숴버렸다. 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조영각 씨는 “디지털화로 매체 환경이 바뀌며 누구나 소자본으로 영화를 찍게 됐다”며 “영화창작에 대한 접근 장벽이 낮아지며 소재와 형식이 다양해지자 대중의 눈높이에서 만들어진 영화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물론 이러한 변신에는 대중과 멀어져가는 작은 영화 제작자의 위기의식도 깔려 있다. 올해 전국국제영화제에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영화 ‘반두비’의 감독은 신동일 씨. 그는 전작 ‘방문자’ ‘나의 친구, 그의 아내’를 통해 종교적, 정치적 신념과 죄의식 등 다소 난해한 주제를 다뤄왔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청년과 여고생의 로맨스를 그린 ‘반두비’를 통해 신 씨는 영화의 눈높이를 대중에게 맞췄다. 신 씨는 “예전 작품들이 평가는 좋았던 반면 대중과 소통하려는 고민은 부족했다”며 “문제의식은 그대로 녹이되 전개방식을 좀 더 쉽고 편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 찍어내는 기획영화에 냉정해진 관객
관객들의 눈높이도 변했다. 올해부터 가족영화 코미디영화 등 ‘기획용 영화’를 양산한 주류 영화에 관객들은 냉정한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 틈을 타 영화평론가 강유정 씨의 말처럼 ‘신선한 작가적 의도와 적은 제작비, 탄탄한 이야기 구조 등 쉽게 말해 영화의 기본기에 충실한’ 작은 영화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용역깡패의 비루한 삶을 다룬 영화 ‘똥파리’는 같은 ‘조직폭력배’를 소재로 했더라도 기존의 조폭 코미디와 궤도를 달리했다. 지나친 욕설과 수위 높은 폭력 장면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정공법’을 통해 현실감을 얻었다. 영화평론가 김영진 씨는 ‘똥파리’에 대해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얘기보다 실제로 존재할 것 같은 얘기,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주변의 이야기로 대중의 공감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배다른 자매가 아빠를 찾아 가는 과정을 그린 로드무비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는 아빠의 비밀이 밝혀지는 마지막 반전이 신선하다는 평을 받았다.
○ 고비용 저효율 영화의 실패
작은 영화의 강세는 역설적으로 최근 한국 영화의 부진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지난해 685만 명을 기록하고도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긴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대표적인 사례. 올해 초 개봉한 영화 중 ‘작전’(마케팅비를 제외한 순제작비 35억 원) ‘마린보이’(40억여 원) 등도 대규모 제작비를 투입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한마디로 ‘고비용 저효율’ 영화의 실패였다. 반면 올해 흥행에 성공한 작은 영화 다섯 편의 평균 순제작비는 2억4800만 원. 1억5000만 원의 순제작비를 들여 189억 원의 매출을 거둔 ‘워낭소리’는 47억 원을 들인 ‘그림자 살인’의 매출(121억 원)을 뛰어넘었다. ○ 작은 영화, 극장까지 바꾸다
작은 영화의 성공은 극장 환경까지 변화시켰다. 막대한 물량 투입으로 단관 수를 확보해 단시간에 관객을 동원했다 빠지는 배급시스템은 ‘워낭소리’ 이후 문제점이 노출됐다. 그 덕분에 ‘똥파리’는 영화 규모나 배우의 이름값이 아닌, 영화제 수상 이력과 사전 입소문만으로 전국 58개관을 잡을 수 있었다.
대형 멀티플렉스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CGV가 2004년부터 전국 4개관에서 운영해 오던 인디영화전용관은 매해 관객 수가 늘어났다. 올해 ‘무비꼴라쥬’라는 이름으로 바꾼 후 10개까지 전용 극장을 확장한 상태. 메가박스도 동대문점 5관, 롯데시네마는 부평 일산 부산센텀시티 등 5개관을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신설된 CGV 인디·아트 영화팀의 조희영 대리는 “영화관으로서는 작은 영화를 지원해 영화 산업에 도움을 주고 영화 제작사로서는 멀티플렉스의 플랫폼을 활용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화보]故 박정희 전 대통령 희귀사진 공개
[화보]영화 ‘여고괴담5’ 제작발표회
[화보]‘우사인 볼트’…150m 14.35 세계 신기록
[화보]소피 마르소·모니카 벨루치, 칸의 여신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